타인의 시선, 경계에서 읽기 - 서정민 교수의 도쿄 산책
서정민 (지은이)섬앤섬2020-11-03
공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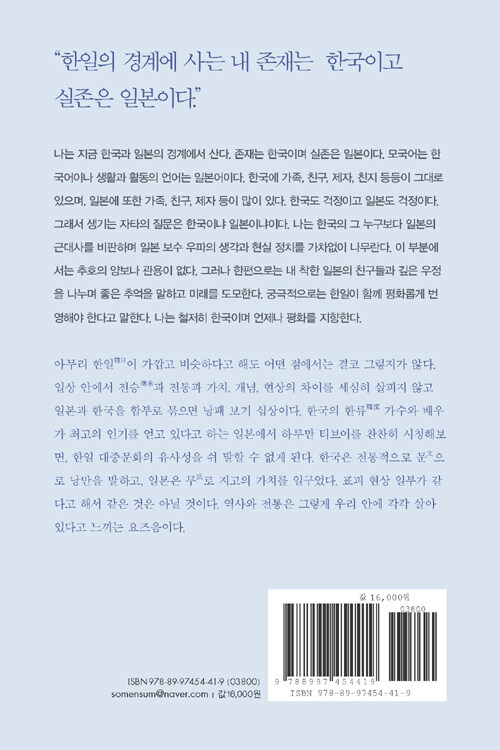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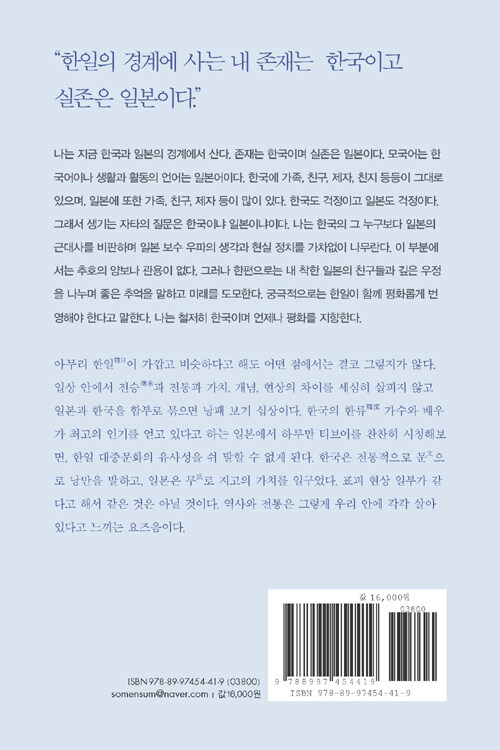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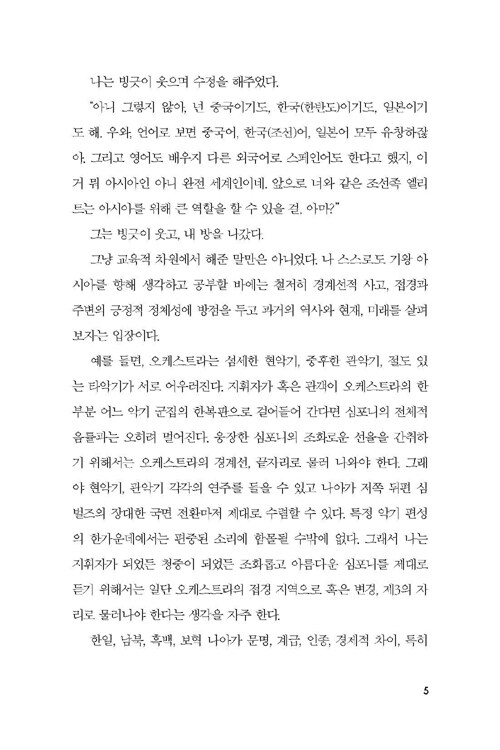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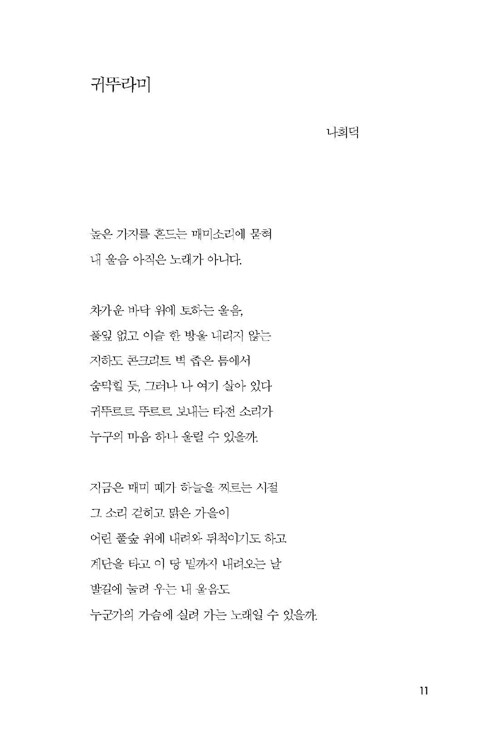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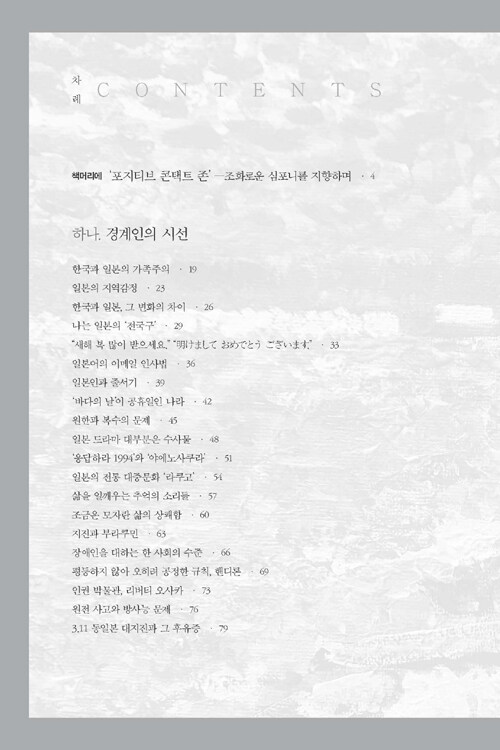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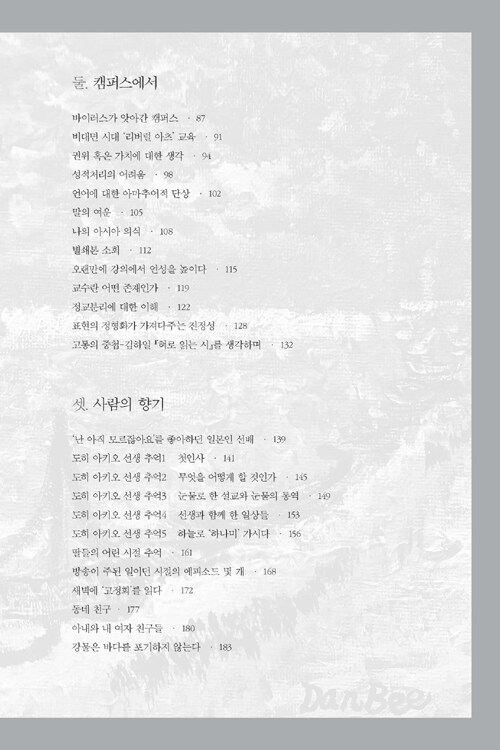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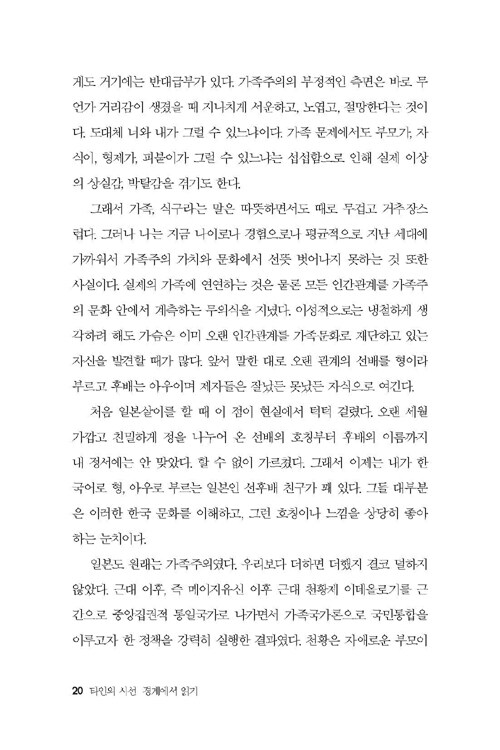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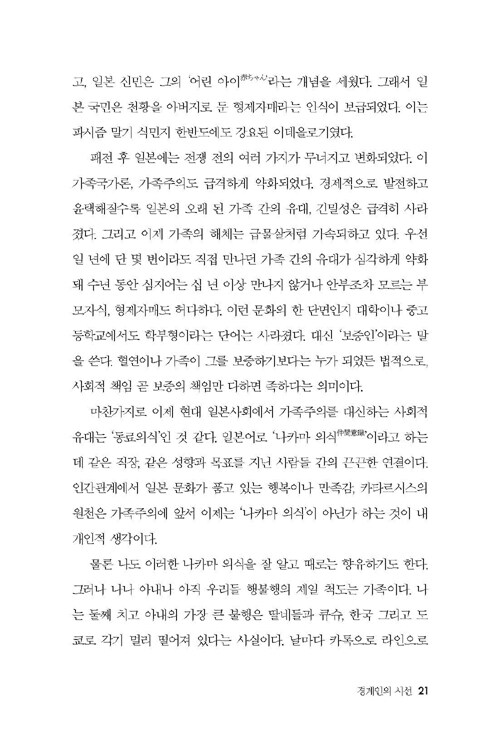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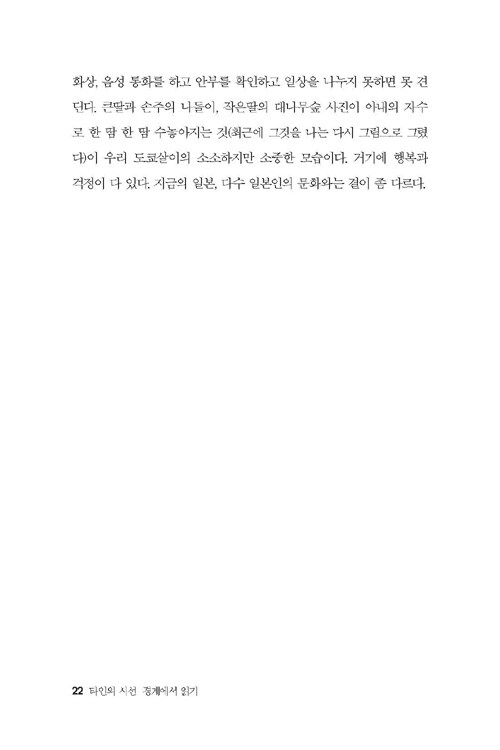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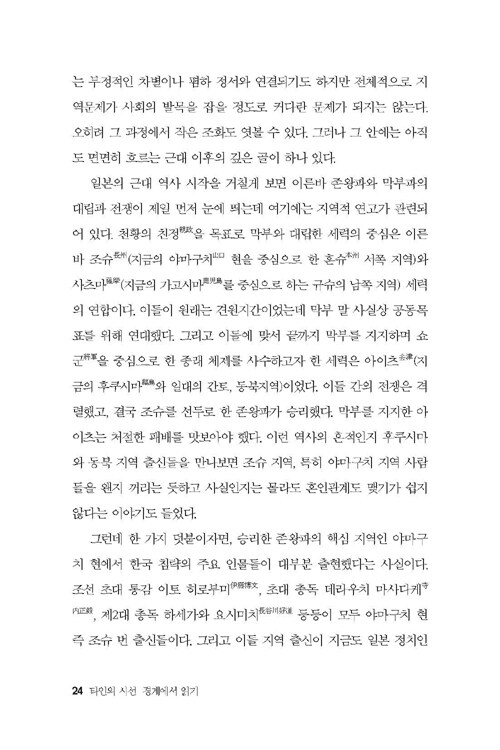
미리보기
296쪽
140*210mm
385g
ISBN : 9788997454419
1990년 교토 유학 이후 30년째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연구하고 가르치고 생활하고 있는 메이지가쿠인대 종교사학자 서정민 교수의 세상읽기, 경계에서 타인의 시선으로 세상 바라보기. 소수자로서 일본의 대학에서 젊은 지성을 가르치고 있는 한일관계 전문가 서정민 교수의 생활 속 한일문화비교 에세이로, 아사히신문 '아사히논좌' 칼럼리스트로서 바라보는 한일관계 현안에 대한 비평적 단상들이 수록되어 있다.
목차
책머리에 ‘포지티브 콘택트 존ʼ —조화로운 심포니를 지향하며 ・ 4
하나. 경계인의 시선
한국과 일본의 가족주의 ・ 19
일본의 지역감정 ・ 23
한국과 일본, 그 변화의 차이 ・ 26
나는 일본의 ‘전국구ʼ ・ 29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明けまして おめでとう ございます.” ・ 33
일본어의 이메일 인사법 ・ 36
일본인과 줄서기 ・ 39
‘바다의 날ʼ이 공휴일인 나라 ・ 42
원한과 복수의 문제 ・ 45
일본 드라마 대부분은 수사물 ・ 48
‘응답하라 1994’와 ‘야에노사쿠라’ ・ 51
일본의 전통 대중문화 ‘라쿠고’ ・ 54
삶을 일깨우는 추억의 소리들 ・ 57
조금은 모자란 삶의 상쾌함 ・ 60
지진과 부라쿠민 ・ 63
장애인을 대하는 한 사회의 수준 ・ 66
평등하지 않아 오히려 공정한 규칙, 핸디론 ・ 69
인권 박물관, 리버티 오사카 ・ 73
원전 사고와 방사능 문제 ・ 76
3.11 동일본 대지진과 그 후유증 ・ 79
둘. 캠퍼스에서
바이러스가 앗아간 캠퍼스 ・ 87
비대면 시대 ‘리버럴 아츠’ 교육 ・ 91
권위 혹은 가치에 대한 생각 ・ 94
성적처리의 어려움 ・ 98
언어에 대한 아마추어적 단상 ・ 102
말의 여운 ・ 105
나의 아시아 의식 ・ 108
별쇄본 소회 ・ 112
오랜만에 강의에서 언성을 높이다 ・ 115
교수란 어떤 존재인가 ・ 119
정교분리에 대한 이해 ・ 122
표현의 정형화가 가져다주는 진정성 ・ 128
고통의 중첩-김하일 『혀로 읽는 시』를 생각하며 ・ 132
셋. 사람의 향기
‘난 아직 모르잖아요’를 좋아하던 일본인 선배 ・ 139
도히 아키오 선생 추억1 –첫인사 ・ 141
도히 아키오 선생 추억2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145
도히 아키오 선생 추억3 –눈물로 한 설교와 눈물의 통역 ・ 149
도히 아키오 선생 추억4 –선생과 함께 한 일상들 ・ 153
도히 아키오 선생 추억5 –하늘로 ‘하나미’ 가시다 ・ 156
딸들의 어린 시절 추억 ・ 161
방송이 주된 일이던 시절의 에피소드 몇 개 ・ 168
새벽에 ‘고정희’를 읽다 ・ 172
동네 친구 ・ 177
아내와 내 여자 친구들 ・ 180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 183
넷. 삶의 균형잡기
어려운 글과 쉬운 글 ・ 187
한 장의 사진이 말하는 이야기 ・ 191
언제는 넉넉하고 언제는 엄격한 내 기준 ・ 195
나는 되도록 싸우지 않으려고 한다 ・ 199
한국의 민족주의 이제는 없다 ・ 203
악의 평범성, 생각하지 않는 죄 –일본에 부는 한나 아렌트 현상 ・ 207
친일 행적에 대한 몇 가지 생각 ・ 210
옴 진리교 사건, 회고 ・ 213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자주 받는 질문 ・ 217
혐한류 우려 ・ 220
‘친한파’ 데모 ・ 223
일본 헌법 논의 1 –‘평화헌법’ 논란 ・ 226
일본 헌법 논의 2 –헌법 제9조, 96조, 더불어 1조 ・ 230
6.25,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 234
작은 일과 큰 일 ・ 238
의사를 바라보는 눈 ・ 241
한 해의 마지막 일기 –유언서 ・ 245
다섯. 다시 종교를 생각하며
그리스도교는 종교인가 ・ 251
그리스도교가 있을 자리 ・ 255
데지마, 네덜란드와 일본 ・ 258
그리스도교와 일본 ・ 261
일본의 그리스도교 콤플렉스 ・ 264
가가와 토요히코에 대한 생각 ・ 266
일본 교회의 검약 ・ 270
한국 그리스도교와 일본 그리스도교 ・ 273
돈과 자유 ・ 275
전쟁과 종교 ・ 278
잘못된 계산, 선교 투자와 당기 순이익 ・ 281
일본의 신종교 현상 ・ 284
다시 읽는 일본 종교 ・ 287
세습 문제를 생각하다 ・ 291
접기
책속에서
나는 1989년 가을부터 1992년 봄까지 일본의 교토에서 공부했다. 가족은 모두 서울에 두고, 혼자 교토에 유학하며 작은 자동차를 운전했다. 당시 내 공부는 책과 자료와의 씨름도 물론 중요했지만 일본어를 자연스럽게 익혀야 했고, 그토록 거리를 두었던 일본문화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며 한 사람의 일본인이라도 더 사귀어 무언가 한일 간의 공통분모를 찾아내야 하는 마음의 과제가 있었다. 그래서 세미나나 수업시간 아니면 발제를 준비하고 숙제를 해야 하는 시간 즉 책상에 붙어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돌아다녔다. 일본의 옛 수도이자 당시 내 근거지였던 교토의 여기 저기 좁은 골목 안까지, 인근 간사이?西 지역인 오사카, 고베 일원 그밖에도 가끔 말했듯이 거의 전 일본 열도를 망라하여 너른 지역을 자주 여행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특히 교토의 길들은 눈을 감아도 훤히 떠오른다.
그 후 꼭 20년이 지난 2008년 도쿄, 지금 있는 대학의 초빙교수로 1년간 와 있을 때 한번은 일부러 자동차를 운전하고 며칠간 도쿄에서 나고야 인근 메이지무라明治村, 이누야마犬山를 둘러보고 교토, 오사카, 고베까지 여행한 적이 있다. 물론 돌아오는 길에는 시즈오카?岡의 하마마츠浜松 온천에서도 하루 묵었다. 그런데 당시 느꼈던 교토 감상은 역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가 20년 전 운전하며 다니던 길 거의 그대로의 느낌이며 주변의 풍광과 운전 감각 또한 거의 다름없었다. 물론 교토라는 도시가 지니고 있는 역사성 그 ‘변하지 않음의 가치’로 꽉 짜인 의의를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내가 느낀 감상으로 일본의 그 시절을 이야기 하자면 적어도 이른바 쇼와, 다이쇼, 메이지 시대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아, 바로 여기에 그 우동가게가 있었지 하면 대개 거기에는 그 우동가게가 그대로 자리하고 있다. 원래의 주인이 아니라 그 자녀가 그것을 이어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대부분은 옛 향기를 그대로 머금고 있어서 그리 낯설지가 않다. 세계 제일의 번잡 도시인 도쿄도 그런 원칙만큼은 잘 지키고 있어서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때 그 기억을 더듬어 찾는 나그네의 우수憂愁를 대부분 충족해준다.
이에 반해 내 고국 한국의 풍광은 전혀 다르다. 본디 여행을 좋아하는지라 나는 한국에서도 웬만한 곳은 다 경험했다. 세세하게까지는 아니어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지역은 거의 없다. 그러나 두 차례 이상 가보는 지역에서도 몇 년의 시간차로 기억을 더듬어 찾으면 곧바로 당황스러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산천도 인걸도 결코 의구하지 않다는 말이다. 정말 빠르게 변한다. 일본과는 반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옛 모습 그대로 있는 가게를 찾기가 오히려 어려운 현실이다. 그때 그 시절을 말할 때 한국은 거의 5년 정도의 시간으로도 얼마든지 옛날이야기를 할 수 있다. 물론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단지 양국의 그런 시공간의 특징과 차이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말이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역사나 사회경제적으로 그럴만한 이유를 여럿 찾을 수 있지만, 나는 이에 덧붙여 전혀 다른 성정 한 가지를 더 느낀다. 그것은 한국의 경우 새 것에 대한 지향志向이 다른 모든 가치를 제압할 만큼 크다는 사실이다. 모든 옛 것에 대한 염증炎症이 그 안에 스며들어 있음 또한 분명하다. 이에 반해 상대적인 의미이기는 하지만 일본은 오래 된 것에 대한 가치가 훨씬 강하다. 옛 것에 대한 염증이 아니라 향수鄕愁로 가득한 개인과 사회의 심리를 읽을 수 있다. 난 옛 것도 좋고 새 것도 좋다. 그래서 지금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 팔자인지도 모르겠다. 가끔 ‘쓸쓸한 인생’을 실감할 때는 ‘옛 것’이 그립다, ‘옛날식 다방’도 ‘옛날식 첫사랑’도. 그럴 때는 또 오래 된 일본의 뒷골목이 더 정서에 맞는다. 접기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일본의 보수 정권은 지금의 헌법을 개정하려 한다. 오래 전부터 일본에서 헌법을 바꾸고자 하는 이야기는 자주 나왔지만 최근의 논의가 가장 적극적이고, 또한 개헌의 가능성도 전보다 높은 분위기이다. 개헌의 가장 관건이 되는 조항은 9조이다. 조문의 주요 내용부터 보자.
일본 헌법 제9조 1항,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希求하고 국권國權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방기放棄한다. 2항, 전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은 보지保持하지 않는다. 나라의 교전권交戰權은 인정치 않는다.
이른바 ‘평화헌법’의 골자가 여기 제9조에 다 담겨 있다. 물론 그 해석의 미묘한 폭은 있으나 볼수록 얼마나 좋은 헌법 조항인지 모른다. 가끔 나는 일본 친구들에게 언젠가 세계의 모든 나라가 가져야 할 헌법을 일본이 먼저 가진 것이라고 말해 준다. 이를 바꾸어야 한다는 논리는 시대가 달라져 이 헌법으로 국토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고, 이 헌법이 패전 이후 승전국의 강요와 강제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이제는 주체적으로 바꿀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또한 이론적으로 논의하던 시절만 해도 낭만적인 시대이다.
최근 정권은 개헌 추진에 아주 전략적이다. 제9조를 논의하기에 앞서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 제96조 개정을 먼저 내걸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제96조의 개요는, ‘헌법의 개정은 각 의원 총원 3분의 2 이상으로 국회가 발의하고 국민에 제안,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이다. 승인에는 특별히 국민투표 또는 국회가 인정하여 실시하는 선거시행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의 승인을 얻을 경우 천황은 개정된 헌법을 국민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되어 있다.
관건은 국회의 3분의 2 찬성이다. 이것은 다수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정신이 들어 있는 세계적인 상식선이다. 이를 과반수로 낮추어 개헌이 용이한 방법론적 절차 개정에 먼저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을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개정 방법 조항을 먼저 개헌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두고 일본이 들끓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일본인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면서도 이 ‘개헌 방법론’에 대한 개헌은 비교적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왜 그런지 이해는 가지만 아무튼 모순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비교적 정론을 펴는 《마이니치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96조 개헌에 대해 반대 46%, 찬성 42%, 무응답 11%로 나왔다. 같은 조사에서 헌법 개정 자체에 대한 지지 60%, 생각해보지 않았다 32%와 비교해서 볼 여지가 있다.
일본의 ‘헌법의 날’에 《마이니치신문》(도쿄 판 조간)의 사설은 96조 개정 반대를 제목으로 걸고 정면으로 다루었다. 이 논지에 나도 적극 동의한다. 사설은 영화 ‘링컨’ 이야기로 시작한다. 당시 미국 헌법 13조의 개정문제를 다룬 영화이다. 그때에도 3분의 2선이 조건이었다. 그것은 정치, 정략, 단순 다수가 아니라 인권, 정의가 관계된 설득이 필요하다는 전제였다. 이어 헌법은 기본인권을 보장하는 보루이며, 현재의 헌법은 자유획득의 결과 시련을 견딘 산물이며, 현재와 미래 일본 국민의 침해될지도 모르는 인권을 지키는 바탕이라고 했다. 그것은 정치적 다수파가 일시적 판단으로 이리 저리 바꾸어서는 안 되는 보편적 원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개헌은 더욱 높은 단계의 엄격성이 요구된다. ‘과반수’가 통상의 민주주의 원리이지만 헌법은 기본권과 기초적 가치를 지키는 법으로 ‘법 중의 법’이다. 모든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면 법으로서의 의의를 상실한다. 그런 헌법의 개정을 법률 개정이나 제정과 동일한 차원에 위치시키는 것은 본말전도本末顚倒라고 결론지었다.
나는 한 가지 더, 역사적으로 학습된 한국의 전례를 충고해주고 싶었다. 헌법을 권력의 필요에 따라 바꾸기 시작하면 모든 권력은 개헌의 유혹을 갖게 되고, 인권 보루의 둑은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 정권의 의도가 더욱 집요한 것은, 다수 권력이 헌법을 언제라도 바꿀 수 있도록 개정 방법론을 다시 설정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아주 악질적인 정치논리라 아니할 수 없다. 방법론이 용이하게 바뀌게 되면, 오랜 논의의 핵심인 제9조 이른바 ‘평화헌법’을 바꾸고자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일본 헌법의 ‘개악’이며 일본 역사의 파행을 다시 가져올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거론되는 것이 헌법 제1조의 개정 가능성이다. 현재 제1조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이 있는 일본 국민의 총의總意에 기초한다고 되어 있다. 아마 이것을 바꾼다면, 천황에게 ‘상징적 지위’가 아니라 실제적 ‘국가원수’의 지위를 만들어주려 할 것이다. 역시 회귀적 헌법이 아닐 수 없다.
일본 그리스도교계는 오랫동안 ‘9조회’라는 단체가 활동해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평화헌법(제9조) 수호에 가장 적극적이고 유효한 공동체이다. 다시 광풍으로 몰아닥친 헌법 개정, 아니 개악의 파고를 어떻게 넘을지 주목된다. 내 생각에는 최근의 정권이 개헌에서 좀 더 용이한 길을 가기 위해 방법론격인 제96조의 개정을 먼저 선언한 것은 전략적 승부수이겠지만, 사실은 실수로 보인다. 설령 개헌을 하는 한이 있어도 충분한 의의 설득과 충실한 함의를 통해 정치적 반대파와 국민을 감동시키며 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헌법을 일반 법률과 같은 반열로 격하하는 헌법 폄하의 우愚를 저지르고 있으니, 염려이다. 접기
일본에서 TV 드라마를 보면 얼핏 계산해도 70~80%는 수사물이나 미스터리물이다. 한국에서는 오래 전 ‘수사반장’ 시리즈 이후 수사 드라마는 아예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다. 반대로 항상 복잡하게 얽히는 가정사나 신데렐라 류, 늘 짝짓기로 결말이 나야 하는 연애사건, 재벌기업의 회장과 그 2세인 젊은 본부장이나 기획실장이 등장하는 식의 화려한 성공 드라마가 대세이다. 물론 언제부터인가 ‘역사드라마’가 인기의 한 축을 장악했지만 그 안에 신데렐라나 짝짓기 소재가 들어 있기는 매 한가지이다. 지금 나는 한국 드라마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참 달콤하고, 소프트하고, 로맨틱하다는 칭찬도 겸하고 있다. 이런 한국드라마가 일본과 아시아에서 인기를 끄는 것도 그런 부드러움이 한 몫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반면 일본 드라마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직업은 경찰, 형사, 수사관, 탐정 그 다음이 변호사 정도. 남녀 배우를 불문하고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한번 하지 않으면 배우 축에 낄 수도 없을 정도이다. 반면에 드라마 속에서 살인을 하거나 살인을 당하지 않은 중견배우가 없을 정도로 늘 죽고 죽여야 한다. 그런 ‘살인 장면’의 가장 흔한 도구는 역시 사무라이의 나라답게 ‘칼’이다. 한국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야 할 때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만 일본의 드라마는 절대 그런 법이 없다. 얼마나 적나라하게 그 장면을 묘사하고 각도를 달리해서 살인 현장을 잡아주느냐 하는 것으로 출중한 카메라워크의 평가가 갈리기까지 한다.
그렇다고 지금 내가 일본 드라마를 비판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왜 그런 것일까를 나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소설, 영화, 드라마의 살인이야기도 그 나름의 스펙트럼이 있다. 최고로 ‘악마적인 살인’ 곧 증오와 원한, 복수의 수준이 아니라 ‘악의 유희’ 같은 취미요 습관이 된 이른바 사이코패스의 병리적 현상으로부터 때로는 ‘감동적 살인’의 로망이나 눈물, 미학까지 등장한다. 물론 이 어느 것도 바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일본은 무사武士의 나라이고 그 최고 가치는 무사도武士道이다. 무사는 늘 죽고 죽이며, 죽을 수 있는 실존을 살고 그것에 대한 가치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였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목숨과 같은 일본도日本刀가 있었다. 잘 ‘죽는 일’을 가르친 일본 무사도에서는 ‘자살’도 감동적으로 펼쳐지고, 그것이 명분과 상황이 제대로 통한 경우라면 무사도의 절정으로 새겼다.
현대 일본은 물론 무사도의 흐름에서는 비켜나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가상의 이야기일지라도 ‘칼’은 친숙하고 ‘죽음’은 그렇게 멀리 있는 상황이 아니다. 도쿄의 중심 지역 중 한 곳인 아오야마?山에는 규모를 짐작할 수 없는 공동묘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시로카네白金, 이 고급 주택지 한 가운데에도 큰 규모의 절이 있고 그 안에 넓은 가족 묘지들이 조성되어 있다. 화장장火葬場도 늘 마을 중심에 있다. 죽음은 절대 ‘터부’가 아니다. 아무리 한일韓日이 가깝고 비슷하다고 해도 이런 점에서는 결코 그렇지가 않다. 일상 안에서 전승傳承과 전통과 가치, 개념, 현상의 차이를 세심히 살피지 않고 일본과 한국을 함부로 묶으면 낭패 보기 십상이다. 한국의 한류韓流 가수와 배우가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 일본에서 하루만 티브이를 찬찬히 시청해보면, 한일 대중문화의 유사성을 쉬 말할 수 없게 된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문文으로 낭만을 말하고, 일본은 무武로 지고의 가치를 일구었다. 표피 현상 일부가 같다고 해서 같은 것은 아닐 것이다. 역사와 전통은 그렇게 우리 안에 각각 살아 있다고 느끼는 요즈음이다. 상호 이해를 위해서도 이런 상념은 꼭 필요하다. 접기
저자 및 역자소개
서정민 (지은이)
저자파일
신간알리미 신청
종교, 역사, 문화론 전문의 연구자로, 한국과 일본에서 공부하였고, 모교인 연세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일본 도쿄 메이지가쿠인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일본 아사히신문 〈논좌〉의 칼럼니스트이기도 하다. 한국어와 일본어로 쓴 여러 권의 학술서 이외에 칼럼집과 에세이집으로, 『日韓関係論草稿』(朝日新聞出版, 2020), 『東京からの通信』(かんよう出版, 2021), 『타인의 시선 경계에서 읽기』(섬앤섬, 2020), 『일본이라는 이웃』(동연, 2022) 등이 있다.
최근작 : <[큰글자책] TK생 지명관 “아시아로부터의 통신”>,<그림을 짓다>,<TK생 지명관 “아시아로부터의 통신”> … 총 34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 1990년 교토 유학 이후 30년째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연구하고 가르치고 생활하고 있는 메이지가쿠인대 종교사학자 서정민 교수의 세상읽기, 경계에서 타인의 시선으로 세상 바라보기.
‧ 소수자로서 일본의 대학에서 젊은 지성을 가르치고 있는 한일관계 전문가 서정민 교수의 생활 속 한일문화비교 신작 에세이!
‧ 아사히신문 ‘아사히논좌’ 칼럼리스트로서 바라보는 한일관계 현안에 대한 비평적 단상들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 한국과 일본의 문화와 역사 제대로 이해하기
펴내는 말 ―‘포지티브 콘택트 존’을 지향하며
나는 끝자리가 좋다. 학교 다닐 때도 자유 좌석일 경우에는 대개 맨 끝자리에 앉았다. 물론 출입이 편한 점도 있었을 것이다. 교수가 되어서도 대개 연구실은 복도 맨 끝이나 처음을 좋아한다. 현재의 내 연구실도 건물 5층 복도의 제일 끝이다. 끝은 경계선, 혹은 접경이다. 접경은 양쪽을 다 포함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어느 한 쪽을 단호히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의 지향점은 경계선이라 해도 서로를 아우르는 긍정적 경계선이다. ‘포지티브 콘택트 존’인 것이다.
간혹 내 강의에 중국 조선족 출신 유학생이 수강하는 경우가 있다. 언젠가, 지금은 졸업을 한 제자가 내가 한국인 교수라는 것을 알고 불쑥 찾아왔다.
“교수님, 저는 사실상 중국도, 한국도, 일본도 아닌 애매한 존재입니다, 말도 중국어, 한국(조선)어, 일본어 어느 것이 제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라며 혼란스러워 했다.
나는 빙긋이 웃으며 수정을 해주었다.
“아니 그렇지 않아, 넌 중국이기도, 한국(한반도)이기도, 일본이기도 해. 우와, 언어로 보면 중국어, 한국(조선)어, 일본어 모두 유창하잖아. 그리고 영어도 배우지 다른 외국어로 스페인어도 한다고 했지, 이거 뭐 아시아인 아니 완전 세계인이네. 앞으로 너와 같은 조선족 엘리트는 아시아를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걸, 아마?”
그는 빙긋이 웃고, 내 방을 나갔다.
그냥 교육적 차원에서 해준 말만은 아니었다. 나 스스로도 기왕 아시아를 향해 생각하고 공부할 바에는 철저히 경계선적 사고, 접경과 주변의 긍정적 정체성에 방점을 두고 과거의 역사와 현재, 미래를 살펴보자는 입장이다.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는 섬세한 현악기, 중후한 관악기, 절도 있는 타악기가 서로 어우러진다. 지휘자가 혹은 관객이 오케스트라의 한 부분 어느 악기 군집의 한복판으로 걸어들어 간다면 심포니의 전체적 음률과는 오히려 멀어진다. 웅장한 심포니의 조화로운 선율을 간취하기 위해서는 오케스트라의 경계선, 끝자리로 물러 나와야 한다. 그래야 현악기, 관악기 각각의 연주를 들을 수 있고 나아가 저쪽 뒤편 심벌즈의 장대한 국면 전환마저 제대로 수렴할 수 있다. 특정 악기 편성의 한가운데에서는 편중된 소리에 함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지휘자가 되었든 청중이 되었든 조화롭고 아름다운 심포니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일단 오케스트라의 접경 지역으로 혹은 변경, 제3의 자리로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한일, 남북, 흑백, 보혁 나아가 문명, 계급, 인종, 경제적 차이, 특히 종교 등등 첨예한 정체성 갈등과 대결은 계속될 뿐만 아니라 더욱 강화되고 있다. 나 스스로도 가끔은 어느 한 편에 서서 주장하고 편중하며 대치를 위한 진지를 구축할 때가 많다. 역사가 진보하고 성숙하면 어느 정도 극복될 줄 알았던 관점은 오히려 패퇴하는 느낌이다. 이처럼 갈등과 대결이 더욱 강화되는 어제오늘 상황을 보는 것이 나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다.
나는 지금 한국과 일본의 경계에서 산다. 존재는 한국이며 실존은 일본이다. 모국어는 한국어이며 생활과 활동의 언어는 일본어이다. 한국에 가족, 친구, 제자, 친지 등등이 그대로 있으며, 일본에 또한 가족, 친구, 제자 등이 많이 있다. 한국도 걱정이고 일본도 걱정이다. 그래서 생기는 자타의 질문은 한국이냐 일본이냐이다.
나는 한국의 그 누구보다 일본의 근대사를 비판하며 일본 보수 우파의 생각과 현실 정치를 가차 없이 나무란다. 이 부분에서는 추호의 양보나 관용이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 착한 일본의 친구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며 좋은 추억을 말하고 미래를 도모한다. 궁극적으로는 한일이 함께 평화롭게 번영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철저히 한국이며 언제나 평화를 지향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나는 접경을 좋아한다. 때로는 맨 끝을 좋아한다. 이유는 양쪽 다이고 싶은 끝없는 선한 욕심 때문인지도 모른다. 결코 경계선에 서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라거나 도대체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할지 망설이고 방황하기보다는 ‘양쪽 다ʼ라고 하는 큰마음을 지향한다. 아직 넘어야 할 산 건너야 할 강이 많을지 모르지만 이는 한일에서도, 남북에서도 더 넓게는 세계에서도 거듭 생각해야 할 긍정적 테제이다. ‘포지티브 콘택트 존’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다.
이 책은 내가 지닌 그런 바탕의 사고가 집적되어 있는 글이다. 긍정으로 바라보는 접경의 시선이다. 때로는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지라도 끝내 긍정의 시선으로 한일을 넘어 아시아와 세계로 연이어 나아가리라는 포부가 담겨 있는 바탕이다. 접기
북플 bookple
등록
마이페이퍼 > 마이페이퍼
글 작성 유의사항
구매자 (0)
전체 (1)
공감순

아주 좋아요
예온 2020-10-15 공감 (0) 댓글 (0)
Thanks to
공감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