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자꽃 운명에 맞선 당당한 도전
문혜성 지음 | 매직하우스 | 2020년 07월 17일 출간
총 4 중4 10.0 (리뷰 1개)
eBook : 10,000원
정가 : 18,000원
---
회원리뷰 (4)
쪽수 424쪽
크기 152 * 224 * 27 mm /763g 판형알림
이 책은 문혜성의 자서전이다.
저자소개
문혜성서울 종로구 원서동에서 1941년 출생.
창덕여고 1959년 졸업.
서울문리사범대(명지대전신) 가정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 일본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국영기업 KCC에서 근무.
KMC PT실 근무.
종로 동진의원 PT실 개업.
Restaurant ZOOM 경영. 닫기
----
멋쟁이 여자로 남고 싶다
어느 날 소녀 가장에게 주어졌던 행운과 행복이었던 결혼과 남편을 꼭 움켜쥐고 안 놓으려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그리고 남겨진 과제에 매달려 손에 땀을 쥐며 숨차게 달려왔지만, 한숨 돌리니 내 나이 벌써 팔십 고개가 되었다. 꿈꿔온 것들을 다 채우지 못한 채 내세울 것 없는 그냥 그런 아줌마, 할머니로 나이 먹고 있지만,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어디에서든 무슨 일이든 멋지게 최선을 다하고 싶다. 그리고 모두의 추억 속에 ‘멋쟁이 여자’로 기억되고 싶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막을 수도 역류할 수도 없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나의 여정 앞에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즈음이면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그때 가서 그 순간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돈보다 더 귀중한 남은 시간을 좀 더 아끼며 살아갈 것이다. 인생에서도 지독한 그리고 몹시 시린 추위의 겨울은 지나가고 반드시 봄이 온다, 그리고 지루하고 긴 여름은 또 찾아올 테니까. 고즈넉한 산책길을 혼자 걸으며 사색이라는 사치스러운 것도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렇게 살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조용한 여행지에서 둘만의 한가로움을 즐기며 행복한 여생을 보내면서, 아이들에게 고생 안 시키고 오래 앓지 않고 며칠만 아프다 자는 듯 가기를 기도해 본다.
종합검사 예약으로 며칠 운동을 못 나가니 동료들이 나의 소식을 궁금해했다. 다시 만나는 아침, 반가운 얼굴로 손잡고 안부를 건네며, 땀 흘린 운동 후의 커피 한 잔, 오가는 대화 속에 피우는 웃음꽃과 어울려 나누는 즐거운 시간. 함께 나이 먹어가는 친구가 때로는 가족이나 애인보다 소중하다고 느끼는 요즘이다. 진솔한 친구가 한 명쯤 있다면 더없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지 않나. 새벽마다 우리 부부 건강을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조용한 친구 한미자가 있어 나는 무한 행복하다. 실로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순간은 사소하고 조용한 이런 것들이 아닐까? 그러니 내게 남은 시간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그런 환상의 순간순간들을 만끽하며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꾸준하게 남은 삶의 마무리를 엮어가고 싶다. 오늘 건강하게 살아 있음에 감사하며 내일 아침에도 일찍이 아침 운동을 나가련다.
명자꽃, 해마다 이른 봄 진한 녹색의 잎사귀 사이로 수줍은 듯 숨어 곱게 피는 꽃, 화려한 노란 꽃술을 품고 선명한 꽃빛마저 살짝 감추며 은은한 향을 뿜어내는 명자는 신뢰, 겸손의 꽃말을 갖고 있다. ‘명자꽃’ 믿음과 사랑과 행복을 함께하며 여든 해의 나를 엮어 놓은 명자의 지난날을 읽어 주신 모든 분과 ‘명자꽃’을 극찬해주신 꽃을 아는 시인 백승훈 님께 감사와 행운의 소망탑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60년 전 내 가슴에 사랑을 묻어두고 홀연히 애처로이 억울하게 떠나가신 우리 엄마와 나에게 사랑만 깨우쳐주고 사랑과 미움의 영혼을 들고 그리움의 여운만 남긴 채 안타깝고 애석하게 요절하여 별이 된 당신에게 이 글을 보낸다.
----
목차
8 프롤로그
14 1장 쌀 침대 위에서 세상을 만나다
16 01 이보시오, 운전수 양반!
21 02 갓 스물 보석 같은 새색시가 양로(養老)가정에
24 03 큰 발을 물려주신 여성기독교의 선구자(진 외할머니)
28 04 시대의 한량이자 사업가 증조부
33 05 Noblesse Oblige를 행하고 요절하신 멋쟁이 할아버지
42 06 혜성(慧星), 쌀 침대 위에서 세상과 만나다
49 07 지체높고 못 말리는 어린 상전
54 2장 전쟁 중에도 마냥 즐거웠던 학교생활
56 08 똑소리 나는 서울 다마내기
60 09 엄마는 어쩜, 그리도 용감하셨을까?
66 10 공평한 체벌이 야속했던 날의 아름다운 교훈
72 11 신이 내린 하숙집 아줌마
82 12 논두렁에 찢어버린 대학합격증
92 3장 나에게 끝없는 사랑만을 주셨던 분들
94 13 얼마나 더 살면 엄마를 잊을 수 있을까?
102 14 사십 갓 넘어 혼자되신 아버지
118 15 시대를 잘못 만났던 우리 삼촌
128 4장 이대로 죽을 수야 없지 않은가?
130 16 보인 스님! 제발 저를 좀 받아주세요...
136 17 방황을 버리고 온 나에겐
138 18 엄마 없는 곳에선 난 아무것도
146 19 억울한 당좌사고, 참담한 삶보다는 차라리 죽음으로
149 20 한땀 한땀 꿰듯 일어나 보자
152 21 취직의 행운은 대학 입학까지
161 22 다시 미뤄둔 학사의 꿈
166 23 아버지는 집행유예
169 24 쌈닭 같던 새엄마, 천성 고운 딸 미경
173 25 아버지 동기간 유복녀 은옥 고모
180 5장 소처럼 함께 한 그곳에 커다란 행운이
182 26 성큼 다가와 처녀 가장을 불하한 털보
193 27 암울함을 털어 던진 화려한 결혼식
198 28 행복으로 가득했던 나날들
208 29 우리 둘째가 기형아라니…
214 30 여보! 이삼일 검사받고 나올 테니
221 31 내가 지금 무슨 일인들 못 할까
224 32 결혼하면 사표 내던 시절 아이 엄마가 JOB을!
228 33 아픔과의 마지막 투쟁으로 지쳐가는 남편
231 34 아빠 말 잘 터 엄마 말 잘 터
236 35 신이시어! 당신 정말 너무하십니다
250 36 내 삶의 동력이 되어준 동생들
266 6장 다시 찾아온 절망 속에서의 극복
268 37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슬픈 일
274 38 나는 매사에 독한 사람
277 39 다시 꺾인 일본 유학의 꿈, 그러나…
281 40 또 한 번의 좌절, 그리고 극복
286 41 기형을 극복한 둘째 아들
295 42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시련과 오점
299 43 친구 배려로 일본학과에 편입
304 44 일사불란하게 오늘도 달린다
308 45 아킬레스건 수술 32세 가장의 죽음
311 46 뒤늦게 도박으로 치른 비싼 수업료
320 47 재혼이라는 과감한 용단
337 48 너희들 기르는 낙으로 살았단다
352 7장 텅 빈 세상 나와 부딪혀 날 밝혀준 인연들
354 49 스승을 버리고 제자를 택하신 선생님
357 50 진형 언니, 꿈에라도 한번 봤으면
363 51 내 친구 Volker Braun과 Anne Marry
374 52 1995년 4월의 유럽
381 53 내 친구 고인기
383 54 이시가와겐(石川縣)의 데라쿠보(寺久保)
388 55 동서의학 최 실장님
391 56 한국어 사랑
396 57 2017년 윤달에 한 일
399 58 Patrick McMullan 신부님과 Lydia
407 59 내 80년 세 번의 사랑 중 첫사랑
413 에필로그
418 추천사
----
추천사
이재연(헬레나, 손녀딸)
자서전을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놀랐기도 했지만, 할머니께서는 언제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셨기에 이 긴 여정을 잘 마무리 지으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머릿속 흐릿해지는 인생의 발자취를 활자로 남기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더보기
정일 가브리엘(Gabriel)(신부(가톨릭상지대학교 총장))
이 책을 쓰는 동안 일생을 살아낸 삶의 흔적들을 찾아내고 곱씹으며 하나하나 기록하고 다듬는 기쁨이 얼마나 컸으리라 짐작이 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의 커다란 무상의 선물일진대 희로애락으로 점철된 삶 그 모든 국면들 하나하나가... 더보기
이현영(전 평촌고등학교 교장)
책 명을 명자꽃으로 정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이름자가 들어있어 친숙하고 정겨울 뿐만 아니라 그 꽃의 빛깔로부터 밝고 선명함을 느끼게 되고 꽃말이 지니는 신뢰 겸손의 의미와 명자꽃의 산뜻함도 친구를 연상... 더보기
박부자(전 단국대 교수)
친구의 사무실은 동창들의 사랑방이었고 사정이 어려워진 친구들, 외국에서 고국을 방문하는 친구들은 그의 집에서 유했고, 절친의 배신 후에도 이런 보살핌은 이어지고 이제 다사다난했던 일들은 잔잔한 복으로 바뀌어 아름다운 노년을 ... 더보기
손공자(실버넷TV 편집 기자)
매사에 부지런하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어서 마음만 먹으면 다해내는 능력있는 여성이고 앞서가는 탁월함을 지닌 멋을 아는 멋쟁이였고, 몸이 아파 병치렐 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총정리하는 생활수필을 남길 술 아는 자랑스러운 친구.... 더보기
----
책 속으로
엄만 가끔 말씀하셨다. 그 시절에 딸을 낳고 으스댔다고…. 그렇게 양가 모두가 처음 맞는 손녀였다. 외할아버지는 갈수록 점점 더 흉포해지는 왜정 치하에서 싹싹 긁어가는 공출을 피해갈 수 없었고 더욱이 딸이 해산할 그때는 한참 보릿고개이다 보니 출산 후 쌀밥도 제대로 못 먹일 것이 염려되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두 분만 아시는 비밀의 두꺼운 요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한다. 특수제작품인 그 요 속엔 물론 푹신한 흰 솜 대신 하얀 쌀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러니 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두꺼운 쌀 침대에서 태어난 것이다.
본문 중에서 46p
3살, 6살, 9살의 우리 삼 남매는 자고 나면 항상 다른 집에 있었다. 한번은 우리 집 머슴살이를 하던 한 서방네 다락에서 셋이 앉아서 자고 있었다. 벽장이 너무 좁아 셋을 누일 수도 없었는가 보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쌀밥을 자주 먹을 수 있었던 건 엄마의 기막힌 기지와 배짱 때문이었다. 나중에 들어 알았지만, 그때 우리 집에 쌀 넣어 두는 광(안방 뒤에 윗목 측엔 뒷마루 아랫목 측엔 오시이레라고 하는 마루방이 있었는데 우리는 쌀 광으로 썼던 것 같다)은 물론 빨간 딱지가 붙어있었지만, 광의 마루 밑이 부엌 찬장 밑과 연결되어 있던 것이다. 엄마는 그 부엌 찬장 밑을 파고 들어가 쌀 광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고, 쌀가마마다 조금씩 표시 나지 않게 쥐가 파먹은 것 같이 쌀을 꺼내 오셨다. 정말 그 배짱이 대단하지 않은가? 우린 그렇게 엄마의 기지로 굶주리지 않고 쌀밥을 먹으며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
본문 중에서 62p
엄마! 울 엄마! 사십 년도 못 채운 짧은 생을 살다 홀연히 훌쩍 세상에서 떠나버리신 우리 엄마! 난 엄마 딸로 태어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엄만 나의 전부였고, 나를 위해선 뭐든 하셨던 엄마는 열아홉 살이나 먹은 딸에게 유산 사실도 숨기시며, 생리대까지 빨아주셨던 분, 우리 다섯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살다 가신 우리 엄마는 얼굴만 예쁜 게 아니고 마음씨까지 천사 같았다. 엄마는 그렇게 짧게 살다 떠나시려고 그리 모습도 아름답고 마음씨도 순결하고 곱고 선량하게 태어나시었나 보다.
본문 중에서 94p
밥은 굶어도 먼저 동생들을 학교에 보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건 또 엄마의 뜻일 거라고 생각하니 패기가 생겼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지금의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내가 좀 더 독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셋째 혜정에게 양해를 구했다. 내년에 오빠를 먼저 고등학교에 보내고 너는 한해 뒤에 중학교에 들어가도록. 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을 희생해준 셋째. 지금도 셋째 혜정이는 내 가슴 한구석에 앙금이 되어 아픔으로 남아있다. 그렇게 집안을 챙겨놓고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본문 중에서 138p
이사를 하기로 했다. 남편의 문패를 처음 달아 놓고 그이와 함께 드나들었던 대문. 집안 곳곳에 그이의 체취로 가득한 그 집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 복덕방에 집을 내어놓자 반듯하고 향이 좋아 금방 팔렸다. 새집을 구해 이사했다. 모든 것을 잊고 마음을 잡아 새롭게 시작하려 한 그 집도 남편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을 새록새록 떠올리게 하는 그런 집이었다.
본문 중에서 271p 닫기
출판사 서평
이 책을 만들면서 나는 내내 나의 큰누이를 생각했다. 큰누이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동생들을 늘 보살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바로 구로공단에 취업해서 10여 년을 동생들의 학비와 집의 생활비를 보탰다. 문혜성 저자의 네 동생을 비롯한 가족에 대한 헌신은 참으로 대단했다.
어려서는 남부럽지 않은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 평탄대로를 걸었지만, 시대를 초월한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아버지 사업의 몰락과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스무 살도 안 된 나이에 실질적인 소녀 가장이 되어서 동생들의 뒷바라지와 자신의 학업을 힘겹게 감내해야 했다.
가난과 고통, 절망을 끝내게 해줄 것만 같았던 행복한 결혼생활은 셋째 아이를 얻기도 전 남편의 7년여의 병상생활과 죽음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또다시 혼자서 아이 셋의 학업과 생계를 지켜야 하는 궁지로 몰리게 되었다. 하지만 작가는 정말 눈물겨운 노력으로 아이들 셋을 모두 대학 이상 보내며 훌륭한 일꾼으로 키워낸다. 이 정도의 성공 스토리는 사실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에 담긴 내용은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들의 누나 엄마의 공통된 이야기인지도 모른다. 내 누이가 그랬던 것처럼.
이 책을 편집하면서 나는 작가가 서술한 솔직하고 대담한 내용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작가는 이 자서전을 ‘생활 에세이’라고 말한다. 보통 이런 글은 자신과 자신 주변에 얽힌 밝고 좋은 면만 부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작가는 비록 자신의 가족사에 얽힌 부분이라 할 지라고 개별 인물에 대한 과감한 평가는 읽는 이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까지 만든다. 이런 걸 다 써야 하나 하면서.
하지만 부끄러운 일들을 숨기면서 자랑하고 싶은 것만 쓴다면 그것이 과연 한 사람의 80년 인생을 정리하는 생활 에세이로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자신은 물론 자신과 교감했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솔직하고 과감한 서술이야말로 자서전을 쓰는 사람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한다.
자화자찬의 생활 에세이가 아니고 때론 긴장감이 흐르는 장면에 대한 서술 덕분인지 이 책을 읽는 것이 전혀 지루하지 않게 되었다. 한국 현대사 80년의 풍경과 그 속에서 살아가던 민초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평가된다.
이 책을 읽는다면 작가의 동생들과 자녀들 그리고 이런 훌륭한 분을 할머니로 둔 손자손녀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작가와 더불어 한 시대를 살았던 친구들 또한 이 책을 읽으면서 재미난 시간여행을 하게 될 것이다. 작가가 자신 있고 과감하게 서술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작가의 용기와 포기 없는 도전이 살아온 삶의 자세였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분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이다.
앞으로도 자서전을 집필하고자 하는 많은 분도 문혜성 작가처럼 가감 없는 솔직한 서술로 자서전이 결코 재미없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역사와 삶의 일부를 기록하는 문학작품으로 인식하며 써 주길 바란다.
아름다운 지구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모두가 인생의 주인공이다. 자신이 주인공임을 자각하고 자신의 관점과 시점에서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 자서전이 아닐까. 다시 한번 작가의 용기와 적지 않은 분량을 너무나 훌륭하게 집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작가 문혜성이 주인공인 소설을 읽는 듯한 훌륭한 작품이었다. 닫기
----------------
회원리뷰 (4)
교환/반품/품절
Klover 리뷰 (1)
구매하신 책에 Klover 리뷰를 남겨주시면 소정의 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 안내리뷰쓰기
10.0 /10
-----------------------
2r**ia 2020-08-07 22:00:33 총 4 중4 구매 유용해요
소설같은 자서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다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소설같습니다.
이 책도 희극과 비극이 씨줄과 날줄이 짜여져서 아름다운 천을 만들어 내듯 한 사람의 생애가 그렇게 보여지는 듯 합니다
무엇보다 지치지 않는 열정과 우정이 크게 느껴집니다
80년의 삶을 반추하고 고백하듯 담담하게 써 내려간 글을 읽으며 어느때는 눈물도 나고 공감도 되고 부럽기도 했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상황을 만났다면 이렇게 살아내지 못했을겁니다
참 대단한 어머니이시고 형제이시고 이웃이시네요
저자님의 어머니께서 6.25 동란 때 자식을 살리기 위해 양쪽진영을 왔다갔다하셨다는 대목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때에 살아 남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더한 것도 할 수 있었다는 그 어머니의 그 딸 이십니다. 용기와 지혜와 결단력까지
80년의 시간을 넘나들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좋아요
-----
북로그 리뷰 (4) 전체보기 쓰러가기
명자꽃 kk**dol8 | 2020-08-14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그때의 경기도 동탄은 아주 시골이었고,오산역에서 내려서도 8km 이상을 걸어가야 하는 산간벽촌이었다.손녀 손자들까지 우리 식구 모두를 이끌어야 하셨으니...지금도 난 우리 할아버지의 용단에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과수원집으로 이사하던 날,엄마는 짐 트럭이 신작로에 멈춰 서자 앞으로 살 집을 건나다보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않을 정도로 기가 막히셨다고 했다. (-35-)그런데 그날 그렇게 집에 안 간 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이었는지 모른다.그날 통학 열차에서 생선을 실은 트럭과 달리는 열차가 크게 충돌했는데 그 칸이 바로 여학생 칸이었다.여학생들 몇 명이 사망했다.생선과 범벅된 여학생들의 사고 상황이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었다.그러니 불행 중 다행이랄까? 그렇게 그날도 언니는 언니 생일파티로 나를 위험한 곳에 안 가도록 해주었다. (-79-)해방직후 중학 5년을 졸업할 무렵 친구들과 몰려다니는 모습을 보며 엄마는 늘 불안하여 종로경찰서에 근무하는 엄마의 육촌동생 손종아 아저씨에게 부탁하여 늘 비상대비까지 했다고 한다.그러나 삼촌은 근본이 나쁘지 않아 누구를 때리거나 못된 행동은 하지 않았다.시절이 해방 후 격동기라 정국은 어수선했고 젊은 혈기에 사상 등을 논하면서 각종 모임을 하니 어른들이 더 불안했었던 것 같다. 결국 1946년 할아버지는 식구를 동탄으로 이끄시는 커다란 결단을 내리셨다. (-120-)자초지종을 들으신 아버지는 너무 좋아하시며 "너도 이제 결혼적령기이고 무엇보다 부부연이란 일생에 그리 여러 번 찾아오지 않는 법이다"라고 하시며 "그간 네가 고생한 보람으로 집안도 안정되고, 성원도 군에 가고, 아이들도 컷으니 이젠 아버질 믿고 동생들을 맡기고 그 사람 의견을 따르도록 해라."라고 하셨다. (-186-)당시 40세 정도의 김영삼 씨는 너무 멋있는 훈남이었다.약간 이국적인 느낌도 있고, 세련되게 다듬어진 외모에 몸짓이나 제스처가 아주 멋져 보였다.그 해 제6대 대통령 선거가 67년 5월 3일이고 이어서 6월 8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김영삼씨는 몸시 바빳다.겸사겸사해서 그의 사무실로 찾아가 몇 명의 선후배에게 인사를 함께하고 왔던 것이었다. (-200-)저자 문혜성의 본명은 문명자였다. 일본식 이름 속에는 그녀의 삶이 고스란히 느껴졌다.일본에 의해 시작된 미국의 진주만 공격이 있었던 해, 1941년 7월 17일 음력 유월 스무사흗날, 지금의 종로구 돈화문 옆 현대사옥 자리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소학교를 다니던 해,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부농이었던 문씨 집안에서 성장한 저자는 전쟁이하 암울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1946년 가족 전체를 가까운 허허벌판 동탄 인근으로 모두 옮기게 되었다.할아버지 주도의 가족 대이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시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공산당을 무찌르자고 외쳤던 반공 교육 때문이었고,그로 인해 화가 집안에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한편 이 책에는 저자의 불행도 엿볼 수 있었다.저자의 엄마는 임신 휴유증으로 마흔이 되는 해에 엄마는 돌아가시게 되었다.그 과정에서 스스로 엄마의 역할을 도맡아 하였고, 집안을 일으키는 소녀 가장이 되어야 했던 그 지난날의 고통과 시련,고난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인생을 개척하게 되었다.자신과 가족을 함께 챙겨야 한다는 그 의무감 속에서 창덕여고를 졸업하였고, 자신의 뜻에 맞는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다.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했던 저자가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강인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즉 집안의 책임과 의무에서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였고, 비로서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사회에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이 책은 바로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였다.물론 저자처럼 부농은 아니었지만, 이 책을 통해 6.25 동란 전후의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을 상기시킬 수 있게 되었다.소위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서 1946년,할아버지의 의지에 따라서 가족 대이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시대가 웃어른을 우선시하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이다. 소위 보수주의 적인 가정 속에서 성장한 저자가 결혼이후,스스로 사회에 나가서 자신만의 삶을 개척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으며, 저자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꽃을 피워 나갈 수 있었다.
--------------
명자꽃 ne**orea21 | 2020-08-14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역사는 도도히 흐른다.국가의 역사이건 도시의 역사이건 아니면 개인의 역사이건 도도히 흐르는건 어쩔 수 없는 운명같은 것이다.그러나 국가나 도시의 역사 보다는 개인의 역사를 들여다 보는것이 어쩌면 시대를 더욱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물론 어떤 의미로든 새로운 역사는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기 마련이고 사람들 역시 그런 상황에 젖어 살기
마련이지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처럼 국가나 도시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지만 개인의
역사는 온전히 역사의 진실로 기록될 수 있기에 우리는 어쩌면 자서전이나 개인의 평전을 기꺼이 환영하는지도 모른다.
이 책 "명자꽃" 은 지나치게 똑부러지고 똑똑했던 그러나 명자꽃 같던 아이의의 성장과 삶의 과정을 녹록치 않게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다.물론 저자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고개를 꺄우뚱 하게되는 경우도 있지만 80년 세월의 역사는 현실 세계의 우리가
갸우뚱 거릴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해야 한다.인간은 우매한 동물이다. 실제로 자신이 겪어 보지 않은 상태에서도 마음만으로 이해 한다고 말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물론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상대의 아픔을 진실로 동병상련의 마음처럼 이해한다면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말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게 바로 우리의 진실이자 현실임을 생각하면 팔순의 저자가 생각하고 살아왔던
생의 고락과 환희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기에는 어줍잖은 느낌이 분명 존재한다고 하겠다.
삶과 죽음의 행진곡, 행진곡이라면 환희에 찬 행진곡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끊어짐 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로의 행진곡을 생각하면 삶과 죽음은 인간에게 행진곡과 같은 의미를 전해 준다고 하겠다.저자의 삶에서 마주하는 삶과 죽음의 행진곡 역시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얽히고 ̄혀 있음을 볼 때 역시
죽음 보다는 삶의 환희를 노래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마땅한 의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살아 있음에 지난 세월의 모든 일들을 회고하며 삶의 희노애락을 전해줄 수 있는 마음의여유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어쩌면 저자 자신의 삶의 고락과 환희도 후손들에게는 삶의 자양분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일이다.팔순의 저자가 밝히는 삶의 시간이 그냥 허투루 살아온 삶이 아니듯 우리의 곁에 존재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다시금 돌아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일으켜 준다.저자의 이야기 속에 끊이지 않는것이 바로 가족의 역사이고 그들의 삶이며 죽음이고 보면 우리 역시 자신을
둘러 싼 조상과 부모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해야 한다는 철들은 의식을 갖게 해 준다.
----------------
파란만장했던 인생이셨어요.. wa**ku | 2020-08-14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젊은 시절 기차 안에서 백발의 할머니가 조용히 돋보기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부러웠다던 저자는 자신도 저 나이에 저렇게 평화로운 얼굴로 책에 얼굴을 묻으며 나이들길 원했었지만 책에 남긴 기록을 보아 파란만장했던 인생이셨다.
프로필 사진을 보면 멋지게 연세드신 인자하신 모습이다. 모두의 가슴에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나 기억들은 어떨까? 따뜻? 엄숙? 각자마다 다른 성품을 가지신 어르신이실 것이다. 저자 문성례는 고3 시절에 어머니를, 결혼후 34살에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동생 넷과 아버지를, 아들둘과 딸하나를 먹여살리면서 그 시절 드물게 대학까지 나오셨고 초창기 물리치료사로 활동하시고도 아직 활기차게 살아가시는 팔순의 노익장이시다.
"인생이란 낯선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테레사 수녀의 말을 인용하면서, 찰나의 불꽃같은 인생, 자랑하며 내세울 것 없이 살아온 그 여인숙에서의 하룻밤의 일들을 만추하듯, 굴곡 많은 한 여자가 주어진 많은 것들을 잃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무거운 십자가를 온몸으로 부둥켜안고 포기보다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달려들어 오로지 목표한 바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려 했다. 언제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셨고 가족, 친지, 친구들과의 희로애락의 긴여정을 자서전이라는 인생의 발자취의 활자로 남겼다.
프롤로그에서 밝힌 것처럼 'Autobiography(자서전)'라는 거창한 말보다 저자가 살아온 'Life Essay'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다면서, 철없이 놓쳐버린 엄마와의 가슴 아픈 이별, 요절하는 남편을 못 잡고 보내며 남긴 몸과 같은 자식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울고 웃게 하는 가족들과의 흘러간 추억들을 모두 담아보았단다. 이 책을 읽는 내내 인자하신 할머님이 옛날 이야기를 조곤조곤해주시는데 평안함과 안타까움을 느꼈고, 긴 인생을 살아오신 모습이 강물 흘러가듯 아름다웠다.
명자꽃의 꽃말인 겸손과 산뜻함이 저자를 연상케한다는 친구의 말처럼 친숙하고 정겨울 뿐만 아니라 그 꽃의 빛깔로부터 밝고 선명함을 느끼게 하는 인생, 그 모든 국면들 하나하나가 다 놀라운 삶의 경의를 표하게 한다. 언제나 열정이 넘치고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온 아름다운 인생, 열심히 사셨어요. 존경스럽습니다.
톱픽,
나 살았을 때 자주 내려와! 나 죽으면 헛거여. (p101)
닫기
명자꽃 le**2001 | 2020-08-06 | 추천: 0 | 5점 만점에 4점
명자꽃이라고 하면 인기가 많거나 아름다운 꽃이라는 꽃말이 있는 것처럼 글속의 여인은 참 곱고 아름다웠나봅니다.
자서전을 쓴다는 것은 용기를 내야하고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처음 명자꽃이라고하여 한여인이 사랑을 받고 행복해 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여인으로서의 물질적 정신적인 행복한 삶을 통하여 성공한 한 여인의 삶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6.25라는 전쟁을 겪었고 또한 박정희대통령의 군사정부를 맞고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현재의 삶으로 이어졌지만 저자의 삶 베이비부머세대인 한 사람으로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순간 순간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엄격하고 권위적인 통제속에서 사랑을 받고 성장했던 삶 그 당시에는 어느 누구나 일제시대를 살아온 어르신이라면 권위적이고 엄격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사고방식속에서 여성은 대접을 받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자는 어릴적 남부럽지 않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모두 했고 사랑을 듬뿍받은 것이 책속에서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이지만 부모의 사업이 망하고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 성인이 되기전에 소년 소녀가장이 되어 남은 동생들을 책임져야 하는 시절 그는 일과 공부를 힘겹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하다보니 가난과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 한 구석 결혼하여 둘째 아들까지 낳고 셋째 아이를 낳기전 남편의 병 수발과 죽음을 통하여 아이들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어려운 시간을 견디어 내어 세 아이를 대학까지 공부를 하게 하였고 그 다음 자기의 인생을 살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당시 여인들 엄마나 누나 장녀등은 자기 자신보다 아들을 위해 사는 삶이 여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자는 우리 나라 6.25전쟁과 경제개발등을 통하여 사업을 하고 성공을 하여 자신의 멋진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본이 되게 하였다는 것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대단다하고 생각됩니다.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베이비부머세대인 저로서 5.16혁명때 출생하여 경제개발의 성자을 거친 세대로써 저자의 삶을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로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었다면 대우받고 사랑과 존경을 받았으리라 물론 요즘 세대의 남자와는 입지가 다르지만 우리 나라의 많은 여성들은 남성을 위해 살아가야 했고 고통과 무시등을 참아내야하던 시절 그 많은 시간을 견디어 내고 지금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에 한 사람의 여성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요즘처럼 편안하고 대우만 받으려고 하고 나만을 아는 개인주의 이기주의에서 저자의 삶 고달프로 힘들었으나 잘 살아왔구나하는 자부심이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책을 통하여 저의 어린 삶을 비교해보았고 예전의 시대를 비교하면서 읽어볼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닫기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쓰기 나의 독서기록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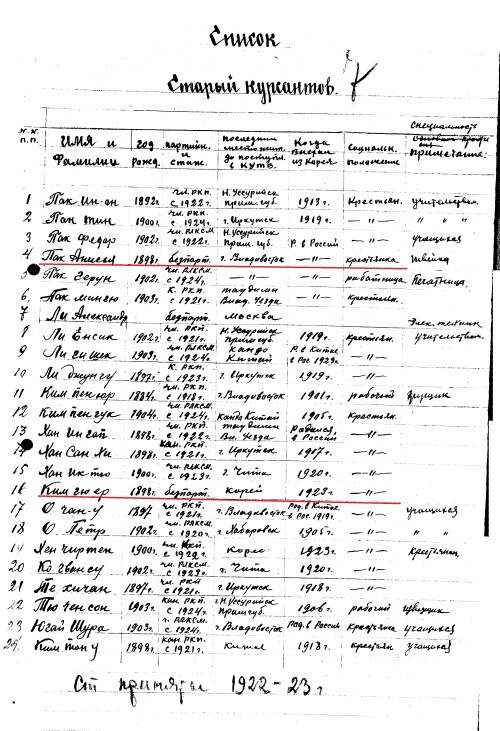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을 찾은 서청원(오른쪽)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1일 일본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자민당 소속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과 오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을 찾은 서청원(오른쪽)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1일 일본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자민당 소속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과 오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쿄 소재 '산업유산정보센터'에 소개된 군함도
도쿄 소재 '산업유산정보센터'에 소개된 군함도













 Corbynista, or Faragesque?
Corbynista, or Faragesq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