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드 A. 헨리의 <<서울, 권력 도시 - 일본 식민 지배와 공공 공간의 생활 정치>>(김백영, 정준영, 이향아, 이연경 공역, 산처럼, 2020)
1.
헨리 교수(미국 역사학자)는 “식민지 근대”의 실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파헤쳤다. 그는 서울의 공간을 중심으로 식민지의 현실을 바라보았다. 1920년대 중반이야말로 일제 강점기의 역사적 분기점이었다는 것인데, 공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그는 1910년에서 1925년까지, 1925년에서 1937년까지, 그리고 1937년에서 1945년까지 3개의 시기로 나누어 ‘식민지 근대’의 문제를 분석했다. 독창적인 시각이라 하겠다.
그가 주목한 것은 일상생활의 현장, 특히 길거리와 전시장, 마을과 집의 내부였다. ‘살아 있는 공간’ 안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한 권의 책을 서술한 것이다. 특히 경복궁 터전을 비롯해 남산의 신토(神道)와 식민지 당국이 주도한 위생 캠페인의 장소에 주목해, 삶의 여러 주체들이 뒤섞인 ‘접촉 지대(contact zone)’를 유심히 관찰하였는데, 이 점이 이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접촉지대에서는 총독부의 당국자, 일본인 유력자, 친일파 조선인(물론 현재의 한국인이다. 이하 같음), 민족주의 지식인, 잇속에 밝은 상인과 모리배, 일본인 게이샤와 조선인 기생, 샐러리맨과 소시민, 학생, 빈민, 고아, 소매치기와 날품팔이꾼 등이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어지럽게 직접 간접으로 교차하며 연결되었다. 그들이 서로를 속고 속이는 일종의 다중적 상황극을 손에 잡힐 듯 묘사했다는 점, 이것이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다.
2.
일본제국은 조선인을 자기네 “신민”으로 만들고자 했다. 이른바 “동화 정책”을 폈던 것인데, 그 결과는 과연 얼마나 성공적이었을까. 헨리 교수의 다각적인 분석에 따르면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제국의 시도는 뜻밖의 암초에 부딪혀 차질을 빚기 일쑤였다. 예상을 뛰어 넘는 재정적인 압박이 따랐고, 다양한 주체들이 저마다의 이해관계 때문에 저항을 계속하였기 때문이다.
두어 가지 예를 들어보자. 1925년 이후 조선인도 우여 곡절 끝에 조선신궁에 정식으로 참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신궁은 진정한 의미의 숭배의 장소는 아니었다. 그보다는 오히려 볼만한 관광 장소에 그쳤다. 식민지 정책의 한계가 여실하였다.
제국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개최한 박람회도 비슷한 거였다. 지배자들은 근대적 ‘진보’를 과시하고 근면, 성실, 검소의 윤리를 식민지 전반에 이식하고자 했다. 조선인 엘리트들은 이를 수용하였으나 대중은 딴판이었다. 그들에게 전람호란 오락과 상업적 관심거리에 불과하였다. 일본 제국은 가난한 조선인들에게 박람회의 참여를 강요하기도 했으나, 효과는 별로 없었다고 하겠다.
저자는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제의 “동화 정책”은 끝내 완성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옳은 지적이라 생각된다. 그도 그럴 것이 일제는 패망 직전까지 말로는 “동화”를 부르짖었으나 그것은 다만 하나의 정치적 수사였고, 그 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다. 강압적 지배자들은 식민지 안에서 민족과 계급의 차이를 극복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한 적이 결코 없었다.
3.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강요한 일제 강점기, 그에 관하여 저자 헨리 교수는 새로운 관점에서 많은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책은 현대의 한국시민들에게 읽는 즐거움과 신선한 지적 충격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94Kyongsu Chung, 한영실 and 92 others
11 comments1 shares
LikeComment
Share
Comments

Alexandria Ryu 이런 책을 우리가 못 쓰고 외국 교수가 쓰셨군요 ㅠ
Editorial Reviews
Review
"A major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the history of twentieth-century Korea."(John Whittier Treat Korea Journal 2015-04-01)
"A most welcome addition to the field of Korean studies."(Alexis Dudden American Historical Review 2015-04-01)
"[Assimilating Seoul] delivers an impressive contribution to the growing collection of research on Japanese imperial history in Korea, and the Japanese-Korean relationship in particular. ... It defies categorization as either a Japanese or Korean history to serve as a valuable artery of both during the time of Japan’s colonial subjugation of the peninsula."(Mark Caprio Reviews in History 2015-04-23)
"The first in-depth study in the English language of the history of Seoul in the first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 . . entertaining and highly readable . . . a welcome addition to the growing literature on Korea’s colonial history and on urban history more generally."(Janet Poole H-Net 2015-07-01)
"A detailed study of Korean and Japanese identity and adaptability in the colonial setting... Assimilating Seoul will be required reading for anyone study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Korea, for scholars of colonialism in general, and for students wanting to look beyond purely nationalist narratives for understandings of the past."(Donald N. Clark Pacific Affairs)
"A new and insightful perspective."(Steven Denney Sino-NK 2015-01-23)
"Henry does an excellent job . . . Highly recommended."(Choice 2016-08-01)
"Assimilating Seoul provides a nuanced view of Japan’s colonial endeavor in Korea. . . . A respectable contribution."(Japanese Studies 2015-05-04)
"Bold and ambitious . . . A timely and provocative study."(The Journal of Asian Studies 2015-08-01)
"Assimilating Seoul provides a wealth of information and brims with fresh insights... Henry's adept probe into the city's physical and conceptual ambits is remarkably perceptive." (Journal of Japanese Studies)
From the Inside Flap
"Moving beyond top-down accounts of colonialism, Assimilating Seoul offers a richly textured, on-the-ground understanding of how Japanese rule operated and was contested in Seoul. The book’s careful and vivid reconstruction of the entanglements of the state with city residents makes the powerful argument that the materiality of colonial power should be understood in the configuration and experiences of urban spaces. It is a splendid combination of urban and colonial histories." ―Gyan Prakash, author of Mumbai Fables
"In this illuminating examination of spatial politics in Japanese-occupied Seoul, Todd Henry takes us into the labyrinth of colonial governmentality. His captivating analysis of public ritual, city planning, and industrial expositions reveals the varied uses of urban form as a technology of rule--as well as the limitations of state power. A model study of the colonial city."―Louise Young, author of Beyond the Metropolis: Second Cities and Modern Life in Interwar Japan
"Few issues in the history of world colonialism are as conceptually challenging as the problem of assimilation within the Japanese empire. Henry offers a fascinating approach to the contentious politics of what it meant to be a Korean colonial subject under Japanese rule. The many answers to this problem are sure to stimulate debate."―Andre Schmid, Professor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Toronto
"This is one of the best books on modern Korean history I've read in recent years. Henry breaks new ground, especially in English, in his focus on the 'spaces' of colonial rule, and his command of such rich and varied primary sources is impressive. Assimilating Seoul is a fascinating read."―Carter J. Eckert, Yoon Se Young Professor of Korean History, Harvard University
See all Editorial Reviews
서울, 권력 도시 - 일본 식민 지배와 공공 공간의 생활 정치


토드 A. 헨리 (지은이),김백영,정준영,이향아,이연경 (옮긴이)산처럼2020-01-10원제 : Assimilating Seoul: Japanese Rule and the Politics of Public Space in Colonial Korea, 1910?1945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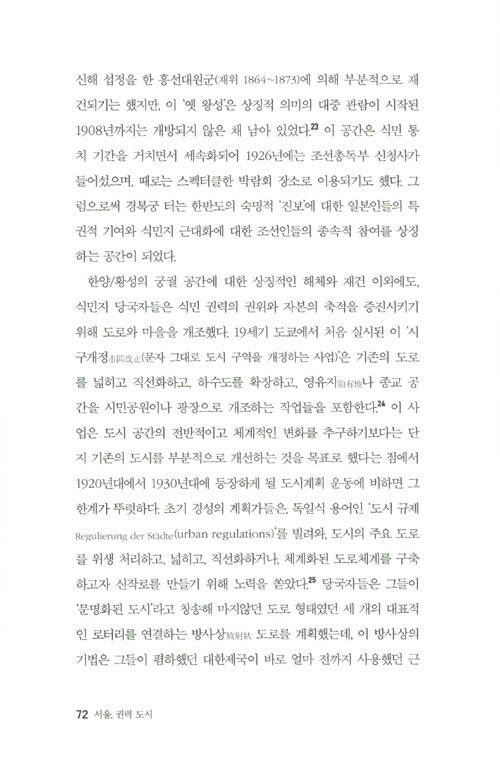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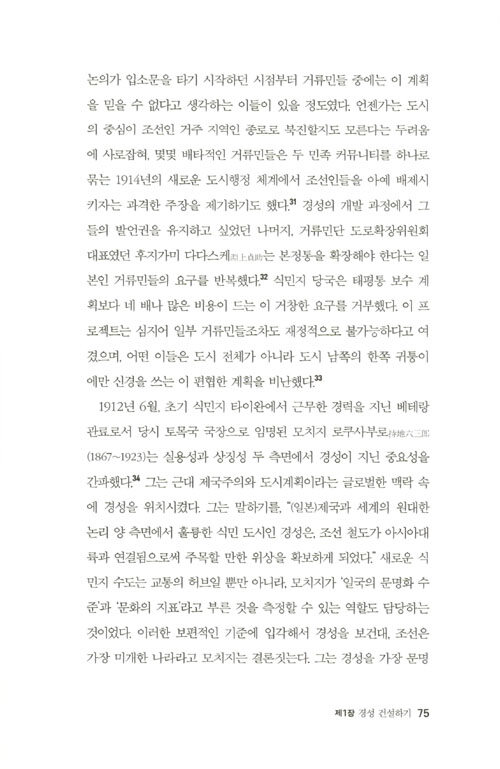










2020 필수 지식교양! 본투리드 젓가락(대상도서 포함 국내도서 25000원 이상 구매 시)
정가
28,000원
판매가
25,200원 (10%, 2,800원 할인)
마일리지
1,400원(5%) + 멤버십(3~1%)
+ 5만원이상 구매시 2,000원
세액절감액
1,140원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대상 및 조건 충족 시)
배송료
신간도서 단 1권도 무료
수령예상일
지금 택배로 주문하면 오늘(17~21시) 수령
최근 1주 88.7%
(중구 중림동 기준) 지역변경
역사 주간 24위, 역사 top10 2주|
Sales Point : 4,160
이 책 어때요?
카드/간편결제 할인
무이자 할부
수량
장바구니 담기
바로구매
선물하기
보관함 +
전자책 출간알림 신청
중고 등록알림 신청
중고로 팔기



기본정보
반양장본
484쪽
152*223mm (A5신)
693g
ISBN : 9788990062918-
--
책소개
토드 A. 헨리의 <서울, 권력 도시>. 일본의 식민 지배 시기(1910∼1945) 서울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조선 왕조의 수도였던 한양은 서서히 일본적 근대의 전시장으로 전환하면서 많은 부분이 파괴되고 식민 지배를 위한 새로운 무대로 만들어졌다.
서울의 공공 공간 중에서도 특히 경복궁 터, 남산의 신토(神道) 신사, 그리고 근린 위생 캠페인의 장소 등은 식민지 조선인들을 충성스럽고 근면하며 공덕심을 지닌 일본 제국의 신민으로 만들려는 폭력적이고 논쟁적인 '동화 정책' 과정의 핵심적인 현장이었다.
따라서 식민지 시기 서울의 이런 공공 공간의 분석을 통하여, 일제의 식민지 동화 프로젝트가 전개된 구체적 양상을 정신적(spiritual), 물질적(material), 공중적(civic)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이 책은 '식민지 근대'의 실상이 무엇이었는지를 당시 서울이라는 공간에 살았던 사람들이 보고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통해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어 흥미롭다.
목차
한국어판 머리말
머리말
서 장 동화와 공간: 식민 지배의 문화기술지를 위하여
제1장 경성 건설하기: 식민지 수도의 불균등한 공간
제2장 정신적 동화: 남산의 신사와 제전
제3장 물질적 동화: 경복궁과 식민지 박람회
제4장 공중적 동화: 주민 생활의 청결과 위생
제5장 황국신민화: 전시체제기 도시 공간의 재편
에필로그 제국의 소멸 이후: 식민 이후 서울의 공공 공간 다시 만들기
미 주
참고문헌
옮긴이의 글
찾아보기
책속에서
첫문장
이 장에서는 조선의 왕조 수도인 한양의 상징적 · 물리적 경관을 식민지 수도 '게이조', 즉 경성으로 바꾸고자 한 조선총독부의 시도를 추적한다.
추천글
이 책을 추천한 다른 분들 :
문화일보
- 문화일보 2020년 1월 16일자 '이 책'
한국일보
- 한국일보 2020년 1월 17일자 '새책'
경향신문
- 경향신문 2020년 1월 17일자 '책과 삶'
동아일보
- 동아일보 2020년 1월 18일자 '책의 향기'
조선일보
- 조선일보 2020년 1월 18일자
한겨레 신문
- 한겨레 신문 2020년 1월 16일자
세계일보
- 세계일보 2020년 1월 18일자
서울신문
- 서울신문 2020년 1월 17일자 '책꽂이'
중앙SUNDAY
- 중앙SUNDAY 2020년 1월 18일자 '책꽂이'
저자 및 역자소개
토드 A. 헨리 (Todd A. Henry) (지은이)
저자파일
최고의 작품 투표
신간알림 신청
197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나 1996년 조지워싱턴대학 국제관계학과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대학-로스앤젤레스(UCLA)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콜로라도주립대학 조교수, 하버드대학 한국학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2020년 현재 캘리포니아대학-샌디에이고(UCSD) 역사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서울, 권력 도시』와 『퀴어 코리아(Queer Korea)』(편저) 등이 있다.
최근작 : <서울, 권력 도시> … 총 7종 (모두보기)
김백영 (옮긴이)
저자파일
최고의 작품 투표
신간알림 신청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은 도시사/도시사회학과 사회사/역사사회학. 일본 교토대학 인간환경학연구과 외국인공동연구자,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샌디에이고(UCSD) 방문학자, 한국사회사학회 부회장, 도시사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사회학회 연구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2020년 현재 광운대학교 인제니움학부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표 저서인 『지배와 공간: 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이외에 다수의 공저와 논문이 있다.
최근작 : <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 하기>,<서울사회학>,<지배와 공간> … 총 7종 (모두보기)
정준영 (옮긴이)
저자파일
최고의 작품 투표
신간알림 신청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은 역사사회학과 지식사회사. 일본 교토대학 교육학연구과 외국인공동연구자,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 등을 거쳐 2020년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파시즘>(마크 네오클레우스)을 번역했으며, <식민권력과 근대지식: 경성제국대학 연구>, <경성제국대학과 동양학연구> 등 다수의 공저를 출간했다.
최근작 : <문화비평과 미학 (워크북 포함)>,<경성제국대학과 동양학 연구>,<제국 일본의 역사학과 '조선'> … 총 11종 (모두보기)
이향아 (옮긴이)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사회학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은 도시사회학과 역사사회학. 식민지 경성의 공동묘지와 자본주의적 도시화에 대한 박사논문을 썼으며, 2020년 현재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성과로 “Managing the living through the dead: colonial governmentality and the 1912 burial rules”(Journal of Historical Sociology) 이외에 『강남 만들기,... 더보기
최근작 :
이연경 (옮긴이)
저자파일
최고의 작품 투표
신간알림 신청
인천대학교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 연구원 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디자인건축공학부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6회 심원건축학술상을 수상하였으며,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문화재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성부의 ‘작은 일본’ 진고개 혹은 本町> 및 <사진으로 만나는 개항장 인천의 경관>(공저) 등의 저서와 <서울, 권력도시>(공역)의 번역서가 있다. 19세기 말 이후 서울, 인천을 비롯한 동아시아 도시들의 근대화 과정을 일상생활과 도시환경. 그리고 건... 더보기
최근작 : <인천, 100년의 시간을 걷다>,<근대건축 기록과 흔적, 현재>,<사진으로 만나는 개항장 인천의 경관> … 총 5종 (모두보기)
토드 A. 헨리의 《서울, 권력 도시: 일본 식민 지배와 공공 공간의 생활 정치(Assimilating Seoul: Japanese Rule and the Politics of Public Space in Colonial Korea, 1910-1945》 는 일본의 식민 지배 시기(1910∼1945) 서울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조선 왕조의 수도였던 한양은 서서히 일본적 근대의 전시장으로 전환하면서 많은 부분이 파괴되고 식민 지배를 위한 새로운 무대로 만들어졌다. 서울의 공공 공간 중에서도 특히 경복궁 터, 남산의 신토(神道) 신사, 그리고 근린 위생 캠페인의 장소 등은 식민지 조선인들을 충성스럽고 근면하며 공덕심을 지닌 일본 제국의 신민으로 만들려는 폭력적이고 논쟁적인 ‘동화 정책’ 과정의 핵심적인 현장이었다. 따라서 식민지 시기 서울의 이런 공공 공간의 분석을 통하여, 일제의 식민지 동화 프로젝트가 전개된 구체적 양상을 정신적(spiritual), 물질적(material), 공중적(civic)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이 책은 ‘식민지 근대’의 실상이 무엇이었는지를 당시 서울이라는 공간에 살았던 사람들이 보고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통해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어 흥미롭다.
이 책의 특징은
- 이 책은 서울의 역사를 다룬 해외 연구서로서는 단연 독보적인 학문적 경지를 개척하고 있으며, 20세기 한국사를 다룬 해외 한국학 저서들 중에서도 단연 빼어난 학술적 성취를 달성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 근현대사 연구자뿐만 아니라 서울학이나 한국학의 협소한 범위를 넘어서 근현대 일본이나 동아시아의 사회·문화사나 도시·지역사 연구자에게도 큰 지적 자극을 주고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다년간 국내외 학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뜨거운 이슈가 되어온 ‘식민지 근대’ 문제를 재조명하는 독창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있어, 연구자들은 물론 양식 있는 일반 독자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역사의식을 고양시킬 것이다.
- 이 책에서는 ‘무단통치-문화통치-병참기지화(또는 황민화)’로 이어지는 통념적인 정치사적 시기 구분을 깨고, 1920년대 중반을 중요한 분기점으로 설정하는 도시사 혹은 사회·문화사적 관점에서 새로운 시기 구분법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1910년에서 1925년까지, 1925년에서 1937년까지, 그리고 1937년에서 1945년까지 등 이 세 시기를 경성의 공공 공간을 탐사하는 시간적 좌표로 설정하고 있다.
- 이 책의 주된 연구 대상은 ‘정책’이나 추상적인 ‘제도’가 아니라 도시민들의 삶이 펼쳐지는 길거리, 전시장, 마을, 집 안과 같은 일상생활의 현장, 즉 ‘살아 있는 공간’이다. 특히 저자는 식민지 시기에 지배 권력의 동화주의 프로젝트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의 공공 공간이 새롭게 출현했으며, 그 공간에서 다양한 도시적 주체들이 마주치고 뒤섞이는 ‘접촉 지대(contact zone)’가 형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공공 공간에서 벌어진 ‘접촉’의 구체적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침울했던 민족사의 암흑기’, ‘일제의 억압과 수탈’, ‘친일과 반일의 유혈적 드라마’로 통념화되어 있는 지배와 피지배의 식민지 시기 역사적 서사를, 각양각색의 인생 군상들이 빚어내는 예측불가의 왁자지껄한 스펙터클로 그려낸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총독부 당국자들, 재경성 일본인 유력자들, 친일파 조선인들, 민족주의 지식인들, 잇속에 밝은 각종 장사치들과 모리배들로부터 게이샤와 기생들, 샐러리맨과 소시민들, 학생들, 빈민들, 고아들, 소매치기와 날품팔이꾼 등이 비중 있게 등장한다. 저자는 이 다양한 주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이들이 애써 의식적으로 연출한 표면적 행태의 이면에 감춰진 그들의 주관적 체험과 내면 정서까지 포착해내고 있어, 역사 연구서의 성격과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 역사 교양서의 흥미로운 시각에서 스토리텔링이 발휘되고 있다.
- 이 책에서는 식민지 동화 프로젝트라는 하향식 일방통행 정책이 결코 의도대로 관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동화 프로젝트에 의해 창출된 공공 공간에서 이루어진 실제 양상은 제각기 다른 속셈과 아비투스를 지닌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체들이 속고 속이는 역동적인 한 편의 다중상황극을 연출하고 있는데, 이는 식민지 동화주의 정책이 그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대개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식민지 통치성’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었다는 것을 실감나게 입중하고 있다.
- 이 책은 광복 이후 ‘반공’과 ‘반일’을 국시로 하여 등장한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의 통치 이념을 현대 서울의 도시공간에 새겨 넣는 과정에서 벌인 (그중 일부는 여전히 진행형인) 국가주의적 프로젝트들이 과연 일본 식민주의자들이 ‘한양’을 ‘경성’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저지른 ‘만행’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 혹은 얼마나 닮은 것인지 성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세기 한반도가 경험한 격동과 풍파의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그것이 현대 서울에 무엇을 남겼는가 하는 심대하고도 복합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탈식민주의적 문제 제기가 새로운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글로벌 초거대도시로 성장한 현대 서울의 심장부에 도사리고 있는 유형·무형의 ‘식민지 유산’의 문제를 예리하게 겨냥하여, 친일과 반일, 식민지 수탈론과 근대화론과 같은 익숙한 선악 이분법적 역사관을 뒤흔들고 있다.
이 책의 구성과 내용은
<제1부 경성 건설하기: 식민지 수도의 불균등한 공간>에서는 조선총독부가 어떻게 한양/황성이라는 왕도(王都)/제도(帝都)를 일본의 식민지 수도로 전환시켜갔는지 그 궤적을 추적한다. 초기 식민지 계획자들은 대한제국 시기(1897∼1910) 지도자들에 의해 추진되었던 근래의 변화를 무시하고, 메이지 일본(1868∼1912)에서 끌어온 도시 개혁이라는 자신들 나름의 재공간화 프로그램을 추구했다. 하지만 사람과 상품의 순환을 용이하게 하려고 도로를 격자로 만들고 로터리를 설치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이 도시의 원래 동맥 구조에서 그저 작은 부분만을 바꿨을 뿐이다. 이러한 시구개정(市區改正)의 시도는 ‘공익’의 추구라고 치장되었지만 토지 몰수라는 손이 많이 가는 정책을 필요로 했으며, 공덕심을 지닌 주민들의 공동체를 만들려는 일련의 노력을 깎아내렸다. 제1장 후반부는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의 도시계획운동이 토지구획 정리와 수익자부담금과 같은 최신 방법을 도입하는 한편, 조선인 거주자와 같은 새로운 대상에 주목하면서 어떻게 도시계획의 범위를 넓혀갔는지를 검토한다. 하지만 재정적인 제약과 계속되는 저항으로 인해 경성은 고도로 불균등한 방식의 발전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으며, 순환과 위생이라는 근대적 논리 또한 이 도시의 주요 간선도로만을 관통하는 데 그쳤다. 다른 식민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간선도로는 조선총독부의 과잉된 주권적 권력을 구현하게 되었는데, 이는 특히 태평로를 따라 늘어선 건축양식들을 통해 잘 드러난다.
<제2부 정신적 동화: 남산의 신사와 제전>에서는 신토 신사와 이들의 문화적 활동이 천황가에 대한 충성의 감정을 주입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최근까지도 식민지 신사 연구자들은 1937년의 신사참배 강요가 그 이전 시기에도 특징적이었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이런 전시(戰時) 현상에 대해서, 식민지 신토의 내적 모순들을 이용하려는 사회적 행위자와 문화적 대행자들 사이에 갈등과 경쟁이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전개되어왔으며, 그 역사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고 본다. 특히 정신적 동화 프로젝트가 1925년 조선신궁이 건립되기 이전 경성의 유일한 신사 건축이었던 경성신사의 일본인 관리자들이 고안한 잠정적인 조치에서 시작된 것임을 보여주는데, 이들이 이런 조치를 마련한 것은 총독부의 동화주의 레토릭을 따라서라기보다는 이들의 제전(祭典)에서 식민지 사람들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컸음이 드러난다. 1925년 이후에야 식민지인 주민들은 참배를 위해 조선신궁을 방문했다. 하지만 많은 조선인들은 여전히 숭배의 장소보다는 관광의 장소 정도로 취급했다. 제2장 후반부는 신사에 대한 이와 같은 색다른 관행이, 갈수록 경쟁적으로 되어가는 신토 정치의 분위기를 어떻게 반영하게 되는지 밝혀낸다. 총독부가 어떻게 규모가 작은 경성신사의 대체물로 남산 위쪽에 매머드급 신사인 조선신궁을 설치했는지를 묘사함으로써, 이 두드러진 전환을 설명한다. 경성신사의 일본인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이와 같은 유례없는 도전에 맞서, 종속적인 조선인들을 자신들의 제전에 훨씬 더 빈번하면서도 훨씬 더 선별적으로 포섭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식민 국가에 대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ㆍ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몇 가지 새로운 전략들 중 하나였다. 이처럼 신토 신사들이 식민화된 주체들을 일본 혼의 이상화된 형식을 구현하도록 이끌었다.
<제3장 물질적 동화: 경복궁과 식민지 박람회>에서는 옛 경복궁 터(조선총독부 건물이 신축된 터이자 두 차례의 중요한 박람회가 개최된 장소)를 통해 ‘물질적 동화’를 검토한다. ‘물질적 동화’라는 용어를 통해 식민지 관료들이 제국 일본의 내부에서 조선 경제의 불균등한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박람회는 조선인 방문자와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근대적 ‘진보’를 드러내 보일 뿐 아니라, 근면, 성실, 검소와 같은 부수적인 윤리를 이들에게 심어주는 데에도 중심 역할을 했다. 가령 1915년의 박람회에서 주최자들은 서구 건축물과 기계라는 보편적인 표현 양식을 통해 근면성의 이미지를 고취시켰는데, 이들 서구 건축물과 기계는 ‘시대착오적’인 궁궐의 공터와 신중하게 병치됨으로써 강력한 발전의 상징으로 작용했다. 물론 일부 교육받은 조선인들은 이런 근대화의 비전을 제대로 읽어내고 조심스레 수용할 수 있었지만, 엘리트가 아닌 이들 중에서는 박람회를 오락과 상업의 흥미로운 세계와 결부시키려는 경향이 훨씬 더 강했다. 1929년 대공황 기간에 개최된 조선박람회는 원래는 조선총독부 시정(施政) 15주년을 기념해서 1925년에 열릴 계획이었던 행사였는데, 식민지의 발전상을 전시하여 관객들에게 감명을 주려는 의도가 강했다. 동시에 주최자들은 한반도의 발전이 제국의 경제 내부에서 보다 제대로 자리매김되기를 바랐으며, 이를 범아시아 블록과 같은 자급자족적 형태로 생각하려는 패턴은 1930년대를 거치면서 서서히 형성되었다. 부분적으로는 식민 모국에서 온 일본인 관광객을 매혹시키려는 목적으로 디자인되었던 이 1929년 박람회의 하이라이트는 행사장 중앙 대로를 따라 늘어선 전시 홀들이, 이를 만든 건축가들이 ‘순수 조선 스타일’이라고 부르길 좋아했던 양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궁궐과 흡사하게 만들어진 이러한 구조물들은 새로운 동서(東西)의 축을 만들어냈는데, 이 축은 남북 방향이었던 궁궐의 원래 공간성을 바꾸어버렸다. 이처럼 뻔뻔스러운 경복궁의 재공간화와 모조품 미학의 재창조는 이를 식민지 폭력이자 문화통치의 책략이라고 규탄했던 민족주의 논자들이 거세게 비판했다. 이들의 날카로운 비평에 따르면, 이런 ‘조선 스타일’을 수긍하려는 움직임은 부의 분배에 관한 차별적 논리를 은폐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일본인 실업가들과 결탁한 조선총독부가 지휘ㆍ조율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박람회는 농촌의 가난한 조선인들에게 이처럼 큰 비용이 드는 기념행사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심지어 강요하기도 했으며, 이는 식민주의의 빈곤화 효과를 악화시킬 따름이었다. 산업박람회가 이들에게 식민지적 진보의 착취적 논리를 받아들이도록 북돋우었다.
<제4장 공중적 동화: 주민 생활의 청결과 위생>에서는 경성 주민들의 삶에 주목하면서, 계절별 정화(淨化) 및 기타 지역 캠페인들이 개인 신체의 건강을 어떻게 보다 큰 공동체의 건강과 연결시키려고 지향했는지 살펴본다. 특히 위생 규칙과 관련한 경찰의 단속 활동과 값비싼 서양의학 처방 및 그것의 환영받기 어려운 결과에 대한 대중적 저항이 초기 경성(1910∼1915)에서 공중위생이 성공적인 체계로 정착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했다. 일본인 식자층들은 한때 경성을 조선의 “똥의 수도”라고 경멸했는데, 실제로 경성은 1920년대 후반부에서 1930년대 초반 사이 제국의 “병든 도시”라는 수치스런 명성을 떠맡고 있었다. 당시의 의학 리포트를 통해 지금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재조선 일본인들은 이른바 ‘비위생적인’ 조선인들보다도 훨씬 더 전염병 발병률이 높았으며, 치사율도 훨씬 높았다. 또한 이 장에서는 위생적 근대성을 둘러싸고 일본인 식민주의자들과 조선인 민족주의자들이 경합하면서 추진된 의제들이 어떻게 도시 위생과 공중 복리라는 정치적으로 비난받는 문제와 더불어 수렴하게 되는지 보여준다. 식민주의자와 민족주의자 어느 쪽의 캠페인도 이 병든 도시를 치유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서로 결합하여 경성의 거주민들을 가로질러 권력의 그물망을 더 넓게 펼치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하층민들조차도 이 값비싼 그물망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란 불가능했다.
<제5장 황국신민화: 전시체제기 도시 공간의 재편>에서는 태평양전쟁(1937∼1945)의 개시와 더불어 이처럼 서로 달랐던 동화의 프로젝트들과 장소들이 한데 뭉쳐지면서 이 도시의 공간성에서 유래 없는 순간을 낳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천황가에의 충성을 확인하려는 새로운 압력들은 공공 공간의 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내며, ‘내선일체(內鮮一體)’라는 전시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창출했다. 예컨대 갈수록 군사화되어가던 남산 신토 신사의 엄숙한 공간적 영역은 가미다나(神棚. 집 안에 두는 작은 신사)를 설치하고 이세신궁의 부적(符籍)을 보급함으로써 조선인 가정으로 침투해 들어갔다. 이러한 수단들은 물론 완벽하게 성공하지는 못 했지만, 조선인들이 천황이 주도하는 전쟁에 더욱 강력하게 일체감을 갖도록 강요했다. 1940년의 기념행사는 일본국 탄생 26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무대이기도 했는데, 조선인들을 고취시켜 이들 대다수가 후방에 남아 있더라도 태평양전쟁의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것을 독려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성화(聖火) 봉송이나 대경성박람회 같은 이벤트들은 대동아 신민이라는 상상된 공동체의 창출을 꾀하고 있었다. 한반도 전역을 가로질러 여러 장소에서 열린 이러한 제의들은 전시(戰時) 제국이라는 압축된 지형학(topography)을 창출해냈다. 이를 통해 식민지 인민들로 하여금 그들이 속한 지역과 가족에 대한 소속감을 제국 신민으로서의 전망에 종속시키도록 유도했다. 군대와 긴밀한 관련을 맺은 일부 조선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을 전환하기 시작했지만, 말기의 식민 국가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동화 프로젝트의 완성에 도움이 될 법한, 민족, 계급, 그 밖의 다른 차이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일은 추진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들은 말기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의 다민족적 수사학 속에 전략적으로 재통합되어갔지만, 점증하는 죽음의 위협이 엄습하는 전쟁의 최후 몇 년에 이르기까지도 이러한 차이는 황국신민화의 작동방식을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했다.
<에필로그 제국의 소멸 이후: 식민 이후 서울의 공공 공간 다시 만들기>에서는 식민 지배 35년 이후 1945년에 해방을 맞고 한국인들이 식민지 시기 경성의 대다수 상징 공간들을 '부분적으로는 일본인 당국자들로 하여금 남산의 조선신궁을 파괴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민족의 반식민주의적 기념물로 대체하는 과정을 통해' 어떻게 다시 만들었는지에 대해 다룬다. 해방된 지 정확히 50년이 되는 1995년에 식민 통치 시대를 상기시키는 옛 총독부 청사 건물을 제거했다. 그전까지 이 건물은 중앙청(1948∼1986)과 국립박물관(1986∼1995)으로 사용되었다. 총독부 청사가 철거된 자리에 오늘날에는 절반쯤 복원된 경복궁이 들어서 있는데, 이것은 값비싼 탈식민화 프로젝트의 산물로, 복원 공사는 2030년이나 그 이후에 완성될 예정이다. 이 궁궐터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조선왕조의 상상된 영광을 상기시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그럼으로써 이 공간은 남산의 안중근의사기념관과 마찬가지로, 경쟁하는 두 개의 체제로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에서 정권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용도로도 부분적으로는 사용되어왔다. 현대 서울의 설계자들은 이러한 낭만적 과거로의 회귀를 통해서 제국 일본의 당국자들이 조선의 왕도(王都)/제도(帝都)를 일본적 근대성의 전시장으로 폭력적으로 재창조하려고 했던 시기를 계속해서 건너뛰려고 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이것은 한반도의 전근대사의 흔적을 최소화하려 했던 식민지 시기 그들의 선배들의 시도와 닮아 있다. 접기
북플 bookple
이 책의 마니아가 남긴 글
친구가 남긴 글
내가 남긴 글
친구가 남긴 글이 아직 없습니다.
마니아
읽고 싶어요 (5)
읽고 있어요 (2)
읽었어요 (1)
이 책 어때요?
구매자
분포

0% 10대

0%

4.4% 20대

3.6%

13.1% 30대

17.5%

8.8% 40대

19.7%

7.3% 50대

13.9%

2.9% 60대

8.8%
여성 남성
100자평
권력과 웃음이 교차하는 동화(同化)의 동역학
시마무라 아야코(島村文子),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조선철도국에 발령받은 오빠를 따라 식민지의 수부 게이죠(京城)에 자리 잡는다. 여성에게 현모양처나 교사 정도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꿈이 허용되지 않았던 시대, 워낙에 총명했던지라 자신의 운명 정도는 진작 간파했던 그는 용산역 철도관사 근처 만철경성도서관에서 하릴없이 시간을 죽인다.
그런데 갑자기, 칠흑같이 어두운 높은 벽이 그의 눈앞에 불쑥불쑥 나타난다. 오직 자신에게만 모습을 드러내는 성벽에 불길한 예감이 든 아야코는 서둘러 조선을 뜬다. 이윽고, 두 차례의 태풍이 철도의 중심이자 일본인의 새 수도 용산을 집어삼킨다. 1925년 7월의 일이었다. 쑥대밭이 된 용산과 달리, 한때 아야코가 모든 물자를 수운으로 공급받는 주제에 왜 그리도 강에서 멀리 떨어져있느냐며 의아해했던 조선의 옛 수도는 너무나도 멀쩡했다.
다들 눈치 챘겠지만, 아야코는 실존인물이 아니다. 배명훈의 소설 『고고심령학자』(2017)에 등장하는 허구의 인물로, 사건해결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서울이란 ‘도시’에 빙의하려는 코끼리 혼령을 막아보고자 고군분투하는 고고심령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 소설은, 책의 제목이자 중심 소재인 고고심령학부터가 허구란 점에서 자칫 ‘판타지’로 비칠지 모른다.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지적인 작가답게 배명훈은 역사적 사실을 적절히 곁들임으로써 소설의 현실감과 몰입도를 높였는데, 이른바 ‘이중도시’ 역시 그러한 장치 중 하나다.
이중도시란 간단히 말해 두 개의 심장을 가진 도시로, 원래의 중심 옆에 이민족의 정복이나 교통의 발전 등으로 또 하나의 중심이 생겨남으로써 만들어진다. 인도의 델리-뉴델리, 오키나와의 슈리-나하, 몽골의 카라코룸과 더불어 서울 역시 이러한 이중도시에 해당한다. 조선왕조 오백년의 중심이었던 한양(사대문 안) 남쪽에, 용산이라는 군사와 철도의 중심이 일제에 의해 하나 더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코끼리 혼령이 서울, 구체적으로는 용산에 빙의하려 드는 이유도 도시의 중심이 두 개인 꼴을 보지 못해서다.
만약 역사학자 토드 A. 헨리가 『고고심령학자』를 읽었다면, ‘이중도시론’이 문학적 알레고리로는 의미가 있을지언정 학문적으로는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한 개념이라고 단언할 것이다. 그가 바라본 식민지 경성은 지리적으로도, 인종적으로도 중심이 뚜렷하게 갈리는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헨리의 책 『서울, 권력도시』는 경성의 공공 공간을 중심으로, 총독부의 동화(同化, assimilation) 정책에 저마다의 방식으로 ‘반응’한 다양한 인종과 계급의 사람들을 그려낸다. 역자들이 공들인 흔적이 역력함에도 결코 읽기 쉽지 않은 책이지만, 소위 ‘식민지 근대’뿐 아니라 권력과 개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만큼 도전할 가치가 있다.
저자는 식민지 조선에서 이루어진 총독부(식민국가 혹은 식민정부)의 동화정책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재구성한다. 첫째, 동화란 단순히 일본의 정신과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았다. 일본이 조선보다 훨씬 ‘진보’했다는 게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진 만큼, ‘일본인 되기’는 곧 근면하고 청결한 ‘근대인 되기’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는 동화를 정신적(spiritual), 물질적(material), 공중적(civic, 公衆的) 동화로 구분하여 그 외연을 넓힌다.
둘째, 동화는 총독부가 일방적으로 ‘내리꽂듯이’ 이뤄지지 않았다. 근래 한국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나오는 이야기지만, 총독부는 결코 ‘전능’하지 않았다. 늘 돈에 쪼들리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고려해야만 하는, 강력하지만 한계가 뚜렷한 정부야말로 총독부의 실상에 가까웠다. 지배의 대상인 조선인과 일본인 역시 단일한 정체성을 지닌 인구집단이 아니었다. 경성에 언제 터를 잡았는지, 사는 곳은 어디였는지, 얼마나 부유했는지 등은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에 ‘인종’만큼이나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총독부도 동화를 적극적으로 강요할 수 없었고, 다종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경성부민들도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만큼, 엘리트들의 논쟁이나 국가정책을 통해 동화의 실상을 파악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그가 주목하는 건 경성의 ‘공공 공간’이다. 총독부와 경성부민들이 일상적으로 얼굴을 맞대는 이곳 ‘접촉 지대’야말로 동화의 너른 스펙트럼을 남김없이 펼쳐 보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저자는 남산의 경성신사와 조선신궁, 조선왕조의 정궁인 경복궁에서 개최된 두 차례의 공진회와 박람회, 도시 곳곳에서 이루어진 위생검사와 캠페인을 각각 정신적 동화, 물질적 동화, 공중적 동화를 분석하는 공공 공간으로 설정한다. ‘시간’의 구분 역시 ‘공간’만큼이나 신박한데, ‘무단통치-문화통치-민족말살통치’라는 기존의 도식을 묘하게 비틀어버리기 때문이다. 저자는 압도적인 무력으로 불만세력을 ‘평정’한 1기(1910~1915), 통치방식의 전환이 모색되었으나 여전히 갈팡질팡하던 전환기(1915~1925), 명실상부 문화통치의 시대로 접어든 2기(1925~1937), 총력전과 함께 내밀한 사상통제가 시작된 3기(1937~1945)라는 새로운 시대구분을 제시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인종/계급/젠더/거주지에 따라 총독부(사실은 총독부조차 단일한 실체가 아니었다!)가 제시한 동화라는 약속을 전유해간 양상은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그만큼 흥미진진하다. 가령 1898년 세워진 남산의 경성신사는 총독부가 명실상부 조선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등극한 뒤에도 경성의 일본 거류민을 위한 신사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고집스레 이어갔다. 총독부는 1914년 일본 거류민단을 해체하고 1916년에는 마침내 단일한 도시 행정체계를 확립했지만, 경성신사만은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다. 그저 각 지구의 제사를 주관하는 씨자총대((氏子總代)의 일부를 조선인이 맡게끔 강제할 수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1925년 전 조선의 제의(祭儀)를 주관하는 매머드급 규모의 조선신궁이 완공되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똑같이 남산에 자리한 저 거대한 라이벌과 맞서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1919년 터져 나온 엄청난 저항의 에너지를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조선인들을 경성신사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마침 조선신궁이 오로지 일본의 신과 천황만을 모시겠다며 자민족중심주의를 대놓고 선언하자, 잇속 바른 신사의 지도자들은 재빨리 단군을 비롯한 조선의 토착신을 경성신사에 합사(合祀)해버렸다. 1929년에는 아예 단군을 위한 별도의 신전(神殿)까지 만드는 등, 경성신사는 차츰 일본 거류민만의 신사에서 경성부민의 신사로 바뀌어갔다.
급기야, 1931년에는 조선인 씨자총대들이 대제행렬을 총괄하기에 이르렀다. 주체만 바뀐 게 아니었다. 모자와 바지는 신토 스타일로, 그 외에는 흰색 깃과 검정색 두루마기로 맞춘 ‘퓨전’ 의복이 처음 등장했다. 신여(神輿)를 진 일본인들이 외치는 “왓쇼이(わっしょい)”에 조선인 구경꾼들은 “얼싸둥둥”으로 화답했다. 식민통치도 어느덧 20년, 구호에 불과한 줄로만 알았던 ‘내선일체(內鮮一體)’가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걸까.
안타깝게도(?) 이는 몽상에 불과했다. 대제행렬의 총책임자인 전성욱은 스스로를 문외한이라 낮추며 자기 대신 더 부유하고 저명한 일본인이 이 일을 맡아야한다고 제안했다. 오랫동안 씨자조직에서 활동해온 지역 명망가인 그조차도 외부의 권위를 빌려오지 않고서는 자신의 ‘일본인됨’을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이다.
최고의 엘리트조차 이러했을진대, 보다 아래에 위치한 조선인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대다수의 조선인들은 그저 신사 주위를 어슬렁거리거나, 기생과 게이샤에 열광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참배객들의 지갑을 슬쩍했다. 이들에게 경성신사는 경건한 참배의 공간이라기보다는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유원지에 가까웠다. 앞서 언급한 조선인 구경꾼들의 “얼싸둥둥” 역시, 신사의 제전행렬을 나름의 방식으로 전유한 것일 수 있다고 저자는 추측한다.
물질적 동화 역시 마찬가지 결과를 낳았다. 1929년 경복궁에서 개최된 조선박람회는 ‘내지’ 관광객에겐 조선의 이국적인 흥취를 맛볼 수 있는 관광코스였으나, 조선인 민족주의자에겐 식민지 수탈의 적나라한 전시장이었다. 조선인이 3분의 2 가량을 차지한 여성 안내원에겐 ‘키스 비즈니스’를 통해 돈은 물론이고 ‘모던 보이’와의 연애까지 노려볼 수 있는 기회였으며, 시골의 농민들에겐 강요에 떠밀려 큰돈을 내고 참석당한 ‘관제행사’였다.
공중적 동화의 일환인 위생 캠페인이라고 다를 건 없었다. 총독부와 조선인 엘리트들은 경성이 ‘똥의 수도’ 혹은 ‘제국의 병든 도시’로 불릴 만큼 위생수준이 열악하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전자는 이를 조선민족의 열등성을 보여주는 근거로 삼은 반면, 후자는 공공자원을 충분히 확충하지 않는 총독부에 대한 비판의 무기로 삼았다. 말하자면 이들은 같은 침대(同床) 위에서 다른 꿈(異夢)을 꾼 셈이다. 물론 열악한 위생시설의 최대 피해자인 대다수 조선인 하층민들은 침대에 걸터앉을 수조차 없었다.
이처럼 식민지의 수부 경성의 공공 공간에서 펼쳐진 동화의 동역학(動力學)은 정말이지 종잡을 수 없고, 사람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기에 하나의 정연한 흐름으로 정리하기 어렵다. (그것이 아마 이 책을 읽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 복잡한 메커니즘 속에서 유달리 두드러지는 움직임을 찾을 수 있다면, 그건 아마 웃음 혹은 오락이 갖는 고유한 힘일 것이다.
오락은 흔히 선전에 곁들여지는 양념 정도로 폄하되곤 한다. 권력에 대한 불만을 웃음으로 무마할 뿐 아니라, 그 속에 특정한 메시지를 녹여냄으로써 결과적으로 ‘민중’을 권력이 원하는 대로 길들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두환 정권의 3S 정책부터 혐오를 농담화하는 일베의 전략에 이르기까지, 오락을 통한 선전의 효력은 지금껏 한국사회에서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다.
하지만 『서울, 권력도시』에서 보여주는 건 이와는 정반대의 양상, 그러니까 선전이 오히려 그 오락적 요소에 의해 무력화되는 모습이다. 경성신사는 게이샤와 기생을 불러 모으고, 아마추어 스모 대회를 개최하는 등 오락을 통한 은밀한 정신적 동화를 도모했다. 하지만 조선인들은 ‘일본 정신’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경성신사를 유원지로 단정지어버림으로써 역으로 신사의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크게 해쳤다.
1915년 경복궁에서 개최된 조선물산공진회에서도 선전은 별다른 힘을 쓰지 못했다. 이번에도 사람들은 기생에 열광했고, 최첨단 물 펌프를 폭포물 놀이시설로 착각했으며, 잔망스런 원숭이에 매료되었다. 망해버린 왕조의 유적과 국적불명의 ‘모-던’한 전시관을 대비시킴으로써 조선인들을 물질적으로 동화시킬 수 있으리라 믿었던 총독부의 바람은, 경성 사쿠라이 소학교 학생들이 남긴 피상적인 감상 앞에서 보기 좋게 무너져 내렸다. 일본인 소학생들에게도 공진회는 그저 이상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체험이었을 뿐이다. 심지어는 가장 계몽적이고 엄숙해야 마땅할 공중적 동화조차 기생과 활동사진, 바이올린 연주에 의존함으로써 흥미 위주의 오락거리로 전락했다.
결코 의도한 바는 아니었겠지만, 공략하기보다는 낙후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총독부의 동화정책에 성공적으로 저항한 경성의 조선인들은 ‘식민지 근대’를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수탈론과 근대화론, 근대성론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한반도의 ‘근대’를 설명하는 유력한 이론들은 하나같이 그 압도적인 무게에 짓눌려있었다. 다만 ‘근대’가 조선을 철저히 털어먹었는지, 발전시켰는지, 아니면 규율권력을 창출했는지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반면 저자는 정교한 선전을 오락으로 만들어버린 조선인들을 통해 ‘근대’란 기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대담한 생각을 내비친다. 조선인들은 그 안에 담긴 총독부의 의도가 어떠했든 간에 오락을 오락으로 즐겼으며, 총력전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신사 앞에서 조선식 큰절을 했다. 그들은 ‘근대의 폭력’에 저항해야겠다는 거창한 사명감으로 움직인 게 아니다. 그저 ‘근대’를 의식조차 하지 않고 평소처럼 생활했을 뿐이다. 어쩌면 카터 에커트(Carter Eckert)가 말한 제국의 후예(Offspring of Empire)란, 강력한 발전국가나 이에 기생하는 재벌 따위가 아니라 이처럼 권력의 선전에 웃음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다.
- 접기
유찬근 2020-01-19 공감(8) 댓글(0)
Thanks to
공감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