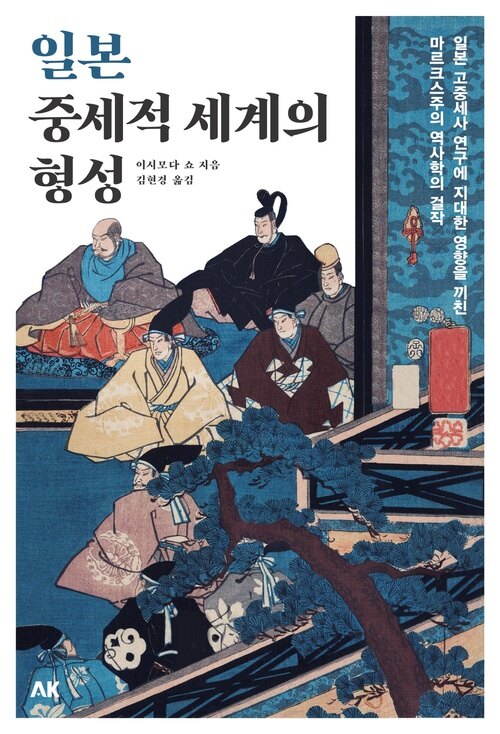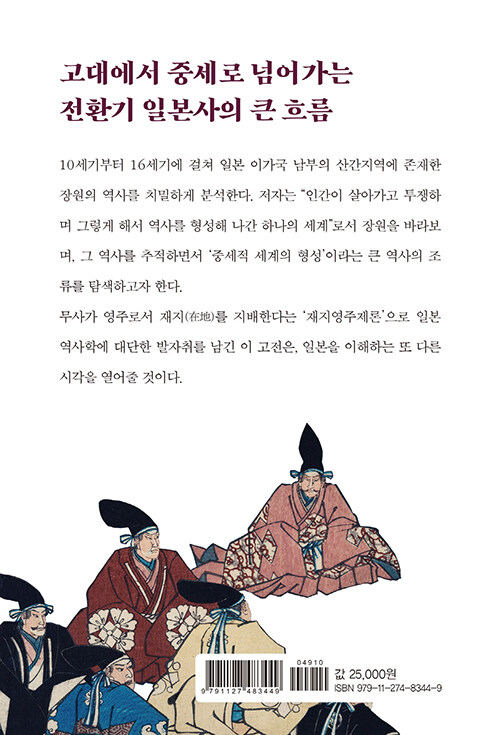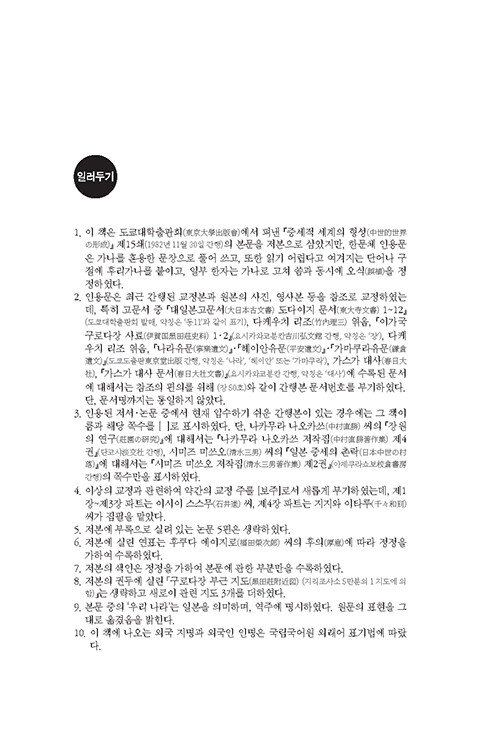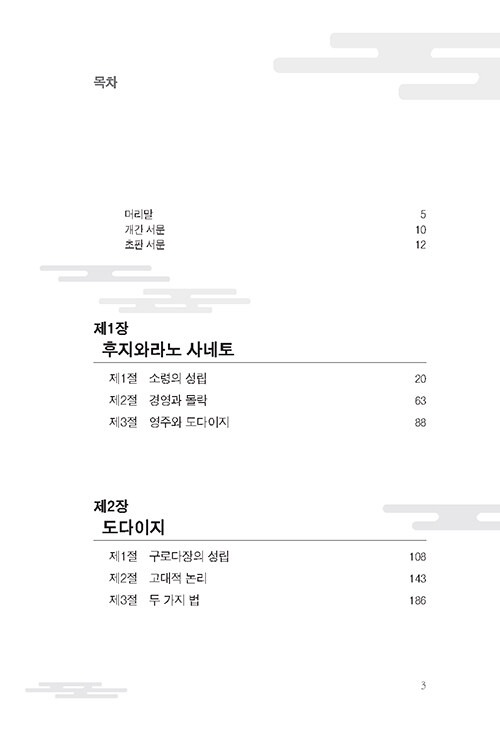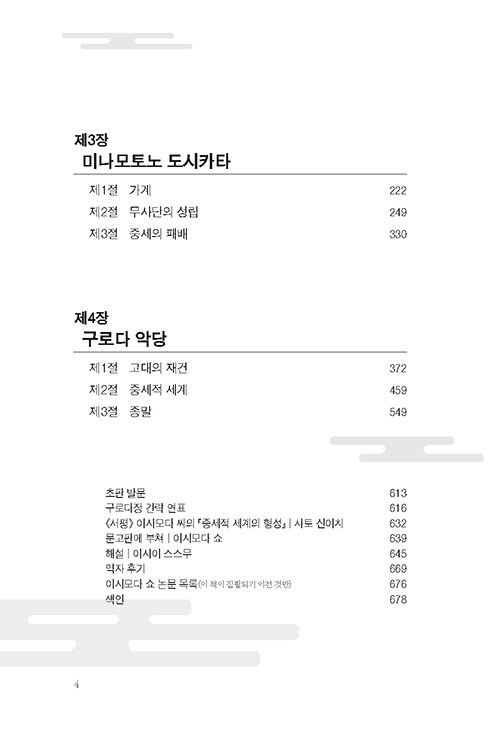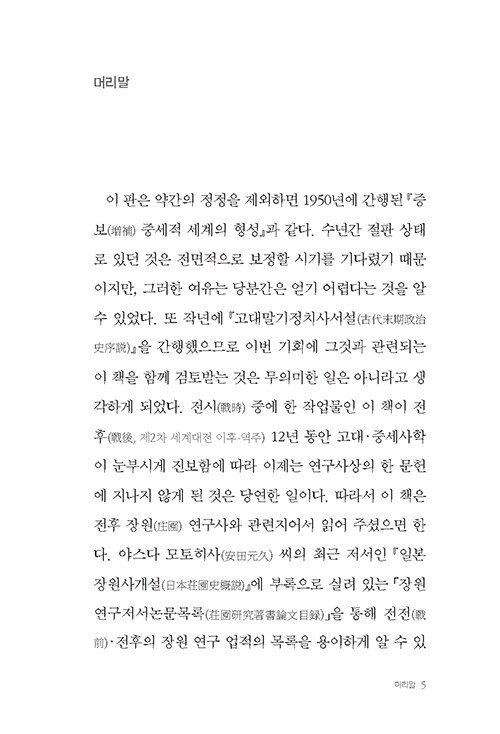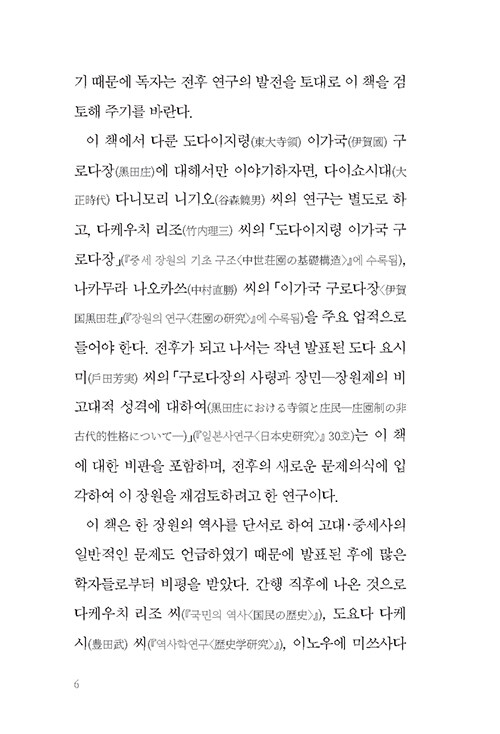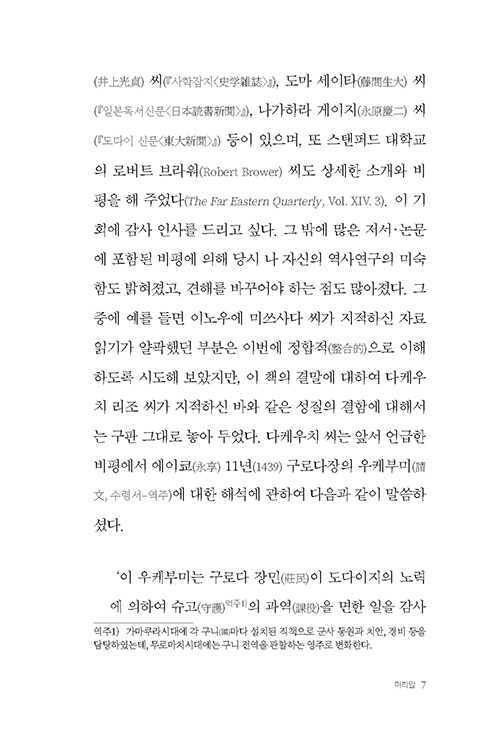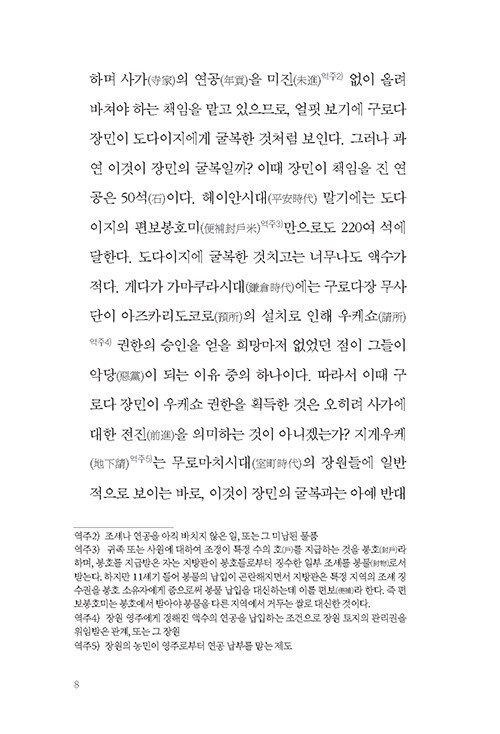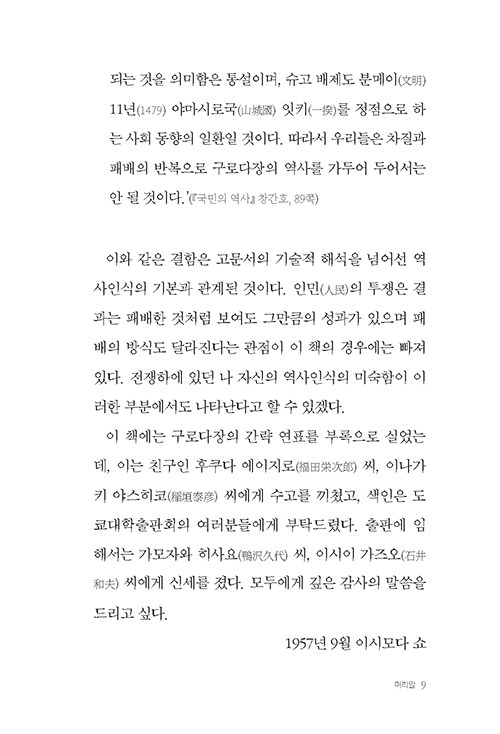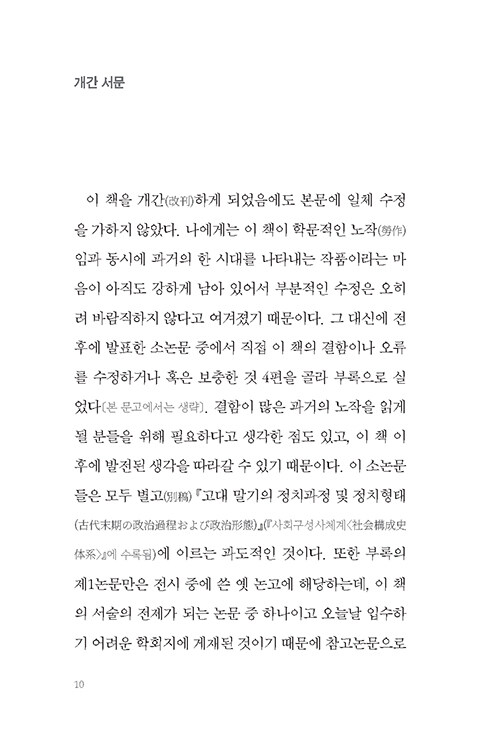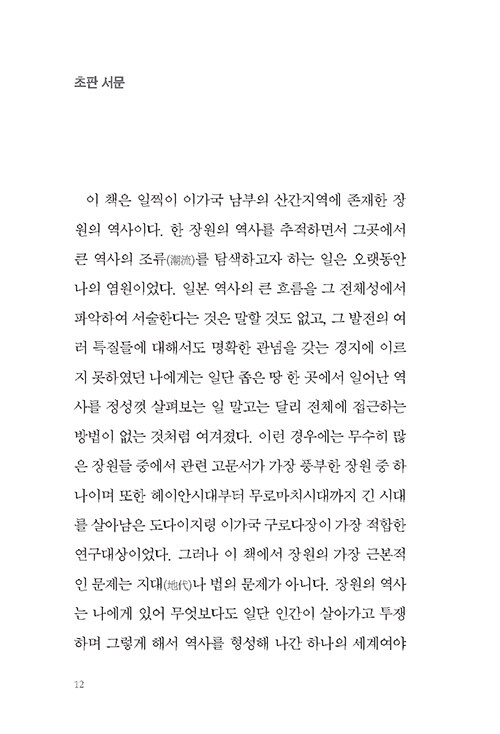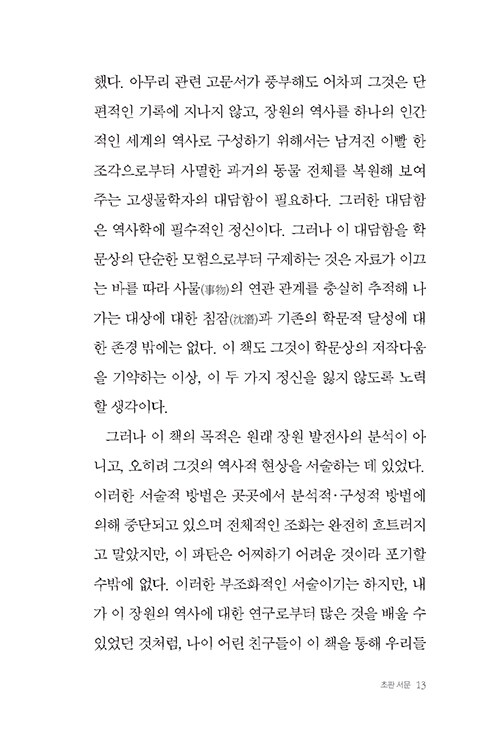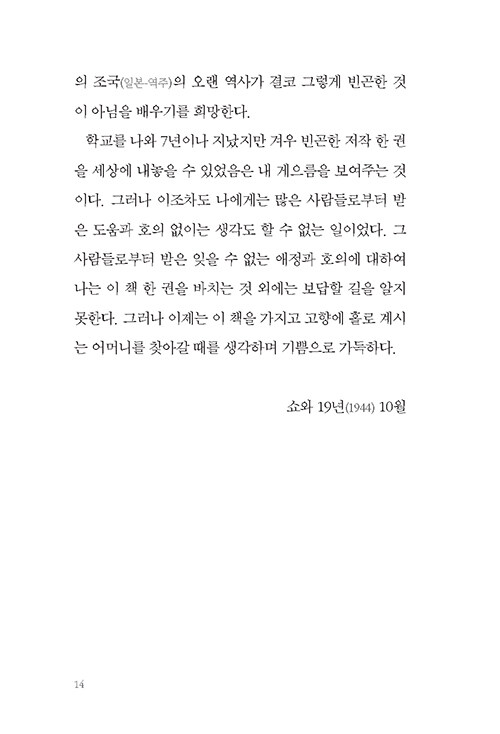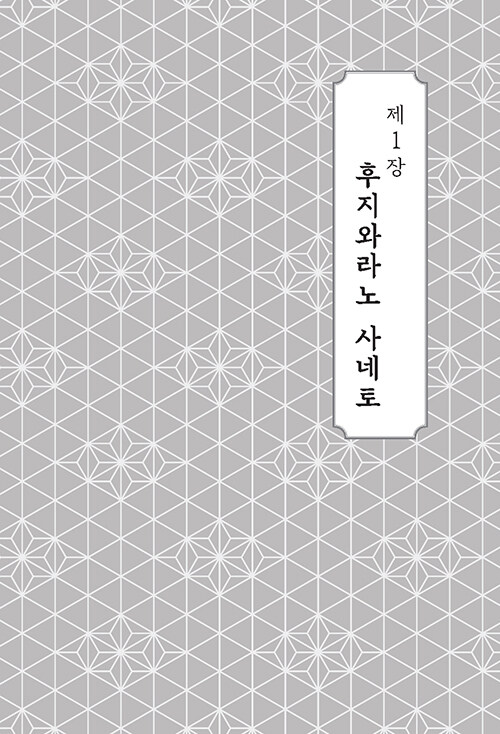家庭内の性虐待【報道特集】
 TBS NEWS DIG Powered by JNN
TBS NEWS DIG Powered by JNN2.66M subscribers
<__slot-el>
Subscribe
<__slot-el>
10K
Share
2,006,411 views Feb 28, 2021
#報道特集 #TBS #性虐待2,006,411 views • Feb 28, 2021 • #報道特集 #TBS #性虐待信頼する家族からの被害。 その実態は中々明るみに出てきませんでしたが 被害者たちがようやく声を上げ始めました。 当事者の方で、フラッシュバックなどの心配がある方はご注意ください。===2,257개의 댓글세진라이프포스라이프댓글을 추가하세요...
@ema77473년 전아버지 장난하지 말고 성범죄의 가해자 남자는 자신이 한 일을 정당화하려고합니다.
2.9K
회신하다
8개의 답변
@gjtmdgpt3년 전나는 아버지가 다른 10세 떨어진 형에게 성학대를 받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4.9K
회신하다
90개의 답변
@user-Lu123453년 전일본은 성범죄에 대해 달콤하다고 생각한다. 성범죄는 신체를 더럽혀 마음을 죽이는 행위일 것이다.
1.5K
회신하다
1 답변
🍑🏻1년 전정말로 흉분 나쁘다. 미국이라든지 성범죄자에게 칩 넣어, 위치 특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왜 일본은 칩 넣을 수 없는 거야? 피해자 쪽이 힘차게 살아, 활동해 주고 있는 것에 감사입니다. 정말 괴로운 생각을 한 분들에게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235
회신하다
@aa50851년 전 (수정됨)이런 아버지 너무 무리.💢💢어머니도 용서할 수 없다💢💢다시 사건을 일으키면 너무 어려워.
226
회신하다
@하라라-t7g3년 전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가해자 본인이 말하는 대사가 아니다. 친아버지에게 성행위를 받는다니 평생 트라우마들.
2K
회신하다
8개의 답변
유우-p4c1l3년 전어머니도 이상. 내 딸이 그런 일이 되면 경찰에 튀어나와 이혼.
1.5K
회신하다
6개의 답변
@ 미라 칸자키1년 전실의 아버지가 딸에게 손을 내는다니, 기분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그런 아버지는 인간이 아닙니다.
2.1K
회신하다
15개의 답변
@완구-t5y1년 전의리의 아버지가 아니고 실의 아버지에 있어 있을 수 없어요.
1천
회신하다
4개의 답변
@키라-f5x1년 전자신의 딸의 아군도 되지 않고 아직도 그런 남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어머니의 신경을 의심한다.
639
회신하다
@8490-y9b3년 전우선 ○살이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다/할 수 없다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분명 차이. 개월째로 갑자기 저항할 수 있을까?
1.5K
회신하다
4개의 답변
@ema77473년 전부모가 아이와 성행위하는 것에 관해서, 저항했다고 하는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 병일까. 있어도 부모에게 있어
2.3K
회신하다
26개의 답변
@보놀론-f1c3년 전뭐가 가해자의 인권이야, 뭐가 자신의 성버릇이야, 자신의 욕구를 저항할 수 없는 딸에게 밀어붙인다니 너무 멋지다.
2.8K
회신하다
18개의 답변
@하타 귤 -o7w1년 전이런 아버지와 지금이라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
182
회신하다
@hamutarohamutaro1년 전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배의 바닥에서 분노가 솟아오른다
810
회신하다
@여기-b9d8v3년 전아버지가 화를 내는 근육은 없다. 이 부모들
1.1K
회신하다
2개의 답변
@ 맛있는 레스토랑3년 전전업 주부의 어머니는 약하네요.
261
회신하다
@uminekoumi3년 전누가 자신의 친아버지와 그러한 행위를 원하십니까?
1.8K
회신하다
9개의 답변
@chinanago-n4b1년 전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니 웃게 하지 마라. 피해자는 수십 년 동안 죽을 때까지 이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하는데 성범죄는 영혼의 살인이라고도 불리는데 실형에서 단 2년 거기서 개정되어도 10년 정도로 나와 버린다고 할 수 없는 더 좀더 성범죄가 엄벌화되도록
161
회신하다
@시트라스-j9b2년 전 (편집됨)자신도 작은 3정도에서 고1정도까지 2세와 3세상의 형 2명으로부터 성 피해를 받았지만 중 3때 고민하고 고민하고 겨우 어머니에게 말하면 「그런 나이니까」의 한마디로 끝납니다 너희들 모두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874
회신하다
12개의 답변
🌸3년 전내 딸과 성행위를하는 곳을 동영상에 찍는다 ... 딸을 여자로 보게 되었다고 진짜로 그래야 이상하다.
1.5K
회신하다
9개의 답변
@요크베니멀-y9k3년 전동의하에?? 성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항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730
회신하다
@tottkodes3년 전부모로부터의 성폭력에 왜 연령제한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가?
1.6K
회신하다
9개의 답변
@케네디 보비7개월 전아무리 역길이야!
112
회신하다
@앤프린시펄리티61323년 전끔찍한 아버지 기분 나쁜 피해자의 여성에게는 정말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248
회신하다
@hamutahamuta39143년 전딸을 지키지 않는 어머니는 어떤 사고의 사람일까. 한다.
2.2K
회신하다
22개의 답변
🌸마이미-d5c3년 전기억하는 것도 괴로운 경험을 실명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용기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953
회신하다
2개의 답변
@도프-ib9xy3년 전아버지에게 억지로 되어 소프양이 된 아이를 알고 있다.
531
회신하다
@sawaraZ3년 전해외에서는 벌써 5세 정도의 아이들에게, 「속옷으로 커버되고 있는 부분을 옷 위에서도 만지면, 그것이 가족이라도 안되는 것. 큰 소리로 NO!라고 말합시다」라고 가르쳐, 큰 소리를 내는 연습까지 하겠습니다. 보건 체육이 시작되기 나이 전에 이런 자기 방어 계몽이 있었다면, "그 당시는 아직 자신이 어렸고 (어쩐지 기분 나빴지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라는 유감스러운 장기간 가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지도.
329
회신하다
1 답변
@wds14663년 전“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말하는 시점에서 반성하지 않았고, 자신이 한 일의 결과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 가해자의 인권은 보호할 필요가 없고, 실명 공개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318
회신하다
@mmm-uv6lx3년 전엄마의 대응, 절망적…
1.8K
회신하다
10개의 답변
@dhdft9993년 전자신의 딸을 "성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그 순간부터 딸의 삶이 "지옥"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1.1K
회신하다
1 답변
ㅅㅜㅜㅜㅜㅜ3년 전자신의 남편이 딸에게 이런 일을 하면 진심으로 살아 있는 채 산에 두고 와요.
717
회신하다
3개의 답변
@ 정신병 개1년 전"가해자에게도 인권이있다"가해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지, 성범죄자는 정말 머리가 이상하다.😢
128
회신하다
@tokoprune93161년 전 (수정됨)저는 61세가 됩니다만,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성학대와 학대하는 것을 받고 있었습니다. 물어봐. 했던 것은 바로 성학대였습니다.”라고 단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딸을 미워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94
회신하다
@rarakiki59423년 전와우… … 무서운 기모이 더럽다.
845
회신하다
뽀뽀 -o7y8j3년 전부모와 자식으로 찍혀있는 사진, 언제나 거리감이 보통이 아니다.
386
회신하다
2개의 답변
@RiceballRamen3년 전너무 심해서 성범죄자 모두 거세해 주었으면 합니다. 용기 있는 고발 감사합니다.😭
294
회신하다
1 답변
@ank71849개월 전가해자 어쨌든 아픈 눈에 있으면 좋겠다.
27
회신하다
@seri28751년 전친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힘들어- 한번이라도 싫지만 몇 년이나 몇년도… 그렇지만, 사람을 깨끗이 하는 일에 취해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에 용기를 받았습니다.실명으로 미디어에 나오는 힘에 존경합니다.
318
회신하다
@유이타3년 전잘 살아주는 눈물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용서할 수 없지만 당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날이 있다면 그만큼 기쁘다.
1.5K
회신하다
2개의 답변
@kimisawa6003년 전그녀는 매우 강하다. 열심히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늘면서 응원하고 싶습니다.
1.6K
회신하다
2개의 답변
@knurmfi033년 전나이에 관계없이 부모와 아이가 성행위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다.
633
회신하다
5개의 답변
@시후-n8x3년 전아버지, 간단하게 편지로 사과하고 자신만 편해지자는 비겁한.
171
회신하다
@dcf 베이9개월 전종신형 + 거세로 좋을 것이다.
34
회신하다
@uqwjs3년 전가해자이지만 인권은 심각하고 죽을 정도로 힘들다.
247
회신하다
3개의 답변
@bonjin_02143년 전이런 일이 되면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고 죽이고 싶다고 살의가 버려 버리고 잘못된 길에 기울어 버리는 것인데, 이 솔직하고 용기 있는 고발은 대단합니다.
1.5K
회신하다
6개의 답변
@aya-kq2fy3년 전일본의 법률은 가해자에게 너무 달콤하다.
204
회신하다
@몬마츠-u5p3년 전일본의 학대에 대한 죄는 가해자에게 너무 달다. 피해자가 얼마나 괴롭고 괴로운 생각을 하고 있는가. 슬프다.
129
회신하다
@mk.34071년 전 (수정됨)유카리의 성욕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임신하지 않게 자신이 응했는가?
384
회신하다
4개의 답변
@마이코-r1n3년 전어머니는 보지 못한 척 하고 있었어? 열매의 아버지가 열매의 딸에게는 믿을 수 없다. 고백한 용기가 굉장하다.
663
회신하다
@user-pr8sj5pe4d3년 전 (편집됨)어느 정도 성장하면 부모에게 닿는 것만으로 조금 하는데....
1천
회신하다
7개의 답변
@nomichan37133년 전실의 부모로부터 소년도 성적 학대를 받습니다.단, 남자의 경우는, 유감스럽게도 어른이 되어도, 경찰에 보고하는 케이스는, 여자보다도 낮습니다. , 「아무도 믿지 않는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이,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적 학대를 하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므로 경찰에 보고해야 합니다.
234
회신하다
@Mmkms101달 전성 학대가 아니라 성범죄라고 표현해 주었으면 한다.
6
회신하다
@michikom75461년 전이런 경우는 대체로 엄마가 아이 측이 아니라 아버지 측에 대해 버린다는 점입니다.
70
회신하다
@OhMyGod_P3년 전어느 쪽의 부모도 기분 나쁘다. 어머니에게도 지켜서 받을 수 없다니 정말 매운 매일이 몇 년이나 몇 년간 계속되어 살아가는 것이 대단하다··· 자신에게 옮겨 생각할 때 죽을 선택하고 있었구나·· ・
193
회신하다
@ 원더풀 스몰3년 전동생의 친구가 (소년) 초등학생 때 아버지로부터 성학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손이 떨리고 분노를 느낍니다.
191
회신하다
1 답변
@ 시로 마루 폰칸3년 전아버지 최저.동의라고 생각하고 있어😢어머니도 최저. 자신의 아이는 지켜라!
396
회신하다
@keiattardo93613년 전나도 의리의 아버지에게, 받은 과거가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면, 지켜 주지 않고, 역길레 된 것이 가장 충격이었다. 얼굴을 내밀고 용기가 있는 행동을 존경합니다. 피해자인 사람이 얼굴을 내밀고 있어, 가해자의 얼굴을 모자이크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았습니다.
92
회신하다
1 답변
@ 산세이부2년 전자신도 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고 왔습니다. 카운셀링을 거쳐 그것이 성적 학대라고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를 거쳐 어머니에게 털어놓았더니, 역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생하고 있습니다.
134
회신하다
@루이코3년 전가해자를 지켜 버리는 "법률의 벽"은 없어야한다.
357
회신하다
1 답변
@구로다 아스카-f9h3년 전 (편집됨)글쎄, 고발해 주셨다. 유카리, 좋은 사람이야, 미안하지만, 어리석은 아버지는 아니야.
1.3K
회신하다
7개의 답변
@아이3년 전 (편집됨)5세 무렵부터라든지… 아버지 있을 수 없다.기분 나쁘다…
493
회신하다
1 답변
@xxxhgfr16991년 전법률이 뭐라고 말했다는 아빠와 딸이 성행위를 하는 건 있을 수 없어. 보통 살아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이상한 일이니까 최저라도 20년, 최고로 사형으로 하는 것이 좋다! !
219
회신하다
@os-h83931년 전이런 법이 이상해‼왜 가해자에 대해 이렇게 달게 하는가⁉️⁉19세 이상이라도 몇 살이라도 중죄라고 생각합니다.‼️딸의, 분들의 기분을 생각하면… 끔찍한 일입니다.❗이 고백, 호소 동영상을 만날 수있어서 좋았습니다.‼️ 나도 실현에 서명하고 싶다.‼️
31
회신하다
@akuhataisannshiro3년 전나도 아버지로부터 성적인 일을 했을 때, 어머니에게 상담하면 「너의 탓이다」라고, 심한 것을 말해졌습니다. 평생 부모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몸이니까 결국 부모님의 힘에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아버지를 용서해야 하는 자신의 운명이 싫다. 본심은 용서하고 싶은 정도로 원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 동영상을 보면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681
회신하다
18개의 답변
@u._.u153년 전참의원 영상의 아저씨들이 흥미 없을 듯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정말 무섭다.
346
회신하다
1 답변
@ 팥3년 전아버지는 이제 입에 넣고 싶지 않은 최저의 인간이지만, 어머니의 「울고 사과했기 때문에 나는 용서했다」라고 말에 절구했다. 피해자는 너의 아이야? 더러운 반토가 나온다.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않는 최저 부모들.
284
회신하다
@연어스킨롤-fv4ix3년 전 (편집됨)이 사람은 강하다. 실명으로 보도되는 일, 가족을 적에게 돌리는 일, 실제로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괴로운 과거를 전해 가는 용기. 자, 감사합니다. 부디, 실생활 레벨로 관계가 있는 사람은 상냥하게 그녀를 지켜 주셨으면 한다.
224
회신하다
1 답변
@waya59041년 전과거에 뚜껑을 하고 싶은 정도의 기분일까… 입니다.
55
회신하다
@가쿠란세라3년 전이성보다 욕망이 이기고… 인간이 아니다
557
회신하다
@IM-bp8so3년 전 (편집됨)용기가 있는 여성들 열심히. 성범죄자는 사회의 적이네.
232
회신하다
2개의 답변
@ 젊음의 모택동3년 전부모님이야.
465
회신하다
@_chiffy22302년 전 (편집됨)아니 기다리고 아버지, 굉장히 이웃에서 놀랐다, ,, 가까이에 이런 사람이 있는거야? 무리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가슴이 아프다.
89
회신하다
@yuki-jz3mt11개월 전열매의 딸에게 5세부터 수년간 수출하고 있던 남편을 용서했다고 말하고 아직도 동반하고 있는 어머니도 상당히 야바 이와 이 세대의 전업 주부는 정말 약하다
127
회신하다
1 답변
@마샤-j5k3년 전유카리 씨에게는 절대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292
회신하다
@YT-lx8pf3년 전성적 학대는 가장 죄를 짓고 싶다.‼️‼️
62
회신하다
@ 나노하나 -y7e3년 전목소리를 높이고 사회에 문제 제기하는 그녀들의 용기와 결의와 인내에 감사. 부모로부터의 성 학대라는 무서운 범죄를 사회에 인지시킨 그녀들은 영웅입니다.
454
회신하다
1 답변
@하스웰21512년 전가족이고 딸을 성적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다.
142
회신하다
1 답변
ㅎㅎㅎ1년 전동영상의 끝까지 보고 메스꺼워 왔다 용기 있는 미야모토씨의 고백에 구원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아니.
28
회신하다
@ema77473년 전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하는 느낌이 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
346
회신하다
@hn-ye9ue3년 전 (편집됨)18세 이상이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나는 8세에 처녀상실 19세에 어머니가 죽은 뒤에 임신당해 낙태했어. 나의 경우, 지금의 법률이라도 되지 않습니다.
117
회신하다
3개의 답변
@타케우치-i3k3년 전아버지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 형에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기억합니다.
396
회신하다
2개의 답변
@반짝반짝 히카루-g3c1년 전더 이상 거세도 해주지 않으면 무리.
37
회신하다
@poko12moko51년 전'자신의 애정 표현이 잘못됐다'는 아버지의 편지에 조심했습니다.
37
회신하다
@yn50433년 전딸이 아버지를 받아들일 리가 없다.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생각해도 이상하다.
165
회신하다
@kanatokawakawa3년 전자신의 딸에게 성적 행위하고 있는 것이 우선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연령의 나이라든지가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손을 내놓는 것이 더욱 이상...윤리관도 아무것도 없다.
123
회신하다
@koma79823년 전나도 보육원의 무렵부터, 부모의 아는 사람에게 성적 학대되어 왔습니다.부모가 없을 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나쁨과 분노가 쏟아집니다. 장을 찾는 「뭐가 된거야! 지금은 절대로 나와 같은 생각을 시키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70
회신하다
2개의 답변
@his25258개월 전여기에 나오는 가해자는 죄의 의식이 거의 없어 미치고 있고, 일본의 법률도 미치고 있다.
8
회신하다
@슈카이2개월 전딸이 「동의」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일본의 법률은 미치고 있다.
7
회신하다
@ 따뜻한 공을 너무 사랑하는 남자3년 전가해자가 무슨 말을 하고, 인권은 뭐라고 말하고 싶은 곳이지만, 이런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안되겠지요… 거세할 수밖에 없다
677
회신하다
4개의 답변
@곰곰-c3i3년 전성범죄자에게는 GPS를!일본은 성범죄자에게 너무 친해진다.
71
회신하다
@유스케198409233년 전일본은 피해 여성이 목소리를 올리면, 배싱되는 세계적으로도 이상한 나라. 가면 좋네요.
329
회신하다
4개의 답변
@리릭30675개월 전너무 용서해서 손이 떨리는 피해자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12
회신하다
@메다코-n1m3년 전비열한 아버지‥아니 아버지라고는 부를 수 없는 그리고 어머니의 믿을 수 없는 언동 유카리씨의 용기가 많은 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분들의 도표가 됩니다
240
회신하다
1 답변
@toripppppppppppppppyyyy3년 전 (편집됨)해외의 계발 CM에서 '성피해자의 트라우마는 죽을 때까지'라는 의미를 포함한 몸 위를 뱀이 기어가는 CM이 있었다.
385
회신하다
1 답변
@mashatomi7343년 전일본은 정말 가해자에게 친절한 나라입니다.
105
회신하다
@카카오베리즈41283년 전왜 아버지일까… 어머니도 복잡한 감정에 갈등했다고 생각하지만, 역시 이 분의 유일한 아군이 되어야 했다.
431
회신하다
1 답변
@퇴마구미3년 전우리 아버지도 왠지 언니가 목욕을 할 때 잠깐 문을 열고 몸을 보려고 정말 기색이 나빴다.
32
회신하다
@mm-px6np1년 전아들에게 손을 내는 장인은 아직도 가끔 듣지만, 열매의 아버지는 정말 위험하다.
44
회신하다
@yishaxiangqi40843년 전볼수록 볼수록 끓인다… 동의하신가? 딸에게 욕정하는 아버지는 얼마나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97
회신하다
@user-gr5gm6pm4d3년 전지금도 꿈에 나오는 거야. 정말 힘들어.
123
회신하다
@카오곤-n7z3년 전진짜 딸에게 동의가 있거나 없거나 이전의 문제입니다.💢💢
악마‼️‼️
154
회신하다
3개의 답변
@리틀미23011년 전최저, 최악의 부모
40
회신하다
@Nyanko-x5n1년 전우선은 피해자가 망설이지 않고 목소리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정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군요.
52
회신하다
@ 고양이 산 냥3년 전진지하게 거세제도라도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한다
123
회신하다
@sake_ume3년 전 (편집됨)기분 나쁘다는 감정밖에 나오지 않는다 화해 따위 할 수 없고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다!
307
회신하다
ㅎㅎㅎㅎ3년 전실명을 올리고 목소리를 내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앞으로의 행복을 바라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어린 시절부터 쭉 계속 참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가해자에게는 무거운 무거운 벌칙이 필요하다💢
96
회신하다
@Hduxhahhagdhd1년 전아버지가 아이에게 손을 내밀다니 정말 기분이 나쁘다.🤮
38
회신하다
@riralira9개월 전성범죄는 재범률이 높다.
7
회신하다
@akko44883년 전같은 여성으로서 매우 용기 있는 행동, 존경하겠습니다.
417
회신하다
1 답변
@MimumiS3년 전성폭력의 가해자는 진지하게 동의의 위였다고 착각하고 있다….
105
회신하다
1 답변
🌸리리 -l8d3년 전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붙어 있습니다.
308
회신하다
@XzRq0P2Q21년 전「옛날부터 거짓말 밖에 말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진짜 것처럼 말한다」 아동성 학대자는 그렇네요 표의 얼굴이 좋기 때문에 모두 속는 것입니다 설마 그런 일을 할 리 없다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21
회신하다
@my67919개월 전가해자에게 인권이야.
22
회신하다
@안-pc3tk3년 전인살과 아무리 변하지 않아 몇 번이나 마음을 죽였어요 나도 딸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마음으로서는 피해를 당한 분을 꽉 안아주고 싶어졌다 (아직 아직 이 분들에 비하면 젊음 (사람이지만)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5
회신하다
@pipichan228님3년 전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명으로 자신을 털어놓는 용기… 매우 존경합니다.
219
회신하다
1 답변
@초마루67223년 전저도 초등학교 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트라우마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386
회신하다
1 답변
@misayauchi97431년 전자신의 체험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0
회신하다
@marssheep55831년 전 (수정됨)남자의 사람은 여성을 자신의 장난감이라고 하는지 위로라고 하는지, 어쩐지 이용할 수 있어 당연한 것 같아서 그것이 무섭다. 있다 무섭다. 이 동영상의 여성들은 정말 용기가 있다.
93
회신하다
1 답변
아오이-i5q3년 전아카네 씨의 엄마는 제대로 경찰에. 그래도 가벼운 죄만으로. 정말 용서할 수 없네요.
99
회신하다
@fumin-t4y3년 전종자매나 여동생의 가족 보고 있으면 2~3세의 열매의 딸의 가슴을 아버지가 비비고 있었다. 나쁜 장난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있던 남자 친구도 여자 아이에게 몸을 닿게 ~라고 말하고 기분 나빴다. 어머니는 보지 못한 척했지만 나는 그 모습을 보았고 피가 느껴졌다.💦어린 아이가 무엇을하고 있는지 모르게 캣캬하고 즐겼습니다.🤨나쁜 장난이라도 딸에게 그런 일을하는 것은 내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104
회신하다
3개의 답변
@가늘고 싶다3년 전입으로 하는 것도, 문자로 하는 것도 싫을 것에 괴로울 것이다에.
60
회신하다
@러브09핑크7개월 전왜 피해자에 대해 "17세라면 도망칠 수 없겠지만 18세라면 도망갈 수 있다"는 판단이 된다. . 배고프다.
6
회신하다
@심차미코-f9q3개월 전이런 아버지와 어머니로 정말 끔찍한 눈을 만났습니다.
5
회신하다
@라벤더-라벤더3년 전아버지에게 모자이크는 필요 없어!아버지와 딸이라든지 고대 이집트인이야!
386
회신하다
1 답변
@마루폰-d6z3년 전아버지도 어머니도 최저다.
53
회신하다
@쿠린 아이스-e7b3년 전왜 내 아이에게 손을 내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89
회신하다
ㅎㅎㅎ1년 전끔찍하다.
31
회신하다
@genseki03013년 전부모님 어느 쪽도 야베…
35
회신하다
@아리아나-sn1xp3년 전 (편집됨)나도 아버지에게 성학을 받은 사람입니다.중학부터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196
회신하다
4개의 답변
@벚꽃 눈보라-c1v3년 전18세의 나이에 갇히지 않고 처벌해 주었으면 합니다.
123
회신하다
@ 원더풀 스몰3년 전듣고 있는 것만으로, 와우가 된다. 무리 정말.
107
회신하다
@와카나 진리 y2년 전이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사람이 절대적입니다!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180
회신하다
1 답변
🌸1년 전목소리를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아버지와 동생으로부터의 성 피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 신내로부터의 성 피해에의 인지가 조금이라도 세상에 퍼지는 것은, 적어도 것 구원이 됩니다.
15
회신하다
@후쿠토끼-p3u3년 전성폭력은 생명을 빼앗기지 않은 것만으로 몸을 더럽혀 마음을 죽이고 희망조차 빼앗긴다
92
회신하다
@아이리스-uq4cd3년 전이 분은 이렇게 분명히 공표하고 있는 용기가 있는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눈물이 나왔습니다.
58
회신하다
@우뇌경찰-i9o3년 전실명?너무 멋지다.
356
회신하다
2개의 답변
@maSdoM_채널2년 전친부모로부터 성가해를 받은 시점에서 평생 외상이 되기 때문에 저항·무저항에 관계없이 범죄로 하면 되는데
32
회신하다
@ 미하 -w2v1년 전전혀 반성하지 않은 아버지 그것과 계속 함께 있을 수 있는 어머니 어느 쪽도 미치고 있다
17
회신하다
@무기짱-g4n3년 전같은 지역입니다. 조금 가슴이 아파요 유카리 씨 ... 마음의 상처를 치유 할 수 있습니다.
45
회신하다
@yyysuz32533년 전아니, 연령에 관계없이 친자에게 성행하거나 극형에 걸리는 비열한 행위 야 즉시 거세해야한다
174
회신하다
@-윙스-82673년 전너무 충격해서 말이 나오지 않는, 이런 아버지도 있다고 생각하면 세계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다시 생각했다.
53
회신하다
@rieminemoto52911년 전보통으로 생각해, 아버지가 딸을 이런 눈에 맞춘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32
회신하다
@ 이와무라 민지5개월 전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정말 분노를 느끼고 기분이 좋지 않아 피해자의 딸의 심정을 생각하면 정말 용서할 수 없다.
6
회신하다
@토미53103년 전딸을 그런 눈으로 보는 것 자체, 이미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을 말하는 등 논외.
67
회신하다
@투카노미3년 전나도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유치원 정도에 나를 맡고 있는 보육원의 원장의 아들에게 몇번이나 성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친아버지에서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네요... 작은 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
54
회신하다
@안녕하세요-j6h3년 전가장자리가 좋다.
325
회신하다
@miiakiiharuu17601년 전아직 성을 모르는 딸에게 손을 내밀고, 동의상이었다든가 잘 말할 수 있었구나! 자신의 아이에게 손을 내다니 기분 나쁘다! 어머니도 이상한 피해를 입고 상처 입은 아이는 평생 외상으로 고생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가해자도 감옥에서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 사회 복귀는 필요 없다
28
회신하다
@아헤헤헤아헤3년 전"딸"이 성행위에 저항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위험한 딸이다.
21
회신하다
@user-pv6ky9jh6v3년 전 (편집됨)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호소할 수 있는 분들은 굉장하다고 생각한다. 의?」라고 말하면 「모두 하고 있는 일이야」라고 화났다. 자신의 감정을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럼 전혀 다른 선인의 척한 악인. 이런 인간을 가까이서 봐, 정말로 누구도 신용할 수 없게 되었다.어른이 된 지금도.
50
회신하다
@소금 다시마-t4o3년 전 (편집됨)지금 20세를 넘고 있습니다.초등학교 시절 사이좋게 하고 있던 옆집의 소녀가 아버지로부터 성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해 준 느낌이었습니다만, 고등학교에 오르는 무렵부터 소원이 되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어리면서 굉장히 생각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문득 기억해 버렸습니다.
81
회신하다
@雷风-o2x3년 전동성의 재판관 필수적인 느낌이 든다.
79
회신하다
2개의 답변
@negai_82개월 전왜 아버지에게 모자이크를 걸고 있니?
6
회신하다
ㅎㅎㅎ1년 전이렇게 인간이 살아 있다니 용서할 수 없어
24
회신하다
@ 야후 옥스토어 YS 무역 채널3년 전굉장한 용기가있는 고백이야,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의 힘이되도록
161
회신하다
1 답변
@우라시마타로-g9i3년 전아버지 이상한 어머니 더 이상한 어머니라면 뭐든지 딸을 지킬 것이다 나라면 즉이혼하는 함께 살 수 없다. 성 학대는 범죄 일 것입니다. 그런 부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02
회신하다
1 답변
@레몬-m5l3년 전훌륭한 강간이니까 재판해야 할 본인이 다쳤다고 말하고 있어 아무것도 지식이 없는 아이가 멈추어서는 말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합의 위나 장난치지 말아라.
111
회신하다
@ 미요코9개월 전나도 어머니에게는 말할 수 없었다.
5
회신하다
@nasus37261년 전아버지 기분 너무..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나 절망은 헤아릴 수 없네요..
19
회신하다
🍑파고3년 전절반 자신의 유전자이지만 잘 흥분하지 마라.
654
회신하다
5개의 답변
@at882013년 전매우 용기가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카리 씨가 나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당당히 살아 좋다.
164
회신하다
1 답변
@포요니온3년 전인권😂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동의 위에라든지가 아니라 세뇌일 것입니다!
194
회신하다
@mmmgjmj1년 전나는 동성이었습니다.실의 언니에게 유치원의 무렵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없고, 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혐오라든지 공포라든지 그런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혼돈과 복잡한, 정말 말할 수 없는 기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7
회신하다
@미시 시피 2호1년 전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다! 라고 했던 순간에는?
13
회신하다
@맥빅-h5e3년 전아버지가 어떻게 살아 왔는지 알고 싶다.
84
회신하다
@nameno37823년 전가정내성 학대. 하지만 주위와는 다르게 행위였다는 것을 알고 15세 근처부터, 자신은 더러운 인간이라면 자포자기가 되었습니다. 17세 때 어머니에게 털어놨더니 괴로웠다고 말해준 것의 형은, 지방공무원이 되어 부인 조카가 태어나 가정이 있기 때문에 겉보기에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해졌습니다. 감으로 밖에 없었다. 그런 나의 모든 사랑해 주는 사람을 만나, 남편과 결혼했지만 30세로 죽었다. 내가 뭘 위해 태어났는지 몰라서
130
회신하다
1 답변
@Kurmanyon3년 전유카리씨가 발신해 주면, 같은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이 구원됩니다.앞으로의 유카리씨에게 다행히.
121
회신하다
1 답변
@XzRq0P2Q28개월 전부모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5
회신하다
@ 사와와 사와1년 전가해자에게도 인권은 있다.
20
회신하다
@포크앤파3년 전일본은 성범죄에 달콤하네요. 남자 존녀비의 잔잔함을 가진 채 법률이나 사고가 뿌리깊게 남아 있기 때문에 성범죄에 있어도 여성이 나쁘다든가 동의 위라든지. 이야기.
41
회신하다
@세일러 새턴-m5r3년 전성적 학대, 어머니가 아군하지 않는 것은 많다. 나도 용기를 내고 울면서 상담했지만 "아직 동생들이 작기 때문에 이혼은 할 수 없다. 생활이 걸려 있다. 너가 자력으로 나가라"고. 전업 주부로 아버지의 수입에 의지.
40
회신하다
@ayano81823년 전 (편집됨)최악😡피해자는 딸이야.😡부모가 정당화 되더라도😡가정이라는 환경에서 도망칠 수 없는 나이의 아이를 저항하지 않았던 것을 좋은 일에 상처😡죄를 보상해라.😡최소입니다.😡
103
회신하다
1 답변
@user-lv3dq5hs6e1년 전성범죄는 가장 용서할 수 없다. 저지른 인간에게는 사형 또는 거세를.
20
회신하다
@ttl11953년 전나는 어머니가 2회째에 결혼한 사람의 아들에게 성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오고 싶습니다.
26
회신하다
1 답변
@ 고양이 사무라이 -j8e3년 전재판관을 파면해.
47
회신하다
@티코14813년 전 (편집됨)피가 이어진 자신의 아이겠지?
267
회신하다
4개의 답변
@xzaza21983년 전당시의 사진, 딸에게 딱 몸에 붙어 기분 나쁜 아버지구나…
242
회신하다
11개의 답변
@루나틱-y1l9개월 전어째서 성피해는 가볍게 볼 수 있을까. 조금 어렵다. 적어도 가족에게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 가족이 가해자인데다, 다른 가족도 아군이 되어 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을지 모르게 된다.
4
회신하다
@user-br9vw4lj9o6개월 전아버지라고 생각할 필요없는 이런 인간. 어머니도 같은 죄.
14
회신하다
@KentaNakamori3년 전대단한 독 부모. 붙이는 약 없음.
182
회신하다
@ay_yo99823년 전왜 피해자는 얼굴을 내는데 가해자의 프라이버시는 지킬 수 있을까?
48
회신하다
@ 일등석 세계 일주3년 전지금의 유카리씨의 행복한 미소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아직도 힘든 일은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꼭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세요.
89
회신하다
1 답변
@Pin-p6f1년 전 (수정됨)초등학생 때 한 번만 사촌에게 손을 내밀게 된 적이 있다. 그 이후 26세가 된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만나면 서투른 의식이 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상상도 못한다.
20
회신하다
1 답변
@ 21 세기 발자국1년 전아버지에게 성버릇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이상자가 아버지가 되어 있는 부조리.
60
회신하다
@치호린-i2j3년 전친구가 작을 때 친형에게 장난을 당했다는 것을 상기했습니다. 어머니는 보지 못한 척 친형이 약혼자를 집에 데려왔을 때 자신에게 슬픈 기억을 남겼는데 친형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행복한 결혼에 억울한 분노로 가득했다고도 말했다 했습니다. 놀이에 잘 집에 갔고 가족의 얼굴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시끄럽지 않은 시대에 18세 정도의 때에 들었으므로 충격이었습니다.
176
회신하다
2개의 답변
@칼파뇨 1세3년 전나도 가족으로부터 받고 있어 지금도 괴로워진다.
26
회신하다
@릴리-xt9hn3년 전부모에게 강요되어 어머니에게도 말하기 어려울 것이고, 무서워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용기가 없어. 을 갖게 되거나 한다.
82
회신하다
@ah83405개월 전왜 아버지를 방문할 때 여성 기자를 향하게 할까?
12
회신하다
@haru-pg3uj1년 전정말 용서할 수 없다. 자신도 닮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괴로웠을 때의 감정을 생각해냈다. 절대 유사한 일이 일어나고 싶지 않다.
7
회신하다
@ Chibi Maruko Dao3년 전부모 끔찍한
125
회신하다
@마쇼.3년 전지식이 없는 아이를 속이거나 말하는 등 약자를 노리는 더러운 어른의 끝의 예입니다. 어려우면, 항상 공적인 감시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
회신하다
1 답변
@momo123893년 전나는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방에 불려,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의 사이를 부수고 싶지 않아,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에게 상담할 수 있었던 것은, 8개세 떨어진 나의 언니가 “할아버지에게 성적 학대를 하고 있다”라고 어머니에게 상담하고 있는 곳을 보았을 때입니다. 탓에 결버증과 마음의 병을 발병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만나지 않는 절연하면 화나 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디서나 있는 할아버지. 그러니까 외출이 좋기 때문에, 말해도 믿어 주지 않는 것이 아닌가, 아이의 허언이라고 흘러가는 것이 아닌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상담수는, 약 16만건인 것 같네요.이것 정말로 빙산의 일각의 수에 지나지 않아요. 내 집처럼 가족 사이에서 끝나는 집도 있고, 아직 누구에게도 상담할 수 없는 아이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겨주세요. 만약 당신이 부모로 이런 일을 아이에게 상담되면, 이야기를 흘리지 않고 믿고 진지하게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27
회신하다
1 답변
@mikuruyume1년 전 (수정됨)이제 정말 평생 사라지지 않는 상처를 새긴 사람은 그 생명으로 보상해주었으면 하는 해리는 진짜로 힘들다
15
회신하다
@a_3001년 전유카리씨의 강한 의지에 존경합니다.매우 괴로운 입장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황의 분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전해졌습니다. 심신 모두 참기 힘든 고통을 맛보게 되는 학대 행위입니다.
23
회신하다
@吉田路子-l2u3년 전절대 용서 할 수 없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55
회신하다
@여기짱-d3w3년 전남자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괴로웠네요.
133
회신하다
1 답변
@th93413년 전그냥 그녀를 안고 싶어요. 그녀는 정말 강하고 존경해요. 그녀의 부모님은 감옥에 가야 해요.
222
회신하다
@화이트-n9f5개월 전저는 중학교 때 목욕을 할 때나 탈의실에 있을 때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입욕중에 친구로부터 전화가 있어(가전) 아버지가 받아 나에게 연결하기 위해 입욕중의 문을 열 것 같게 되었기 때문에 열지 말고! 열렸습니다. 나쁘고 어머니에게 상담했으면 좋겠어요. 느낌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7
회신하다
@체리블로섬-gc7qi8개월 전가슴 똥 나쁜 이마지 일정 수의 이런 아버지
13
회신하다
@ 튀김 사랑 - f9h3년 전이 전의 엄마 친구 세뇌의 뉴스 버진(분) 이미, 유카리 씨.
52
회신하다
ㅎㅎㅎ3년 전성 학대는 조류와 한기가 난다. 사람으로서 기분이 나쁘다. 재판도 무죄에서 유죄로 바뀐다고 죄를 너무 경시해 유감이다. 한편 데모를 주최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은 매우 훌륭하다. 나도 자신의 아이나 사람을 지킬 수 있는 행동을 취하고 싶다.
32
회신하다
@kodomozet3년 전일본은 정말 남자에게 달콤합니다.
26
회신하다
@WSXQAZ-w9r1달 전진짜 아버지조차 이것이니까, 계부는 위험한 이미지밖에 없다. 그래서 딸을 데리고 재혼은 절대 안 된다.
3
회신하다
@테라플레어-j3o1년 전가해자에게도 인권 있다?아니~ 주고 싶지 않아.
22
회신하다
@미야모토 아카네-r4l3년 전야바리, 남성에게는 아무래도 "극형"이 1개 부족한 생각이 듭니다.✂️요‼️ "라고 형을 만들지 않으면‼️
320
회신하다
14개의 답변
@emi05943년 전성 피해가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보고할 수 있는 세상에 있어 주었으면 한다. 나쁜 것은 절대로 가해자.
38
회신하다
1 답변
@emi05943년 전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얕은 것은?
36
회신하다
@CHACHA-iy9hp1년 전최선을 다하십시오. 마음을 구하는 강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21
회신하다
@스즈키 카즈미-p5g2년 전나에게도 딸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소중한 존재의 딸입니다.‼️‼️ 절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아버지는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 아이는 부모를 똑바로 눈, 마음으로 신용 신뢰 절대적인 애정으로 자신을 지켜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아이에게 그 싸움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슬픈 일은 없다‼️ 여러분, 정말 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2
회신하다
@dassiemeeling14293년 전 (편집됨)장장 타카코님, 그 외, 스탭 여러분, 엄격한 보도에 맞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생각합니다.어쨌든 일본 사회를 강하게 하고 싶다.
95
회신하다
1 답변
@아카사타나하마야라와-c3n3년 전나도 형에게 성 학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나는 정신을 단련하고 형을 울퉁불퉁하게 만든 덕분에 형은 성 학대를 그만두었습니다
20
회신하다
@__-jn1nj3년 전 (편집됨)코멘트란도 꽤 기분 나쁘다… 어머니도 공범
53
회신하다
@mnmn-dr1be6개월 전피해자가 용기를 가지고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인 아버지의 얼굴을 노출해 주었으면 한다.
8
회신하다
@Guguru-h3e1년 전우선 사진의 아버지와 딸의 거리감이 이상하네요.
10
회신하다
@kiki-hq7uw3년 전일본은 정말 가해자에게 달콤한 이유입니다.
45
회신하다
@리어짱-j5b3년 전우리 여동생이 성 학대를 삼촌으로부터 받고 있던 것을 10년 전 나에게 털어 줬습니다. 삼촌 부부, 아니, 악축 부부는 지금도 사이좋게 해 준다.
78
회신하다
@ 맛있는 레스토랑3년 전어머니의 재혼 상대의 남자로부터 성적 폭행을 띄우는 경우 많네요.피해자가 너무 귀엽습니다.
74
회신하다
1 답변
@시무-e3z1년 전엄마의 「아버지를 용서해 줘서 3명이서 살자」라는 말에 절구…
11
회신하다
@erika58093년 전엄마는 '어머니'로 남편을 사랑하는 '여자'를 취했습니다.
24
회신하다
1 답변
@나초스0v0나미3년 전징역 5000년으로 해 주었으면 한다.
62
회신하다
@토우후-p1e3년 전벌을 받기 위한 법률인데 법률 때문에 벌을 받게 할 수 없게 되어 버리는 것은 이상하네요…
56
회신하다
@kato-ni6rc3년 전 (편집됨)역시 해리되어 학대당하면 오겠다… 39세입니다만 DV되어 자랐습니다.거울을 보면 자신이 그릇 안에 진짜 자신이 있는 느낌… 나는 불합리한 폭력을 받아 자랐지만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살아온 사람이 열심히 생각하면 눈물이 넘쳐 멈추지 않습니다.
51
회신하다
@스누피.스누피4개월 전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줘! 어머니는 도대체 뭐하고 있었어?
10
회신하다
@yfuji59621년 전인간의 척한 악마.
13
회신하다
@yamayama60503년 전어째서 마음대로 엄마가 용서해 버려, 무엇보다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부모만인데 하고 있는 것을 알고 부부 계속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어쩐지 결정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성인 여성이 남성에 저항해도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66
회신하다
@ 계란 쌀 - w9m3년 전자녀가 부모를 의심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종교에서도 그렇지만 부모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믿고 그에 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34
회신하다
@로코타마마3년 전본래라면 친족을 공개 처벌하는 행위 등 아무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경험을 극복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37
회신하다
@Rima-v7p1년 전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런 어린 상대에게 동의상입니다!
12
회신하다
@유순2년 전굉장히 힘들었지요. 플래시백 하지요. 저는 최종 행위는 없었지만, 초등학생의 무렵에 진짜 아버지에게 가슴이나 저기의 사진을 찍히거나, 손가락을 넣어지고 있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성 학대였습니다. 싫어하거나 반항하면 폭언 폭력을 흔들리고, 신고하면 역망으로 무엇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다행히 부모님은 옛날부터 사이가 나쁘고, 내가 고등학생 때 이혼해 주었기 때문에 인연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만, 어딘가에서 확실히 만나 버리면 어쩐지 감금될 것인지는 아닐까라고 잠시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18
회신하다
@ 거기 아 찬3년 전가해자에게 인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8
회신하다
@kazuyachan43593년 전보건 체육 수업이 있어서 좋았다.
240
회신하다
3개의 답변
@ 위험 감지3년 전당시 사진의 표정이 참을 수 없다.
68
회신하다
@요코98051년 전저는 11세 때 10세 연상의 삼촌에 빠졌습니다. 스트레스 어택이나 플래시백이 있어 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죽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캔슬링은,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으므로 영어로 받았습니다.
10
회신하다
@레이84302년 전몇 살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아버지가 딸과 성교하는 것은 죄입니다. 의 사람을 지키고 싶다.마음의 상처는 2번으로 수복할 수 없습니다.
16
회신하다
@tinoachan13년 전엄마도 폭력을 받았기 때문에 딸에게 가는 시간은 자신 안전 이론의 전형적인 녀석
38
회신하다
@ 로하스3년 전유카리 씨, 대단한 사람이야 ... 잘 말할 수있어 ... 열심히 했어요 ...😢
64
회신하다
@user-fr3ze2tq3z3년 전유카리씨에게 앞으로의 인생 1개라도 많은 행복이 많이 방문하겠습니다.
70
회신하다
1 답변
@토끼-e3c1년 전첫 번째 어머니의 변명이 굉장하다.
13
회신하다
@SkibidiSigmaRizzOhioChillGuy3년 전이런 쓰레기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 살아가는 것은 힘들군요…
50
회신하다
@van30473년 전이건 그냥 한 줌이야, 세계 규모로 보면 억 단위가 아닌가?
46
회신하다
🍑🏻♀️3년 전유카리 씨와 아카네 씨의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다 ... 부모로서 실격이야 ...
45
회신하다
@ 복숭아 나무 - j9j3년 전얼마나 강한 사람일까.
62
회신하다
@miorin52211년 전 (수정됨)벌써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성 피해는 좀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닙니다만, 쓸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싫은 일입니다.🙏
4
회신하다
@사다빅터41872년 전어, 나이에 무죄가 될지, 감형이 될지 어떨지 정해지는 가해자에게도 돈 당기지만, 일본의 사법 제도에도 엄청 끌려
21
회신하다
@노자키 미카3년 전딸을 학대되어 침묵하는 어머니 더 이상 여자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다!
53
회신하다
@SanaBaby-uo2pj3년 전용기 있는 고발에 머리가 내려갑니다 아버지가 가해자이니까 이중의 죄군요 지금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는 당신!
36
회신하다
@ 아프로 타테츠 남자3년 전진짜로 용서할 수 없다.
18
회신하다
@유키코 기무라-s9h5개월 전이런 사건을 알 때마다 어머니는 어머니와는 도대체 뭔지 가슴이 아파집니다😢😢😢
5
회신하다
@오츠카절-k7h3년 전가정내성 학대가 존재한다니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당연한!
47
회신하다
@英穷娜瑶子3년 전나.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유카리씨의 힘을 응원하고 있어.
59
회신하다
1 답변
@es53903년 전이 사람은 정말 용기가 있어 굉장하다! 그 부모에게 돌격해서 비난할지도 모른다.
15
회신하다
@satomif34323년 전야마모토씨도 그 밖의 사람도 정말로 강하게 살고 있다.
42
회신하다
1 답변
@YURIKATAKISHITA1년 전나도 같은 경험의 피해자입니다‥. 거부하면 폭력의 날이었습니다. ‥. 어머니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성폭력과 폭언에 날마다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7
회신하다
@mm-px6np1년 전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는 의미를 모른다. 부모와 자식이야?
9
회신하다
@takakowilliams34343년 전이런 상태일 때, 엄마 밖에 아군이 될 수 있는데, 그 엄마도 아버지에게 이 학대를 용서하고 있는, 어떤 사람인가?
21
회신하다
@user-mt9mw3yo7k3년 전나는 아버지의 형제(동생)에게 가슴을 만지거나 목욕을 하고 있는 곳도 도촬되었습니다. 아이지만 나도 이미 아이가있는 몸이므로 걱정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말해야 할까,,
28
회신하다
1 답변
@hs-lx7zh3년 전합의 위라든지, 원래 아이로 생각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위험하다. 이런 사람은 소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장래 이런 일을 할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나 할 것 같아서 무서워
39
회신하다
@elder_red_cup1년 전코멘트란을 읽으면 비슷한 피해를 받고 있는 분이 많아서 놀랍습니다. 에 달콤하고, 가해자 측을 제대로 심판하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적은 것이 슬프다.
7
회신하다
@jy257611개월 전일본은 어렸을 때 딸과 아버지가 함께 목욕한다고 생각하지만, 해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깜짝 놀랐다.
6
회신하다
@X0XO_O3년 전충격이 너무 크면 해리가 너무 많아서 개성이 많아. ...
17
회신하다
1 답변
@i-o1s3년 전정말 성학대 인간이 용서할 수 없다.
15
회신하다
@ 별 모래 돌고래3년 전지금까지는 성범죄의 벌이 너무 가벼웠다.
20
회신하다
🍑🏻♀️1년 전부탁하니까 성범죄, 성학대의 가해자는 사형으로 하거나 국부를 잡아줘.
6
회신하다
@maki122611년 전피해자의 얼굴을 숨겨주세요.
10
회신하다
@user-dh5iu9px7u1년 전적어도 어머니에게 아군이되어 주었으면 했어.
14
회신하다
@ayumi9341년 전아이를 지키는 부모님이 부모님도 부상당... 행복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24
회신하다
1 답변
@메리메리-u7q3년 전나도 유치원아에게서 있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 미워한 지금 개호 시설에 있는데 한번도 면회하지 않았다. 말할 수있는 용감하고 싶었어.
33
회신하다
@uscr-et5jnv22w6개월 전 (편집됨)어머니도 아버지도 최저.
6
회신하다
@이케다 모모 -z1l9개월 전이런 부모가 있구나! 정말 화가 난다!
4
회신하다
@말차 아이스-i5y1년 전우선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가해자에게도 인권? 없는 상처인데 법률의 개정이 필요.
21
회신하다
@유키미오후쿠-m6k3년 전아버지가 머리 이상한 것은 전제로서, 어머니는 아이에게 참으면, 자신은 그대로 지금까지 거리의 생활할 수 있다고, 보신에 달렸어
13
회신하다
@user-cc2tt5xc9i3년 전 (편집됨)나도 친아버지로부터 초등학생 때 성적 학대를 받고 있었다.함께 목욕에 들어갈 때. 배우기, 학습 학원에도 다니고 나름대로 투자되고 있었다. 피해를 받았을 때도 아버지는 언제나 온화했다. 을 풀어서 미안해.
15
회신하다
1 답변
@ 귤2년 전용서할 수 없네요. 몇 년이 지나도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48
회신하다
@세컨드러브__m1년 전8:55 아버지, 진심으로 동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동의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 완전 나쁜 자가 되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엎드려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8
회신하다
@miho32383년 전이 어머니도 이상!믿을 수 없다.이런 아버지와 이혼하지 않는다니, 머리가 이상하고 약하지 않은가.
23
회신하다
@마루완-c8c3년 전 (편집됨)0:12 “피해자들이 “드디어”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인가…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없었다 사고방식에서도) 잃어버린 20년이라든지 말해지고 있지만 되찾은 것도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버리는 보도였습니다
19
회신하다
@마리린-i5b3년 전일본의 법률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19
회신하다
@유키코 기무라-s9h5개월 전너무 슬프다 열매의 아이에게, 왜 이런 끔찍한 슬픈 일을 할 수 있는지, 이해에 괴롭습니다!지금의 법률을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 부디라고 생각해 봐 주세요😢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부모라고 해도 무거운 벌을 부탁합니다!😢자신이 같은 고통을 체험하지 않으면 이 고통은 절대로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3
회신하다
@onono-n2c6개월 전부모님도 느슨하지 않습니다.
10
회신하다
@호시 고등학교-t8v3년 전바로 아버지 실격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25
회신하다
@Mochimochi-j1u3년 전정말 이해할 수 없고 싶지 않다. 왜 내 아이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21
회신하다
@mamiyu52731년 전중학교 때 아버지에게 음부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심해진다고 생각합니다.우리 남편은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갈아 입을 볼 수 없거나 목욕에 함께 들어 가지 않거나
25
회신하다
1 답변
@시바판 로카5개월 전가슴똥‼︎ 이런 가해자들이야말로, 철저히 넷으로 노출하라!
4
회신하다
@user-my6hi8ph7q1년 전나의 어머니도 친아버지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학교까지, 쭉 성적 학대와, 제 어머니가 기절할 때까지 머리를 때리는 등의 잔혹한 폭력을 일상적으로 제 어머니는, 친부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어머니는 도와주지 않았고 머리가 나쁜 어머니였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친어머니에게 성적 학대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친아버지의 성적 학대 사실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타인사와 같은 반응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의 상처는 매우 깊습니다. 지금도 친아버지와 친모는 살아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동영상을 보여주고 싶다.
10
회신하다
@ 고양이 팬더 -o2n2년 전저도 6세부터 19세까지 성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어머니의 할아버지와 실모입니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21세이니까, 학대가 끝나고 2년 정도가 됩니다만 나날의 생활에 현실미가 수반하지 않고, 때때로 신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 같은 기묘한 감각에도 빠져 계속 악몽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코멘트란의 다른 서바이버 분의 말에 나만이 아니라고 용기 붙이는 것과 동시에, 여성으로부터 여성에의 성 피해에 대해서도, 어쨌든 다루어 주셨으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8
회신하다
3개의 답변
@이지 치마사보3년 전그녀에게 성 학대에 있는 것을 상담되어 처음에는 분노가 와 버렸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그녀는 6년 정도 성 학대를 받고 있어 가정이 망가져 버리는 공포로 털어놓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녀가 어머니에게 상담했을 때, 아버지와 화해로 해결한 것 같습니다. 성 학대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18
회신하다
2개의 답변
@ 조코와 -y3q3년 전용서.부모라고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
14
회신하다
@시노86005개월 전딸보다 남편을 망치는 건… 아직도 함께 있는 어머니도 동죄. 부모님도 없다. 부모가 아니라면 잘라도 좋다고 생각한다.
4
회신하다
@유코싱스와6개월 전무거워져 10년인가.가벼운구나… 타인으로부터의 피해에는 소리 지르는 토양에 조금은 다가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이니까, 거기를 어떻게 할까요… 정말로 어렵다.
4
회신하다
@01TTtt3년 전그래, 지식이 없으면 피해를 깨닫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빗 존의 교육 어릴 때부터하는 것이 중요하다
16
회신하다
어서3년 전나는 아버지는 아니지만 옆집의 아저씨로부터 5세부터 15세까지 성 피해에 받고 있었습니다.
13
회신하다
@yukoamam65183년 전있을 수 없다.유카리 씨의 일생을 돌려라!
28
회신하다
@ 야스코8개월 전가해자에게 인권이 없다.
9
회신하다
@모그모그38666개월 전18세라든지 상관없이, 부모와 자식 관계가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되는 것, 앞으로의 피해가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4
회신하다
@켄타-b7g3년 전힘들었어요~… 상상도 할 수 없어… 무려 무서운…
42
회신하다
@eringoeringo8533년 전이런 게 아버지라면 죽을 정도로 미워할 것이다. 엉덩이도 커져 신체 첨부가 바뀌어, 이윽고 배가 커져 아이가 태어나」라고 말해 왔다. 뭐라고 하는 거야?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라고 기억하고 싫은 기분이 된다. 나의 아버지는 거기까지 폭력적이지 않았던 것과, 나의 마음이 강한 성격이었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싫은 추억으로 끝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48
회신하다
1 답변
@유즈폰-z8s3년 전역시 이런 녀석은 아버지의 앞에 로리콘의 성버릇이 이겨 버리는 것일까…. 그래서 기분 나쁘다.
18
회신하다
1 답변
@galgs53951년 전머리 이상한 아버지, 기분 나쁘다. 옛날 한 번만, 어머니의 재혼 상대에게 속옷을 건드렸다고 하는 것이 아직도 머리로부터 떠나지 않았고, 저것은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 , 단지 어떤 기분이었을까 생각하면, 한 번의 일이라도 평생 기억에 남는다. 나는 대학생으로 아직 가족과 살고 있지만 집을 떠나면 살짝 거리를 두고 싶다.
11
회신하다
@Butabuta-c5f7개월 전보육원아의 무렵, 아버지와 함께 목욕에 들어가는 것이 많았습니다. 나에게 싫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감정에 뚜껑을 했습니다.
2
회신하다
@로세루카83522년 전무기 징역으로 좋을 것입니다.
17
회신하다
1 답변
@악마 소세키3년 전동의도 아무것도 진짜 딸과 했을 때 아칸
18
회신하다
🌸ㅜㅜ-u5c3년 전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가해자의 대사가 아닙니다.
19
회신하다
1 답변
@해피.C1년 전아버지나 형이 가해자로 어머니가 공범해서 케이스 많아.성학대로 유죄는 당연하지만 「아빠도 반성하고 있으니까」 「오빠의 욕을 말하지 않아」 .) 등이라고 망설인 어머니도 어떠한 죄에 묻히는 것 같았으면 좋겠다.
11
회신하다
@takako76811년 전혈연내성학대는 정당방위로 ○해도 좋다.사형으로 좋다고 생각한다.
10
회신하다
@tsubitan3년 전 (편집됨)미국과 비교하면 자동성 학대에 대한 법률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
13
회신하다
2개의 답변
@주피터13913년 전만일 만일 부모를 죽일 수밖에 없다.
46
회신하다
@미수시86203년 전공포 밖에 없다.
34
회신하다
ㅎㅎㅎ7개월 전😮나의 후배.중 3으로 진짜 아버지의 자매도 있어요.
4
회신하다
@gs13711년 전지인들에게 듣는 이야기에서도 친한 사이의 아이에게의 실수는 비교적 일어날 수 있지요, 그것도 피해자가 편견을 갖고 끝난다고 한다… 피해를 받은 사람이 이 활동을 하는 것은 정말로 괴로운 일 , 머리가 내려
5
회신하다
@kanamem83913년 전동의하에?
27
회신하다
@보놀론-f1c3년 전재혼한 아이 동반의 어머니는 전과가 있는 것을 몰랐습니까.
20
회신하다
@로즈-cy4kf3년 전이런 가정의 어머니는 동죄가 아닐까요, 하나 지붕 아래에 살면서, 눈치채지 않을 리는 없고, 딸씨의 고백에, 반대로 말을 포함하거나 하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재판장의 말) 있을 수 없다! 확실히, 재판장의 자격이 있는 것인가!사람에 의해 겨우 겠지만 언제나 생각하는, 일본의 법률은 가해자를 위해서 존재할까라고!
15
회신하다
@allure7671년 전 (수정됨)이 아버지, 딸이 죽여도 불평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하지 않은 딸 덕분에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8
회신하다
@lynn44422년 전나는 아버지 폭력을 겪었을 때가 있었고,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더 무서워 졌지만,이 비디오를보고 무언가가 있다면 절대 경찰에게 말할 용기가 나왔다. . 감사합니다.😭
12
회신하다
@planetearth30743년 전절대 용서할 수 없는 아버지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있어, 이 녀석은.
44
회신하다
@오텀플라워-z5y3년 전이런 일이 일어나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 수 없다.
23
회신하다
@tellme17863년 전나는 형이되었습니다. 4세 정도부터 10세경까지. 형도 나도 대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형은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잊을 수 없다. 공포.
20
회신하다
2개의 답변
@mochiko-j8d1년 전나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서였다. 성인한 아이 3명 있습니다만, 그 탓인지 성행위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50대 후반이지만 몇 년이 지나도 기분이 나
8
회신하다
@bybybywater74019개월 전형을 더 무겁게 하고, 일본은 너무 달아요!
5
회신하다
@마츠바라 케이코-c6m3년 전어디까지나 남자 사회의 법률 그대로야.‼️
18
회신하다
@ 쓰레드3년 전혈연자를 그렇게 말하는 눈으로 보는 것은 아프다.
15
회신하다
1 답변
@포치네3년 전아카네씨의 아버지 재범으로 징역 10년은 짧지 않나? 의 부모로부터의 폭력에 대한 형기가 짧은 것이 납득할 수 없다!
21
회신하다
@ 익명 - w8p3년 전저도 열매의 오빠부터 보육원~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성적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오빠가 뒤에 누워 계속 가랑이를 꽉 쥐고있었습니다. 나의 아래쪽에도 손을 뻗어 기분 좋지 않은데 기분 좋은 척 하고 빨리 끝나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말할 수 없고, 친구에게도, 남편에게도 말한 적은 없습니다. 같은 생각을 한 분이 상담할 수 있는 구조가 앞으로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7
회신하다
@toko28311년 전나이는 관계없이 아버지로부터 성 학대를 받으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6
회신하다
@아이디쉬맨3년 전유카리 씨, 재혼하지 않는 것은 방위 때문일까.
52
회신하다
🌸스윔-p7k3년 전성범죄만큼 최저는 없고, 죽을 때까지 피해자는 평생 고생한다. 피해를 호소하기에도 경찰,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친족·잘못하면 친구에게도 알려져 버리는, 주위의 눈도 신경이 쓰이는, 남자친구·그녀 할 수 있으면? 결혼하면? 문득 순간에 플래시백할 것 같아 생각하면 생각할 만큼 용서할 수 없는 하락하고 본인에게 먹이게 하는 정도는 최소한으로 갖고 싶은 그것과 무슨 싫어 이렇게 말하는 성범죄를 고발하면 토치 광 놈이 동의했기 때문에 좋겠지, 치한이라면 노출하고 있는 쪽이 나쁘다고 범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놈이 적지 않게 있는 현실 그 이유가 확실히 지나면 살인도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은? 성범죄만 판결이 달콤하다
13
회신하다
쫄깃3년 전아버지도 그래도 오칸이 솔직히 위험하다
30
회신하다
2개의 답변
@PP-gq2fj6개월 전이렇게 필사적인 생각하지 않으면 법률도 변하지 않고, 게다가 바뀌어도 전혀 납득해 가는 것이 아니다.
3
회신하다
@Okome-SUN1년 전아이는 부모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끈끈한 애정 표현이다」라고 말하면 이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
7
회신하다
ㅎㅎㅎ3년 전친가 나가서 좋았다
16
회신하다
@ 나츠카와 카즈3년 전이것 생각하지만 남성에게도 있을 것인데… 여성보다 입에 할 수 없지…
29
회신하다
1 답변
@유리-g4o3년 전강한 여성입니다.
16
회신하다
@773agjmj52년 전 (편집됨)딸이 있습니다만, 나쁘지만, 남편은 그렇게 말하는 일을 할지도 모른다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업 주부가되지 않습니다.
9
회신하다
1 답변
@1950하나코5개월 전부모가 이런 일을 하면 믿을 수 없는 이런 부모는 말살할 수밖에 없는 거세하는 법은 할 수 없는 것일까
5
회신하다
@Happy-l8f3년 전변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14
회신하다
@fujibou.k69663년 전부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17
회신하다
@Suter77773년 전어머니의 사람도 웃음❗
31
회신하다
1 답변
@doraneko334개월 전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4
회신하다
@엘리-d3w1년 전이런 수컷에게는 매우 큰 벌을 주어야 한다.
9
회신하다
@레스.모모72년 전부모가 자신의 아이에게 성폭력은 생각할 수 없다. 사라지지 않는 커녕 떠오르는 날도 없을 정도로 잊을 날도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9
회신하다
@JWlm-1년 전성범죄 가해자는 유무를 말하지 않고 조금 자르고 GPS를 착용하십시오.
7
회신하다
@타타3년 전아버지에게는 굉장히 화가 나지만, 첫 번째 어머니도 화가 난다.
7
회신하다
@to34115개월 전나라면 바리바리 얼굴 내고 말할게.
5
회신하다
@유코-c6x4개월 전도쿄에서 운전자를 했을 때, 야근근무로 한밤중, 부모에게 성피해에 있던 아이를 쉘터까지 타고 가본 적이 있다.
3
회신하다
@민민85571년 전아버지가, 딸에게, 손을, 내다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더, 형을 무겁게 해야 하고, 상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
회신하다
@humikahumika4개월 전동성의 어머니까지도 아군을 해주지 않는다니..
5
회신하다
@llld61646일 전극형을 원할 정도로 용서 할 수 없다.
2
회신하다
@mimi-qk5yq3년 전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11
회신하다
1 답변
@우로 촌장2년 전나는 아버지와는 피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어머니의 동반자로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무서운 생각을 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겨우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어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종형제를 만날 때는 그런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내가 용서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통을 외상이없는 나를 돌려주길 바란다.
7
회신하다
@프레스-c2g2년 전성범죄자는 왜 거세시키지 않나?
12
회신하다
1 답변
@토피코크리스티나1년 전가족은, 무엇이겠지… 아이가 1번이 아니야? 인생 돌려주었으면 한다.
3
회신하다
@미키-kp9po3년 전실의 딸에 대해 성적 학대 할 수 있는 신경이 위험하고 기분 나쁜, 아이의 SOS에 지켜 주지 않는 어머니도 같다. 그렇게 되거나 제대로 연애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한다.
25
회신하다
@레인보우 푸딩3년 전아버지가 딸에게 성적인 감정이 되는, 보통이라면 있을 수 없다.그런 욕구가 되는 아버지는 손을 내밀기 전에 정신 병원에 가라! 그런 일을 한다니 1밀리도 생각하지 않아 했어. 그리고 용기를 내고 상담한 어머니에게까지 배신당해 얼마나 괴로웠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7
회신하다
@papillonparico1년 전힘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 여성들에게 경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지 아시아)의 법률은 늦어지고 있다. 한 풍습.
4
회신하다
@토모에184일 전일본의 법원 이상하다,, 자신이 그 입장이 되면 어떻게 생각한다,,
1
회신하다
@하라페코-k9n2년 전피해자는 마음을 죽인 것 같기 때문에 성폭력한 놈은 모두 사형으로 좋다. 정말 용서할 수 없다.
9
회신하다
@파이어7442개월 전3:55 부터 아버지의 발언이 의미를 모른다.
6
회신하다
@user-lq9yu1tf1w5개월 전용기를 가지고 일어난 대표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
회신하다
@레오-h6k2년 전아버지의 믿을 수 없는 말…‼︎ 동의하에⁉︎ 자신을 망설이기 전에 당신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딸은 아직도 마음에 병을 안고 있어‼︎ 부모가 쫓는다니…
6
회신하다
@야스샷4개월 전쇼와라면 이런 것 비교적 여기저기였겠지.
4
회신하다
@sakuchan3457개월 전부모가 아이를 괴롭히는 중에서도 최악의 범죄군요.
3
회신하다
🌸유리-y4d4t1년 전아직도 가해자의 얼굴을 모자이크로 숨기는 이유를 모릅니다.
4
회신하다
@마미무메모-t9k2년 전유치원 때부터 아이에 대해 자신의 신체나 소중한 부분을 부모이든 다른 사람에게 접할 수는 없으면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네요
4
회신하다
@adlerna13182년 전꽃 데모, 할 수 있었다 !!! 용기를 내고 행동한 많은 여성들, 감사합니다. 인간의 악마를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
9
회신하다
@오단고 -i1g2년 전 (편집됨)딸이 몇 살이겠지만 부모와 자식으로 무리하게 몸의 관계를 가지는 시점에서 범죄일 것인데 너무 불충분하다. 나도 어머니로부터의 학대를 저항할 수 없었던 자신이 나쁘다고 역시 40중반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5
회신하다
@하나코 산포1년 전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다? 에?
5
회신하다
@nana-f3d7개월 전코이츠 전혀 반성하지 않고 '가해자인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믿을 수 없다. 버리는 세상인 어쩔 수 없다.
3
회신하다
🍑🏻8개월 전 (편집됨)실의 아버지, 사회에서 지금도 보통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무서운, 심심한 메스꺼움이 된다.당신들에게 인권을 주장할 권리는 없다. 평생 주위의 눈을 신경쓰면서 계속 살아라.
2
회신하다
@홍조초이49452개월 전딸을 지킬 수없는 어머니 혈액의 연결은 의외로 취약합니다.
2
회신하다
@neozeon83111년 전엄마가 상대해 주세요.
6
회신하다
@인형자3개월 전아직 보육원에 다니던 무렵, 자신도 아버지에게 자주 음부를 접하고 있었다. 하고, 싸움을 잘 하고 있었다. 처음 생리가 왔을 때는, 너도 여자가 되었구나, 말해져 엄청 기분 나빴다. 아버지가 자고 있었고, 자고 있었는지, 아니면 의도적이었습니까? 모르겠지만 속옷 속에 손을 넣었다. 현재 자신은 20세에 아직 친가에 살고. 역시 싫다. 기분이 나쁘다.
3
회신하다
1 답변
굿즈 -h7e1년 전이봐, 아버지의 모자이크를 제거하라!
12
회신하다
1 답변
@sui_08302주 전 (편집됨)나도 나이가 없는 친형에게서 초등학생 때에 성피해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최근에 마침내 마음의 질병에 된 것을 계기로, 자신은 성 피해를 받고 있었다고 자각할 수 있어 정신과에 다니고 마음의 상처와 마주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좋은 오빠가 부러워. "라든지 "어째서 남자친구 만들지 않는 거야" 등 사소한 말이라도 상처 버리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이유도 성 피해가 큰 요인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형의 모든 것을 미워할 수 없는 자신 있습니다 형 지금은 가정이 있습니다. , 가족 사이는 좋기 때문에 내가 붕괴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평생 가족이나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했어.
회신하다
@나탈리-ys7eq1년 전유카리 씨의 아버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부인도 딸의 유카리 씨도 정신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었겠지라고 생각한다. 성욕이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을 방고하고 울면서 사과하는 곳이라든지, 계산 높을 것이다.
3
회신하다
@그래 -v5o7개월 전최초로 나온 사람, 아버지에게 성행되어 엄마에게 상담하자 “이것은 3명만의 비밀로 하자” 들썩했다. 보통 바로 경찰 부르고 이혼하자. 아버지의 변명, "이상한 녀석과 성행위 - 힘들게 자신이 귀찮게 보고 있었다" 너가 제일 이상한 놈이 아니냐
3
회신하다
에키코 사토-d3e4개월 전 (편집됨)엣❔피해자라고 알면서 무죄는 있을 수 없는 일본의 재판❔법은 무슨 연령의 벽이 부족하지 않은 성 버릇이 아니라 단순한 이상자 형무소에 평생을 갖고 싶어 전혀 용기를 가지고 일어선 여성들 훌륭합니다
2
회신하다
@userkym1년 전이 아버지가 이상해?
7
회신하다
@ 귀여운 열대어 - f4y1년 전헤어져 집을 나오지 않았던 어머니는 무엇인가?
6
회신하다
@ 살구자궁하부-w5e7개월 전 (편집됨)가슴이 조금 하는 것 같은 끔찍한 이야기이지만, 면에 나오지 않는 것만으로 상당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 그리고 대부분은 피해자가 피해를 받고 있었던 것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듣고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생각했다
2
회신하다
@네코네코-g5r1년 전 (수정됨)성범죄를 저지른 놈은 성기 절단하는 법률이 있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5
회신하다
@Nun-y2x1년 전동의일지 모르겠지만 근친상간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버지도 어머니도 인간이 아니다.
10
회신하다
@user-ik2jg8km6q2년 전동반자라든지, 복잡한 가정에서의 이야기는 자주(잘) 듣지만, 친아버지인가. 아니었다.
6
회신하다
@kedy4443년 전내 아버지는 때리는 차는 가라앉는 갇힌 표에 낸다고 하는 완전한 폭력 아버지였지만 내가 20대 중반 때에 오랜 울분을 가슴에 귀성하지 않을 정도로 뻔뻔스럽게 되돌리면 화해하고 화해했습니다만, 만약 된 것이 성폭력이라면 화해는 무리군요.
6
회신하다
@tomoyuki_yanagi11개월 전「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다」 아사히카와의 교두와 같은 말로 놀란 그런 말은, 법의 심판을 받고 나서 호조해 지금의 법률이라면 징역 10년은 먹을거야
4
회신하다
@t-ga-zr8rg3년 전정말 기분 나쁜 분노를 넘어 살의 솟아. 어머니도 눈치 채지 않는다든가, 용서한다든지 지킬 수 있는 입장에서 아이에게 있어서의 희망일 것이다.
3
회신하다
@마스다 후쿠미-r2u2년 전편리굴한 아버지. 밖에서는 성실면하고 있다.
8
회신하다
@jk66521년 전2명째의 아카네씨의 친아버지, 출소 후에 「다른 여성과 그 13세의 딸과 동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데리코씨와의 동거, 즉 열매의 딸이 아니라는 것이군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요게에 성교를 하고 싶어지겠지요. 1명째의 미야모토씨의 케이스는 40년도 전에 시코쿠에서 친아버지에 의한 성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빙산의 일각이겠지요.실태는 더 굉장하겠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유카리가 다른 남성에게 성욕이 향해 가면 임신이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응했다』라고 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서했다」라고 하는, 내가 응해도, 원래 유카리씨 소원은 하고 있지 않네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군요. 그리고 지극히 설득은 어머니의 「3명의 비밀로 하자」라고 하는 답변→절망일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친아버지로부터 아직 지식이라든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어린 시절부터 성행위를 강제적으로 하고, 그리고 피해를 부모에게 호소해도 세상에 부끄러워하고 싶지 않다는 보신에 달린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향후 부드럽게 지낼 수 있도록 정말로 생각합니다.
6
회신하다
1 답변
@테레사84194개월 전 (편집됨)아버지의 주제에 (딸과) 동의하에, 뭐라고 말하는 말이 잘 나오지 마.
3
회신하다
@erika58093년 전미국의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것들이 현실에 일어나고 있다니.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 딸에게 합의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왜 유카리씨의 탓으로 할까. 성범죄는 반드시 반복한다고 합니다만, 정말로 병이군요. 미국이나 유럽·한국에서는 성범죄자는 발목에 GPS를 붙여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가까이에는 살 수 없는, 이사했을 경우는 인근에 알리는, 넷에 실명과 얼굴을 등록한다고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법률은 전반적으로 낡습니다. 소년법이 좋은 예입니다. 13세 이하라고 누가 결정했겠지요 그 당시도 소아성애자는 있었을 텐데. 모르는 아이에 대한 행위는 완전히 인권 침해이며 살인과 함께합니다. 성범죄자는 한 번이라도 저질렀다면 어딘가의 시설에 일생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나, 성에 대한 이해가 100년 전부터 멈추고 있다. 동성애는 아프지 않습니다.어른의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왜 문제입니까?그것이 범죄입니까?소아성애자와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처벌하는 곳과 금지하지 말아야 할 곳. 왜 그 판단을 할 수 없는가. 진심으로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이 나라를 바꾸려고 움직여 주세요. 모든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9
회신하다
@ 초승달-h3v3년 전지금 더 커밍아웃했다고 해도, 벌하는 일 등 할 수 없는 이미, 35년도 경과했다. 초등학교 학년까지.오세 차이의 형으로부터의 성적 행위와 폭력 학대.
7
회신하다
@大kawauchi Xiangzi3년 전 (편집됨)아버지 용서할 수 없다.본인에게는 나쁘지만 아버지가 아니다.
8
회신하다
@hero44093년 전너무 죄가 너무 가볍다. 죄라고 여겨지는 장애물이 너무 높다. 2년 만에. 적어도 20년입니다. 애초에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힘든 세상에 마음대로 낳고, 한층 더 고통을 짊어지게 한다니, 사람 비인.
4
회신하다
@df_556510개월 전이런 것은 용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발자가 두드리는 세상이어서는 안되는 고발자의 용기가 훌륭합니다.
2
회신하다
@아리오니기리-p5y1년 전진심으로 극형으로 해라. 성 피해를 입은 사람은 평생 고통받는다. 그 사람의 인생을 빼앗는다고 하는 점에서는 살인죄 동등의 벌이 필요.
7
회신하다
@모르카-q1e1년 전엄마는 눈치 채지 못했는가? 아빠는 화해!라고 말하고 있지만 있을 수 없다!
7
회신하다
@sao0105kibikibi2년 전가해자에게는 인권 따위 없어요…
8
회신하다
1 답변
@Karuru-x5c11개월 전왜 피해자에게 모자이크를 넣지 않습니까?
3
회신하다
@taijou-p4s2년 전이런 죽을 만큼 괴로운 경험을 해도 미용사를 목표로 독립되고 있는가‥ 이 피해자의 여성은 진짜 강하다.
3
회신하다
@피로씨-g3q1년 전모라하라, DV가정에는 아이의 성피해가 동시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좋다. 에 많다.
3
회신하다
@mk-pe3pv1년 전당사자 간의 화해??
5
회신하다
@ 켄 군 사랑3개월 전열매의 딸에게 성 학대는 왜 할 수 있을까?
4
회신하다
@lilstuff3219개월 전몇 살의 아이에 대해 동의 위라든지 호자하고 있었는지. 어떻습니까? 성인 여성도 치명적입니다. 한을 당한 것만으로 무서워서 몸이 굳건히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에 처해 있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2
회신하다
@ 아유와 산책1년 전매운데도 매운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머리가 내려갑니다.성적 학대는 지금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분개하고 슬픈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없어지기를 바란다.
2
회신하다
@바다-y1w1년 전이것, 지상 디지털로 여러 번 방영하십시오. 전국 인터넷에서. 부탁드립니다.
5
회신하다
@azukichan51년 전감호자 성교등죄에 연령 제한은 필요 없겠지요.
4
회신하다
@tdm29659개월 전 (편집됨)자신은 남자이지만, 아버지에게 몸을 접한 적이 있고, 마음대로 목욕에 들어온 적이 있다. 이다 계속 부끄러움의 감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변명이라 해도 어쩔 수 없지만. 자신도, 역시 어머니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의식주를 상대가 가지고 있다. 를 완전히 잡혀 있기 때문이지요. 신고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부모가 없는 생활은 어린 아이에게는 상상할 수 없고.
3
회신하다
@fufufu95011년 전실형이 너무 짧다!지금의 법률에서는 성범죄자에게 너무 달콤하다.
4
회신하다
🍑 🌸4개월 전무엇이 어떻게 되면, 자신의 딸이 성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3
회신하다
@ayasensei57091년 전교훈 : 남자는 부모이지만 형제이지만 신용해서는 안됩니다.
4
회신하다
@user-kt_k___boo.8883년 전 (편집됨)친아버지로부터 성 학대되고 있던 친구가 있습니다. 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법 개정이 필요한지 5년에 1번은 정기적으로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3
회신하다
@oshio_84652년 전피해를 당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고 싶어합니다.
2
회신하다
@xvzfaxf1년 전연령은 관계 없겠지 부모와 아이가 성행위하는 것이 죄이니까.
3
회신하다
@재춘 최순 사이사순6개월 전용기있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회신하다
@高士久美1년 전진짜, 이 아버지에게는 인권은 필요없다. 의 상처를 생각하면 사형에 걸릴 행위야.
5
회신하다
@레드레드-d5q1년 전소아과의 가와야라는 악인의 의사로부터, 중학교 때부터, 림프선의 검사라고 말해, 속옷에 손을 넣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적장애 탓인지, 모르고, 아주 싫지만, 참아서 뉘우쳤습니다.
3
회신하다
@마루-zh3tl1년 전일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을 수 없고 자신이 그 외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상상을 끊습니다. 원해. 피해를 당한 분이 살아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키워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1
회신하다
@kina75256개월 전이 아버지가 지금도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거나 있을 수 없다
3
회신하다
@에미탄-g5t2년 전가해자 측에도 인권이 있다고 하는 아버지의 말, 뭐야 그것 일생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치유하지 않는 상처 입고 있어 이런 사람은 피해자의 고통은 죽어도 이해할 수 없겠지. 에 음란 피해를 당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상대는 아버지는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이 있을 때마다 불쾌한 기분이 듭니다.
3
회신하다
@kanabiyori8개월 전가정내의 성폭력,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활동, 응원하고 있습니다.
1
회신하다
@user-poci-marin393주 전이런 성폭력을 하는 부모에게 태어나 버렸다면, 아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존속 살중벌 규정 위헌 판결을 기억했습니다. 50년전의 일입니다.실의 딸을 임신시켜 딸의 인생을 부수어 버린 아버지가, 딸에게 죽인 사건입니다.일본은 성범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습니다.
1
회신하다
@risakichi01381년 전여러분의 용기에 감사입니다. 저에게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3
회신하다
@야마타타로-g6w2년 전?? ? 좋다.
5
회신하다
@미륵로이드1년 전성 학대에 의한 후유증이 어른이 되어도 치료되지 않는 것도 심각합니다만, 독부모에 의한 심리적 학대의 후유증도 심각한 것의 이해도 넓혀 주었으면 합니다.
2
회신하다
@로터스-b6m4개월 전 (편집됨)그런 남자는 거세밖에 없는 것은? 의 인권이란 피해자를 계속 내놓는 죄없는 자에게의 위험 위에 있는 것은 이상하다.
3
회신하다
@lala-jg6uh2년 전어린 시절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형, 언니, 형의 친구들로부터 피해를 받고 자랐습니다. 여성이나 그 밖에 피해에 맞는 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3
회신하다
1 답변
@文树-x5v1달 전 (수정됨)이런 부모는 부모와는 말하지 않는 철저하게 싸워 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자가 이 저레벨 국가를 만들어 버리고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2
회신하다
@yuriyuko63371년 전눈물이 나왔습니다.피해자의 연령 관계없이 확실히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4
회신하다
@tdeen68431달 전이렇게 활동하고있는 분들도 있지만, 쿠사 츠의 허위 고발이라든지 다리를 잡아 당기는 사람이있는 것이 화가 난다.
2
회신하다
@이소노 우에-j9o1년 전가족 안에서의 화해?화해는 없으니까, 한 번이라도 그렇게 말하는 일을 하면 불쾌과 그 이상의 것 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2
회신하다
@user-pokemonpan2년 전아버지는 당연하지만 어머니가 제일 기분 나쁠지도 모른다
4
회신하다
@house-e6l8개월 전끔찍한 학대입니다.😢 시대착오도 심하다💢
4
회신하다
@카스텐-n1h6개월 전굉장하다. 자신이 괴로운 생각을 했는데 앞을 향해 타인을 구한다.
1
회신하다
@무쿠라부3년 전말은 나쁘지만 귀축이네요.
11
회신하다
@ 대지 번3년 전성학대에 관해서는 초등학생이 된 아동에게는 제대로 교육하고 도움을 낼 수 있다는 것도 포함해 지식도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헬프가 있으면, 가해자로부터는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의 사이는 벌금을 준비해, 그 돈의 대부분을 아이에게의 위자료·양육비에 받을 수 있으면 좋을까 생각한다. 아이가 바라면 받아들이는 시설의 준비나 가해자와의 격리색도 필요하지만, 그런 세계가 되면 부모도 자각해 「자신의 것」처럼 아이를 취급한다고 하는 시대도 끝나는 것일까・・・.
5
회신하다
@1114lajpn8개월 전이러한 방송이 늘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성범죄에 대해 경시하는 생각이 바뀌는 것을 기도합니다.
1
회신하다
@ 달빛 조사1년 전어리석은 거야, 가해자의 버릇에 「가해자 측에도 인권이 있다!」등이라고, 왜 말할 수 있는 거야!
4
회신하다
1 답변
@요시40792주 전성 학대, 성폭력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
1
회신하다
🌸1년 전성범죄자는 모두 거세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3
회신하다
@user-pi3z1년 전최저 부모
4
회신하다
@XzRq0P2Q21년 전 (수정됨)저명인이 가해자를 大裈裟에 칭찬하고 고발자가 팬에게 가방을 치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척하고있는 연예 사무소 다시 이상합니다.
2
회신하다
@jqpvwgaj3년 전잘 아버지는 말할 수 있네.
4
회신하다
@sionada62년 전혈연자에게 성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은 사촌조차 메스꺼움이지만, 믿을 수 없는.
4
회신하다
@y.yurara6600 최고다1년 전유카리씨의 인생 파괴해 두고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든가… 이런 친사형으로 좋다…
7
회신하다
@ry99757개월 전친아버지로부터의 성적학대… 의 아이가 할 수 없었던 곳.
2
회신하다
@user-fz2ys3jb5k4개월 전어쩌면 행복해주세요.🌻
1
회신하다
@전중일郎-x7k4k3년 전피학대 미경험이지만 보고 있어 메스꺼웠던 최악이야 이 부모들.
2
회신하다
@vitality-l7y2년 전어머니가 아들이라고하는 패턴도 있고,이 세상은 지옥입니까?
5
회신하다
@ 나나시 곤코 -l2l1년 전이런 것은 실은 꽤 많은 것 같아서, 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만이라고 최근 TBS의 뉴스 프로그램 속의 특집으로 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그 아버지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씨들이 마음의 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울고 잠들지 않아도 좋은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1
회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