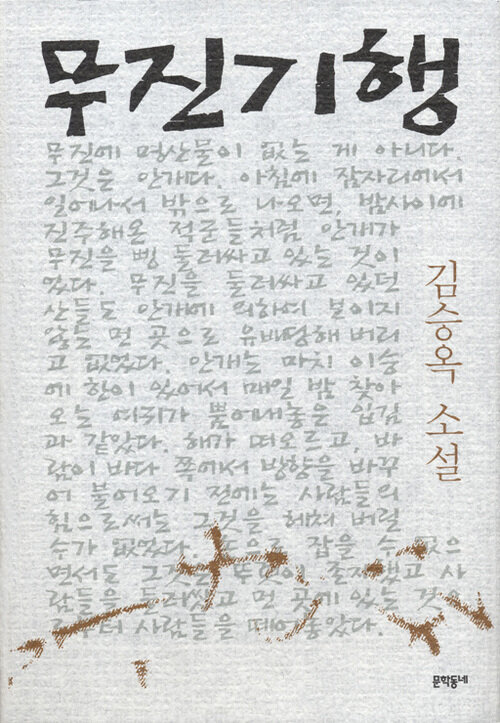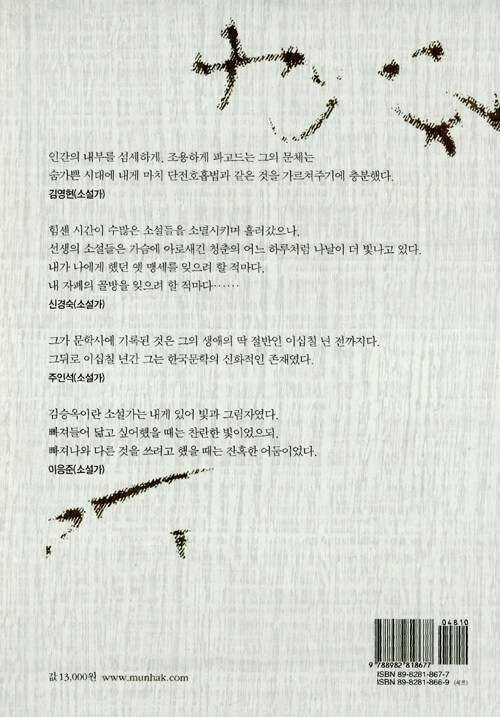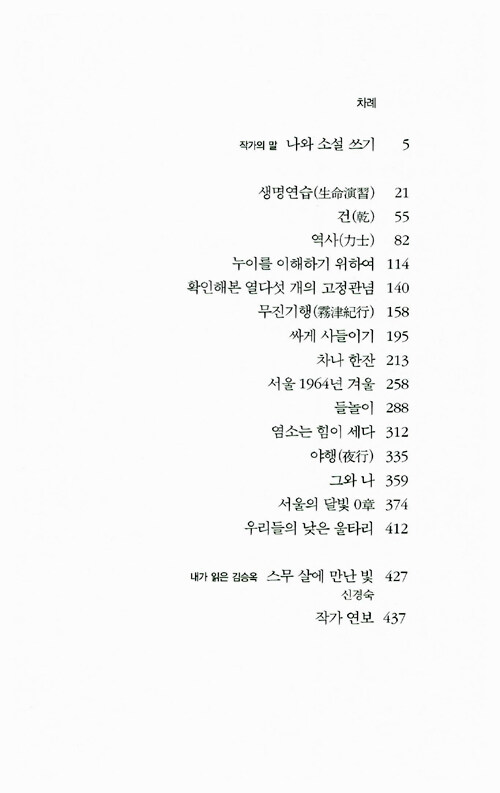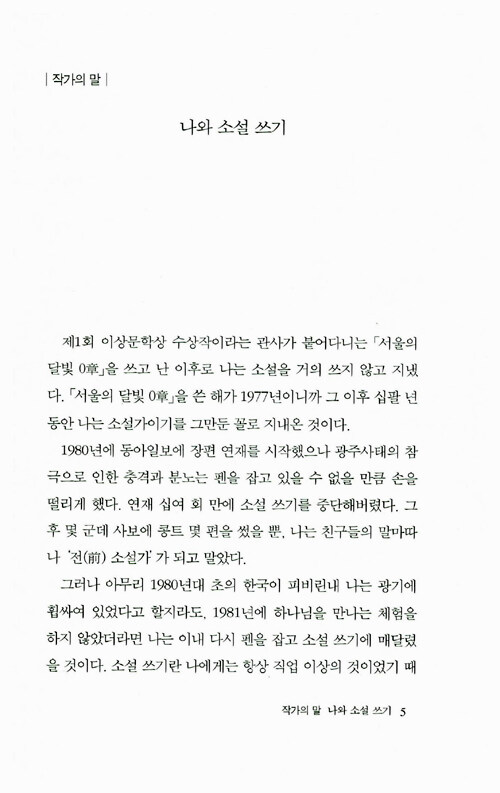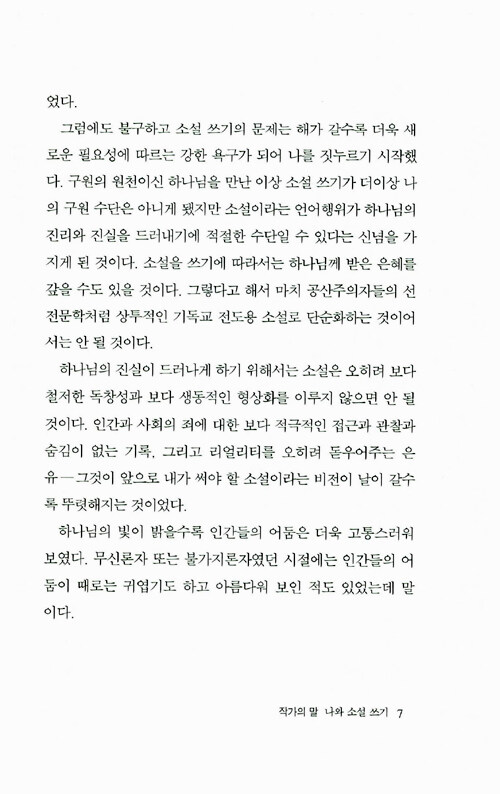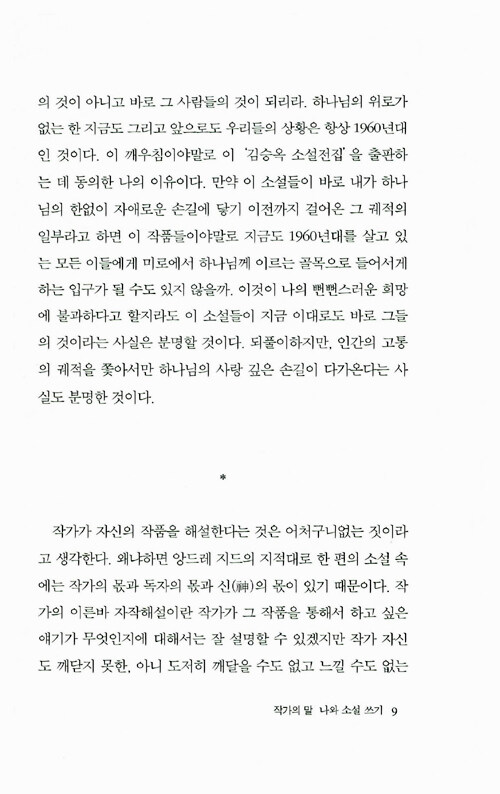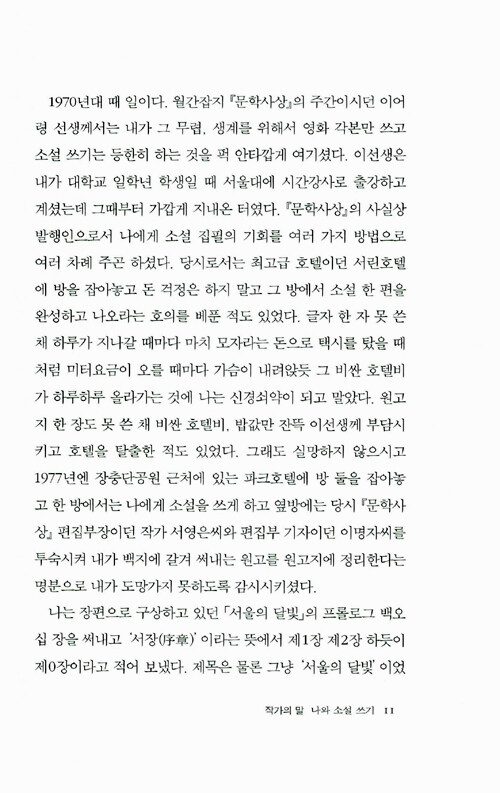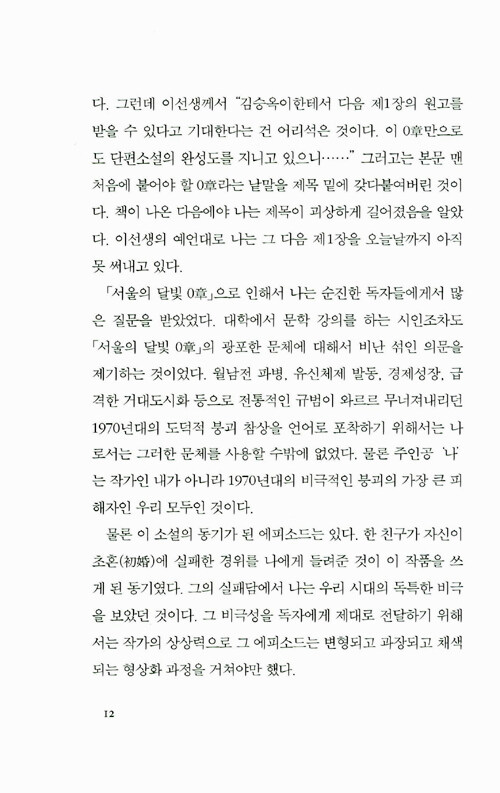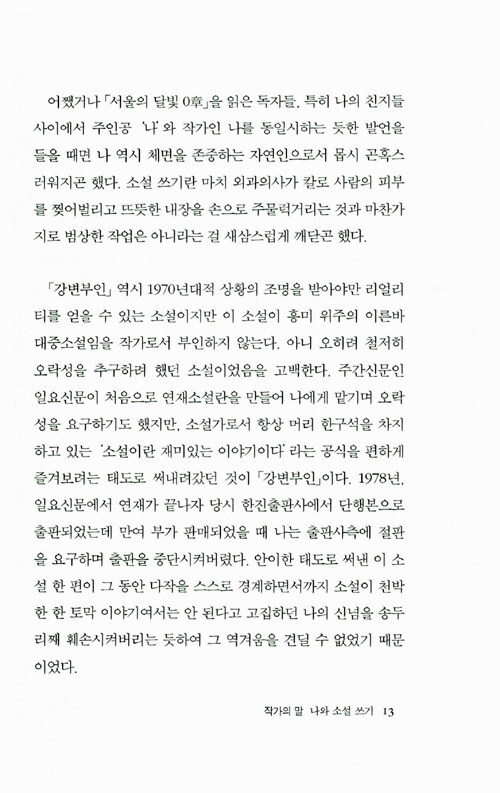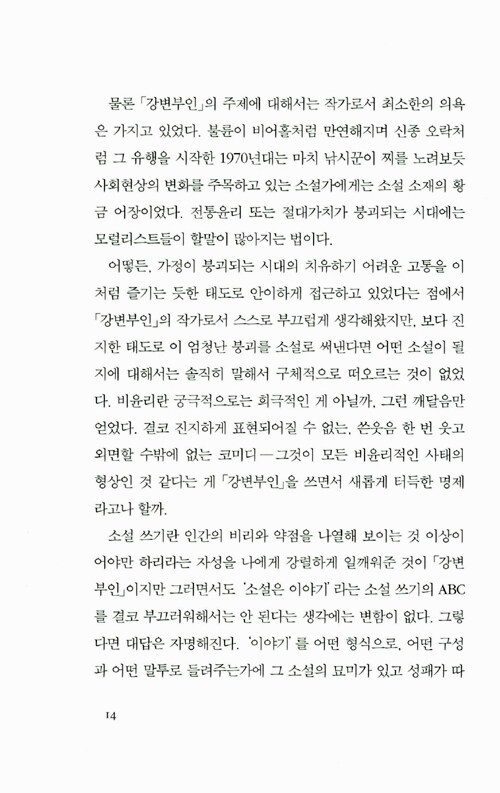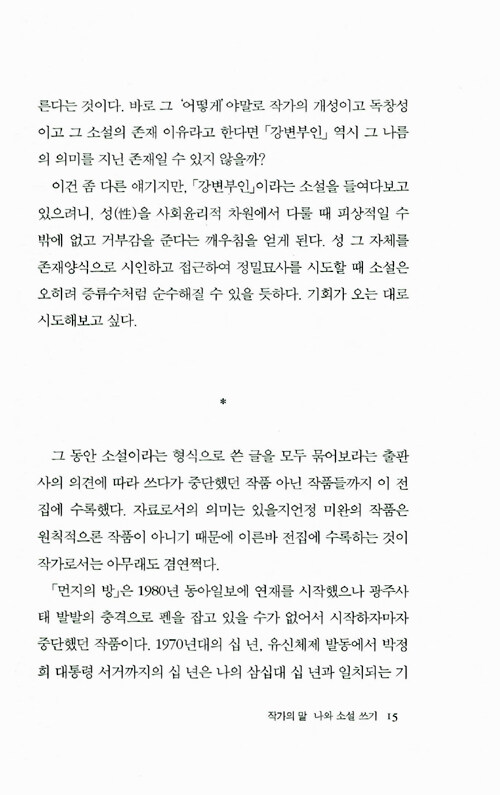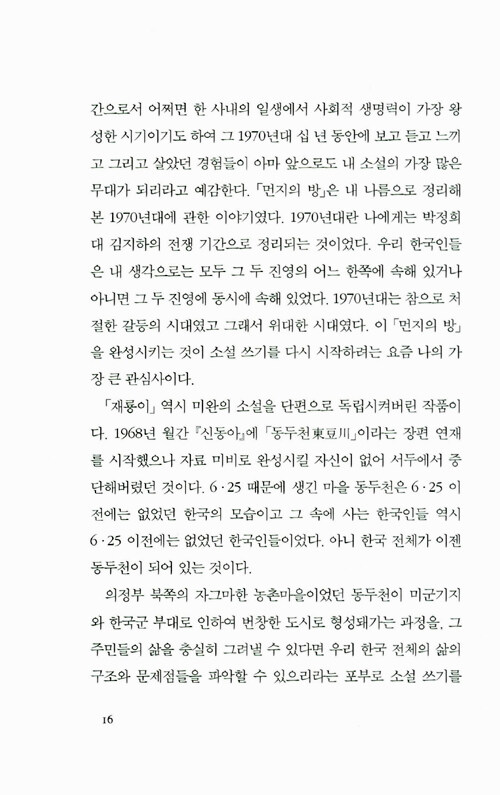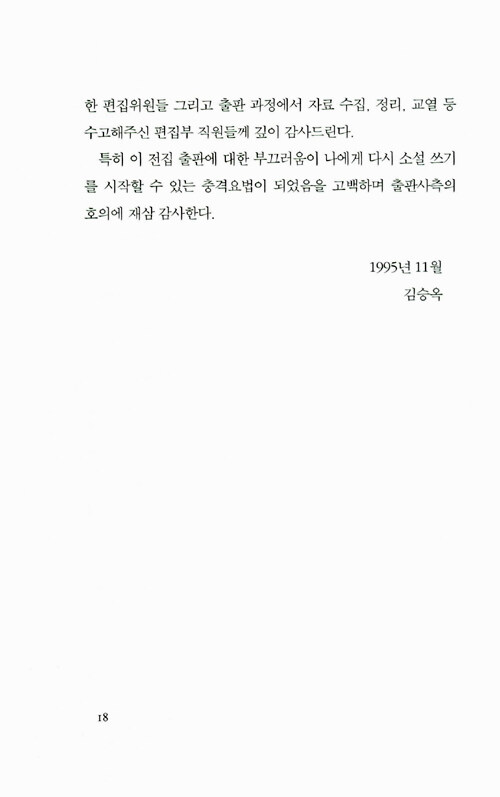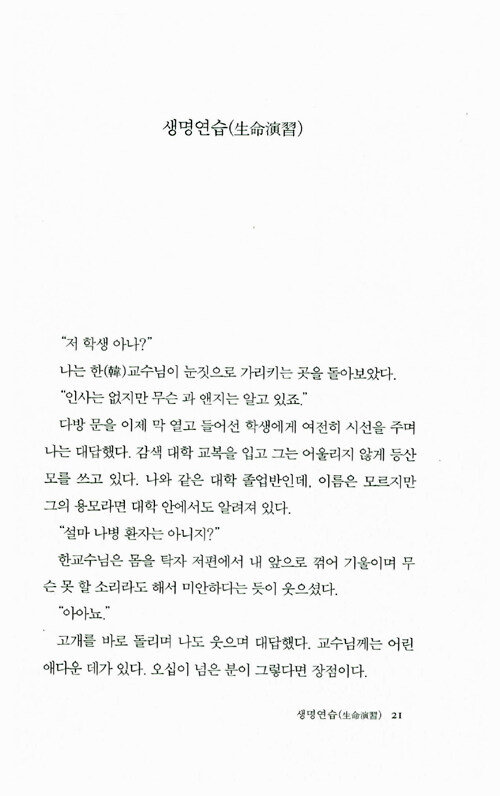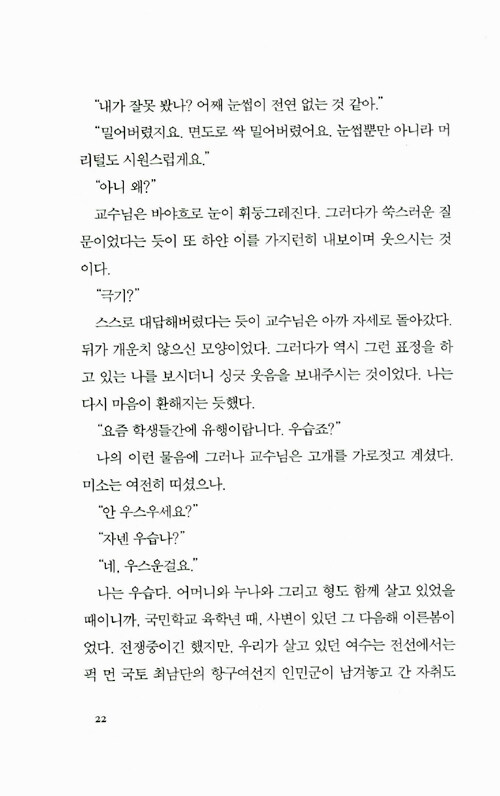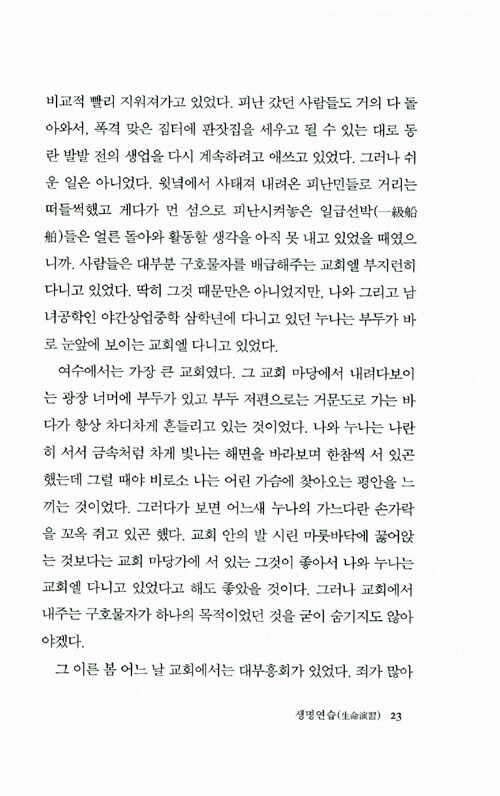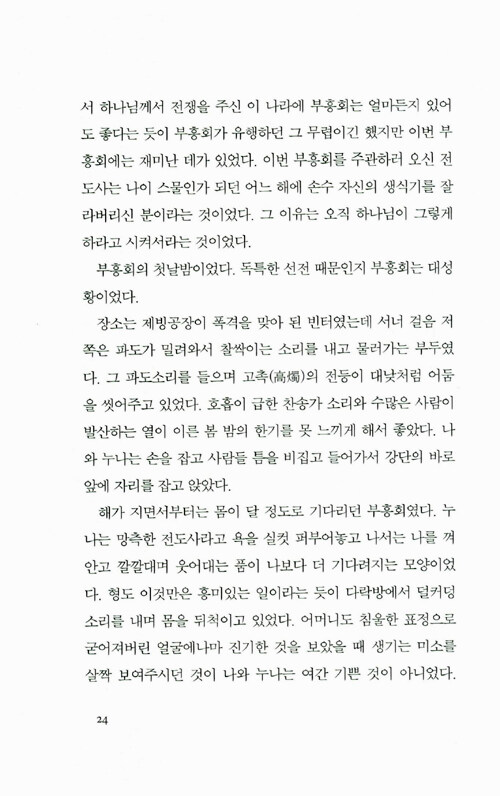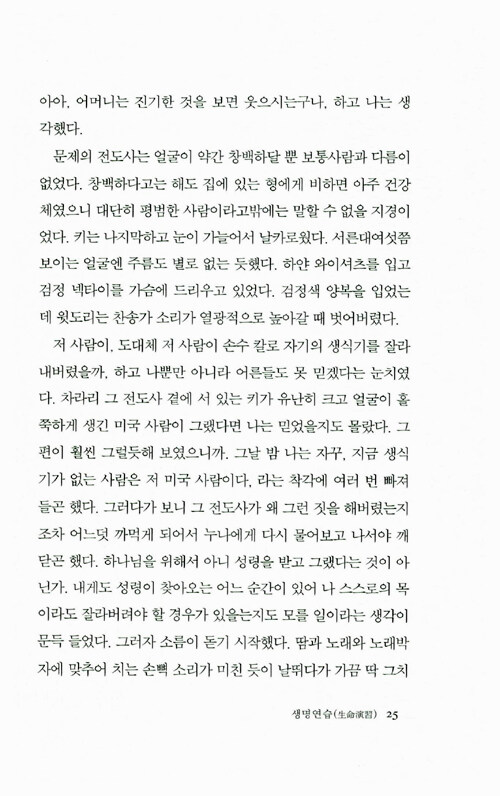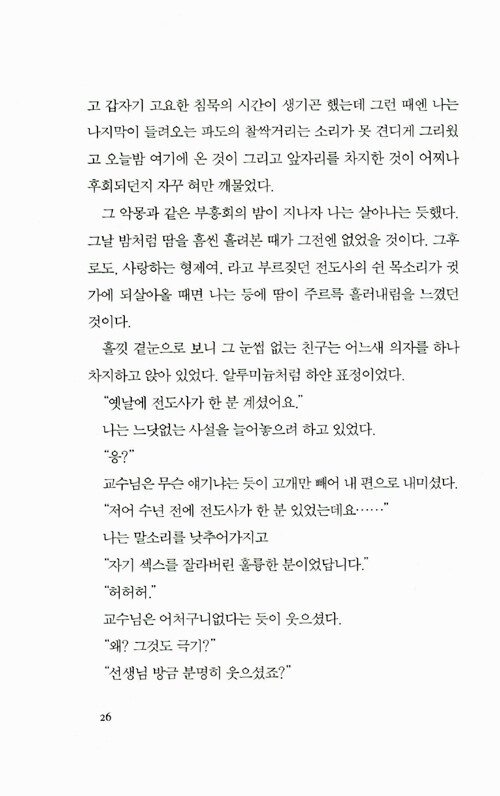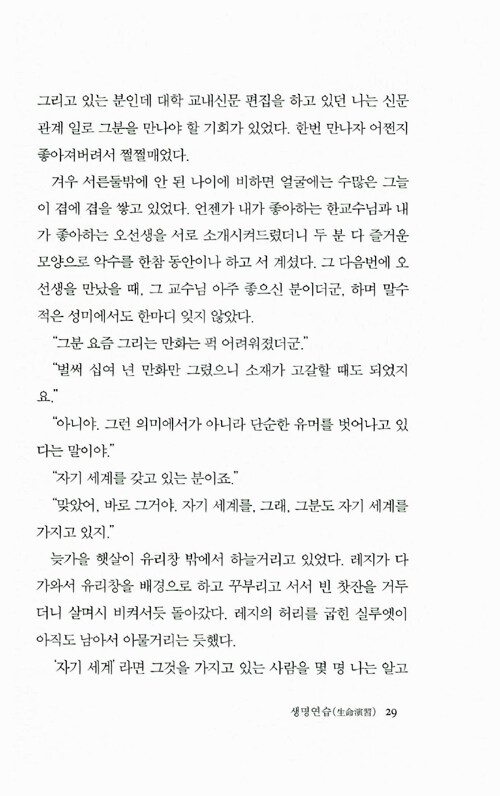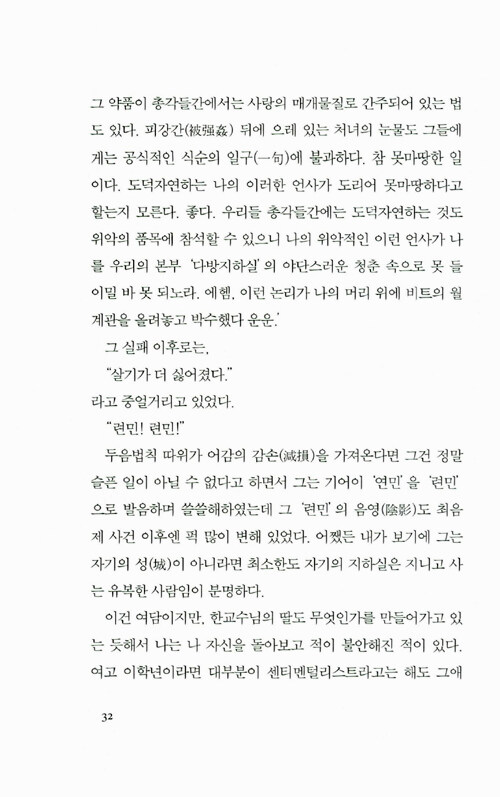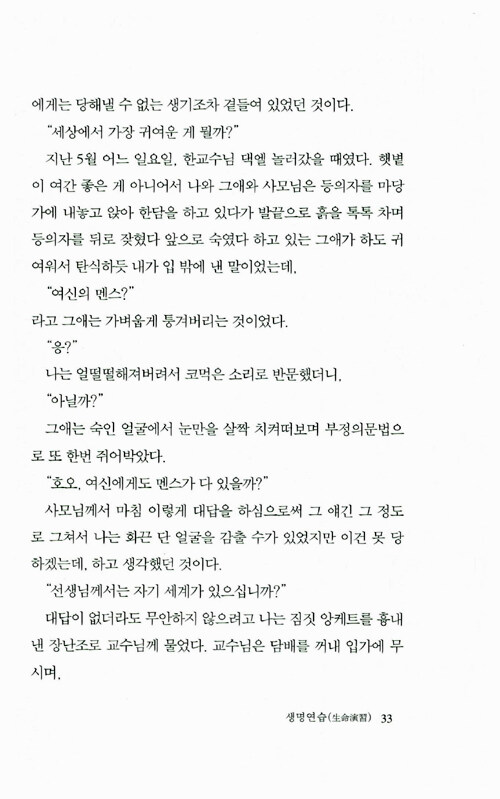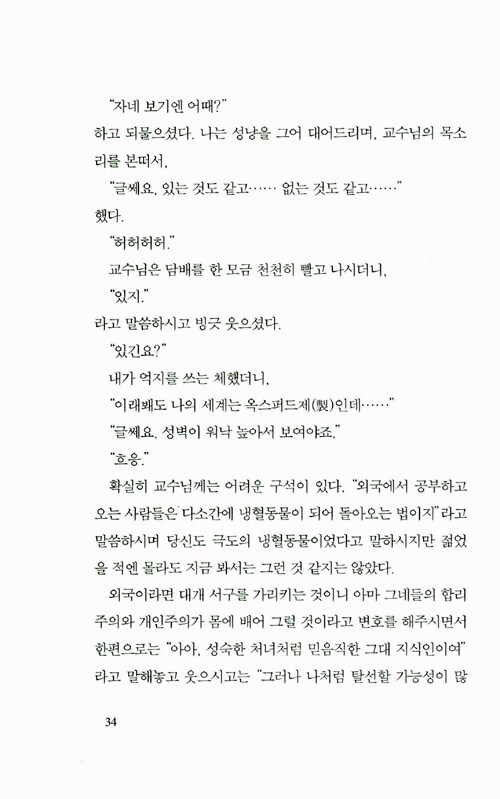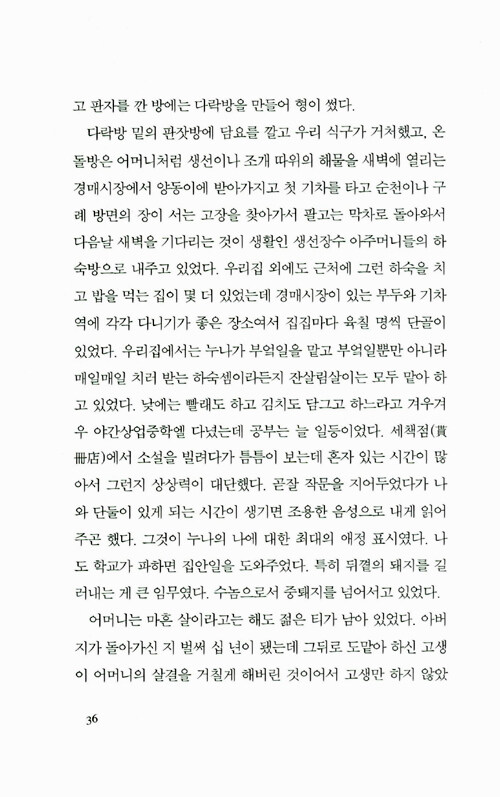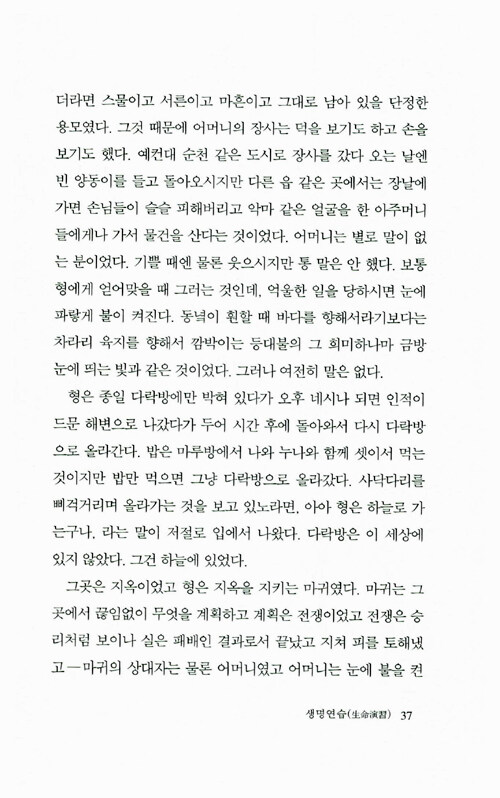리처드 왓모어, 『지성사란 무엇인가?』, 서론 초벌번역[서언 추가]리처드 왓모어, 『지성사란 무엇인가?』, 서론 초벌번역[서언 추가]BeGray
2018.10.11 02:41
댓글수8공감수 7
아래는 Richard Whatmore의 저작 _What is Intellectual History?_의 서론(introduction, pp. 1-11)을 한국어로 옮긴 초벌번역문이다. 다른 포스팅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얼마 전 왓모어의 책을 읽으면서 한국의 학생 및 연구자들에게 지성사 방법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꼭 번역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뒤에 좀처럼 여유가 나지 않다가 간신히 어제 하루를 내어 서론만이라도 옮겨볼 수 있었다. 급하게 번역한 초벌원고인만큼 지금 다시 보니 첫 문장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어차피 만약 번역출간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부 수정교열을 거칠테니 당장은 어색하더라도 손대지는 않겠다. 물론 실제로 옮기면서 확실히 붙잡지 못했다고 생각한 부분이나 대략의 뜻만 통하게 해두고 넘어간 대목이 여럿 있는터라 부족한 지점에 대한 지적은 감사하게 받겠다. 현재는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을 구매한 출판사가 있는지부터 시작해 많은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만약 늦지 않게 번역을 내어 많은 독자들에게 유용하게 읽힐 수 있다면 무척 기쁠 것이다.
[20181012- 서언(Preface, pp. vii-ix) 초벌 번역을 추가]
한국어 초벌번역: 리처드 왓모어, 『지성사란 무엇인가?』,
(Richard Whatmore, What is Intellectual History?, Cambridge: Polity, 2016)
역자: 이우창 / BeGray
최종 작업시점: 2018년 10월 12일 [p. vii] 서언(Preface)
이 짧은 책의 목적은 일반적인 독자들이 지성사란 무엇이고 지성사가(知性史家, intellectual historian)가 무엇을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도록[to give ... a sense of?] 하는 것이다. 지성사는 현재 매우 활동적인 연구분야이다. 현재 역사학의 전지구적 전환, 트랜스내셔널적 전환, 비교연구적 전환(comparative turn), 공간적 전회, 시각적 전환(visual turn), 그리고 국제정치적 전환(international turn)에서 지성사가들은 최전선에 있다. 과학적 학설(scientific doctrines), 정념, 감각을 연구하는 지성사도 있고, 도시계획과 민족국가의 지성사도, 식인과 (보다 자연적인 형태의) 소비의 지성사도, 노동계급이나 전기(傳記), 찬송가(hymn)를 연구하는 지성사도 있다. 지성사를 정의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모든 영역을 포괄하기란 불가능하게 보일 것이다.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지성사를 정의하려는 시도는 또한 누군가의 개인적인 면모를 포함할 수밖에 없으며 희망컨대 그러한 약점이 이 책과 같은 입문서에서는 허용될만한[forgivable?] 것이길 바란다. 지성사를 정의하는 책은 과학의 지성사, 예술 또는 음악의 지성사, 혹은 인류학과 같이 1950년대부터 주목할 만한 저작을 배출해온 여러 분야들을 보다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근래에는 지성사와 철학사와의 관계, 지성사와 문학사와의 관계 또한 연구자들을 위한 비옥한 토양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독자들에게 이러한 영역들에 대한 유용한 안내를 제공하는 것이 내가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다. 책의 내용은 어쩔 수 없이 나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정해졌다. 나의 관심사는 지금은 전통적인 경로라 부를만한 과정을 통해 발전해왔다. 1980년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교육받은 일은 행운이었는데, 나는 그곳에서 [p. viii] 학생의 영감을 고취하는 “1750년 이전의 정치사상”과 “1750년 이후의 정치사상”이라는 제목이 붙은 두 과목의 학부수업을 통해 지성사에 입문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에는 존 던, 마크 골디, 던컨 포브스, 퀜틴 스키너, 개러스 스테드먼 존스, 리처드 턱 및 다른 전문가들이 수업과 지도(tutor)를 맡고 있었다. 졸업 후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해를 보내면서야 나는 이미 스스로가 매우 독특한 지적 유파[tribe?]의 구성원이 되어 있었음을 깨달았다.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케임브리지[, 즉 하버드 대학교]에서 나는 비할 바 없이 뛰어난 주디스 슈클라(Judith Shklar)의 수업 “계몽주의 정치 이론”(Enlightenment Political Theory)을 수강했다. 슈클라는 수업을 듣는 대학원생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역사적 저자의 텍스트와 현재의 정치적 물음을 연결시키도록 고무했다. 핵심은 과거의 저자들이 오늘날의 논쟁들을 마주한다면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생각하는 데 있었다. 그런 식으로 상세하게 논의된 주제 중 하나가 ‘몽테스키외라면 미국의 국기를 불태웠을지의 여부’였다. 나는 이 토론이 괴상하다고[odd?] 생각했는데, 이는 그런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고민하는 일에 별다른 의미가 있는 듯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당시의 나에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식의 논의가 몽테스키외에 대해서든 정치사상의 (그게 역사적인 것이든 동시대적인 것이든) 본성에 대해서든 우리의 앎에 어떠한 기여도 해주지 못하는 듯 보였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나는 역사적 인물들의 저작을 읽을 때 핵심은 그들이 그들 자신에게 중요한 쟁점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고 배웠던 것이다. 과거의 저작이 현재의 정치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러한 연관성은 복잡하고 간접적일 것이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슈클라는 그녀의 세미나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자신들이 읽는 텍스트에서 논증을 찾아내어 그것을 현대의 논의와 견주면서 논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기를 바랐다. 슈클라는 학생에게 항상 질문하고 그 질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답변을 내놓도록 독려하는, 많은 영감을 주는 선생님[teacher?]이었다.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만났던 튜터[tutors?]들과 달리, 그녀는 수업에서 어떤 주제를 다룰 때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세미나를 과거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exercise?]으로 바꿔버리지도 않았다. 나는 슈클라가 18세기 정치에 대하여 내가 평생 도달할 수 있는 수준보다[than I would ever have?] 더 높은 경지의 이해력을 지녔음을 알고 있었기에, 또 그녀가 바로 그걸 가르쳐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더욱 절망스러웠다.
이 지점에 오면 내가 지성사를 어떠한 접근법에 기초하여 이해하는지가 분명해질 것 같다. 일부 독자들은 나의 입장에서 내가 흔히 지성사의 “케임브리지 학파”라 불리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람들은 케임브리지 학파를 종종 지성사란 정치사상사(history of political thought)와 같다는 식의 주장과 엮고는 한다. [p. ix]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케임브리지의 저자들 및 다른 곳의 지성사가들에게 사상의 역사[history of ideas?]는 항상 정치보다 더 중요한 주제였으며, 어쨌든 정치는 경제학, 인류학, 자연철학 또는 여러 다른 분과영역을 통해서도 연구될 수 있는 대상이었다. 이 책의 목표 중 하나는 케임브리지 학파와 같은 라벨이, 비록 그것이 지성사의 정당성을 마련해준 일련의 선구적인 저작[path-breaking justifications of intellectual history?]들을 설명할 때 유용한 면이 있지만, 오늘날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can be abandoned?]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명칭은 더 이상 가장 뛰어난 몇몇의―그들 중 많은 수가 어떤 식으로든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지성사가들에 의해 제기된 연구문제[research question?]를 말하는 용도로 쓰이지 않는다[no longer describes?]. 우리는 일반적으로 케임브리지와 엮이곤 하는 지성사가들이 영어권 전반에서 모방되고 있는 지성사의 다양한 접근법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정치사상사가라는 꼬리표로 묶이곤 하는 개별적인 연구자들이 지성사의 확립에 기여한 바가 간과되어선 안 된다. 여기에서 그들 중 일부는 계속해서 지성사가들을 위한 의제를 설정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해두자. 이 책에서 활용하는 논의[the arguments?]의 사례 중 다수는 정치사상사, 특히 장기 18세기 정치사상사에서 가져온 것들로, 이는 그곳이 내가 가장 자신 있게 다룰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This is the ground where I feel most secure?]. 이 책의 초고를 읽어준 익명의 검토자 한 명은 책 제목이 “정치사상사란 무엇인가?”가 되어야하는 게 아닌지를 묻기도 했다. 나의 의도는 지성사에 대한 입문서를 쓰는 것, 그리고 그러한 작업을 통해 여전히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학문분야들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었다. 다른 곳에서도 말한 바가 있지만, 이 책이 제기하는 요점 중 하나는 지성사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지성사를 구축한 창립자들 중 여럿은 이제 자신들의 최후의 작업이라 할 만한 저작들을 출판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선도적인 인물들이 보여준 방법과 사고방식이 여러 새로운 연구분야 및 문제에 적용되고 있는 중이다. 지성사가 이제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1p] 서론(Introduction)
잉글랜드 북서부 컴브리아의 윈더미어 호(湖) 동편 Ecclerigg Crag 에는 채석장이 하나 있었고, 그곳에서 생산한 슬레이트와 석재는 지역에서 중요한 건축물의 자재로 쓰이곤 했다. 18-19세기에 번성했던 채석장은 전용 부두가 따로 있었을 정도로 컸다. 역사의 일부가 된 그곳의 터에는 지금 호텔이 들어서 있고, 호텔 공터에는 커다란 평판 다섯만이 남아 있다. 수면 위아래에 놓인 임시로 덧댄 바위[ad hoc rocks?]에 더하여, 평판의 기반암에는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다. 그중 일부는 1835년에서 1837년 사이에 새겨진 것으로, 당시 채석장에 고용되었던 석공 장인 한 명이 자청하여 맨 슬레이트 위에 메시지를 적어놓았다. 조각에는 “넬슨”, “뉴턴”, “월터 스콧”, “워즈워스”, “제너”, “험프리 데이비”, “리처드 왓슨” 등 국민적·지역적으로 중요했던 명사들의 이름과 함께 그곳의 소유주였던 “존 윌슨”의 이름도 새겨져 있는데, 호반파 시인들의 친구이기도 했던 윌슨은 『블랙우즈 매거진』에의 기고와 에딘버러 대학교 도덕철학 교수직 재직(1820-51)으로 현지에서 잘 알려진 저명인사였다. 지역 학교에 기부한 여러 개별 인사들과 함께 도로 보수로 명성을 쌓은 “존 러든 매커덤”의 이름도 들어가 있다. 가장 커다란 평판 중 높이가 거의 5미터에 달하는 것을 보면 거대한 글자체로 쓰여진 “국채 8억 파운드 / 오, 하늘이시여, 우리나라를 구하소서! /[2p] 조지 3세, 윌리엄 피트 / 돈은 전쟁의 핏줄 / 웰링턴 육군 원수 / 영웅적인 넬슨 제독”이라는 문구가 석공 장인의 의견을 선언하고 있다.
역사가는 이 부조를 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회사가는 아마 채석장 노동자들의 사회적 위치, 노동조건, 작업장 너머의 삶과 함께, 계급, 젠더, 의례, 정체성 등을 참고하여 그들이 살아간 사회의 성격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고자 할 것이다. 경제사가는 노동자들의 비교임금, 당시의 경제적 조건, 그리고 현지의 다른 업계와 비교할 때, 보다 일반적으로는 국가적 경향과 비교할 때 채석장 고용의 상대적 위치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고자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연관된 조각들을 찾고 감정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문화사가는 개인과 사회집단이 스스로를 표현하는 국민적, 지역적, 혹은 현지의 담론에 대해 숙고하거나, 좀 더 나아가 구체적인 역사적 인물들과 보다 넓은 사회집단 사이의 관계를 그려보면서 그들 간의 권력관계를 분석하고자 할 것이다. 지성사가는 말, 언어에서 출발해야만 한다. 부조의 제작자가 조각을 새기면서 전달하고자 하던 게 무엇이었을까? 왜 그는 바로 정확히 이러한 방식을 채택했을까? 그가 다른 곳에서 진술한 주장들은 어떠한가? 그러한 주장들의 계보는 어떠했으며 그것들은 어떻게 수용되었나?
지성사가의 작업은 특히 메시지의 뜻을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 혹은 이번 사례에서처럼 말이 혼자 새겨져 있거나 경구 풍을 띠는 경우에 어려워질 수 있다. 부조에 언급된 여러 개인들의 이름을 추적하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이름들은 현지의 지도적인 인사들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들의 지위를 겉으로나마 존중하는 사람, 특히 빈민을 위한 학교에 기부하는 일을 포함하여 자선행위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의 존재를 보여준다. 그것은 또한 기술적 발명, 과학, 시와 문예, 군사적 용명과 영웅적 행위에 대한 존경심을 잘 드러낸다. 이름만 갖고는 이 이상으로 나아가기는 어렵지만, 평판 위의 문구들에 담겨진 주장들에 대한 분석이 남아있다. 문구는 나라가 국채로 인해 통탄할 만한 지경에 빠졌으며, 저축(saving)이 필요한 상황임을 말한다(“오, 하늘이시여, 우리나라를 구하소서![Save My Country]”). “돈은 전쟁의 핏줄”이라는 문구에서는 돈과 전쟁의 관계에 대한 명백한 적대감이 나타난다. 이러한 주장 곁에는 윌리엄 피트가 두 번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제작자가 피트를 [3p] 이전 세대의, 넬슨과 웰링턴에 대한 언급을 고려하면 아마 제작자 본인이 젊었을 시절의 전쟁광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비록 이를 확인하는 일도 부인하는 일도 불가능하지만) 떠올리게 한다. 한편으로 전쟁의 규모와 결과에 한탄하면서 그러한 위인들의 탁월함을 애국적인 어조로 찬양하는 일은 그 세대에는 전형적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보다 유의미한 사실은 “오, 하늘이시여, 우리나라를 구하소서!”라는 인용구가 묘비명, 로체스터의 주교였으며 1732년 파리에서 망명 중 딸의 품에 안겨 사망했으며 바로 그 문구를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was held to?] 프랜시스 애터버리 박사를 위해 알렉산더 포프가 쓴 묘비명에서 바로 가져온 것이라는 데 있다. 애터버리 자신의 비문은 잘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글귀는 다시 또 위대한 베네치아의 역사가 파올로 사르피 신부의 비문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신부는 임종의 자리에서 “베네치아가 지속되도록 하소서”(Esto perpetua)란 말과 함께 베네치아가 독립적인 주권권력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리라는 희망을 밝혔던 것이다. “돈은 전쟁의 핏줄”이라는 주장은, 니콜로 마키아벨리와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에 반박한 바가 있는데, 키케로의 필리포스 탄핵연설 제5편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라블레에서 테니슨에 이르는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 되풀이되었다. 이러한 문구들은 Ecclerigg Crag의 석공 장인에게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 문구들은 18세기 문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사치와 상업사회의 확장을 한탄하며 또한 방탕한(libertine) 정념, 전쟁, 늘어나는 부채가 전자에 상응하여 무제약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모든 사회가 맞이할 끔찍한 결과를 예측하고 있었다. 데이비드 흄의 『정치적 논설』(Political Discourses)에 에세이 「국가신용에 관하여」(Of Public Credit)는 나중에 석공 장인이 물려받게 될 애가(哀歌) 문학의 훌륭한 예를 보여준다. 흄은 날이 갈수록 국채가 유럽의 국민국가에 가져오게 될 결과에 더욱 절망했고, 당시의 국제관계에 초래될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도자기 가게에서 곤봉을 갖고 논다는 독특한 이미지를 사용했다. 요점은 도자기가 결국 박살나게 되는 것처럼, 이미 국가가 막대한 부채에 빠져버린 나라의 국내 경제와 시민 사회도 마찬가지의 운명을 맞이하리라는 데 있었다. 혁명 프랑스 그리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의 전쟁기간 동안 부채에 대한 공포는 정점을 찍었는데, 당시 부채는 총 국내 생산의 250%를 초과하였으며 이는 지금껏 한 번도 도달한 적이 없는 수치였다. 윌리엄 피트와 부채의 연계는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특히 1797년 정부가 영란은행의 금태환 의무를 정지시켰을 때 명확했을 것이다.
[4p] 부채로 인한 파산이나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데이비드 흄을 포함한 18세기 국민생활의 관찰자들의 눈에 영국(Britain)이라는 국가가 몰락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주원인이었다. 후대의 시점에서 보는 우리는 이후 “산업혁명”이라 불리게 되는 것의 불꽃과 연기를 18세기에서 읽어낼 수 있다. 어떤 역사가들은 영국 역사에서 18세기만큼 커다란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던 때는 없다고도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배질 윌리(Basil Willey) 및 다른 이들은 해당 시기를 자신감 가득한 빅토리아 시대의 전주곡으로서 국가적 안정성이 증대하던 때로 특징짓는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18세기 영국은 위기에 빠진 신생 국가로서, 부채, 전쟁뿐만 아니라 제임스 2세 지지자들과 하노버 왕가 지지자들 간의, 휘그와 토리 간의, 국교도, 카톨릭, 비국교도 간의, 그리고 사회의 상업화를 옹호하는 이들과 적대하는 이들 간의 정치적 분열로 병들어 있는 곳이었다. 국가의 몰락이 곧 닥쳐오리라는 사실이 예견되어 있다는 점을 빼고 지금 미래가 보인다고 믿는 논평자는 거의 없었다. 거대한 변화가 목전에 놓여있다는 관찰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불확실성의 감각이 만연했다. 애덤 스미스나 장-루이 드 롬(Jean-Louis de Lolme)처럼 영국의 전망을 바라봄에 있어서 침착하기로 정평이 나 있거나 심지어 낙관적인 것으로 유명한 저자들조차도 지금의 상황이 안정적이거나 지켜낼 가치가 있다고[worth preserving?] 생각하지는 않았다. 영국의 몰락과 패전을 예측하는 애가가 훨씬 더 만연했던 것이다.
영국이 프랑스 혁명가들 및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아 경제·정치적인 권력에서 볼 때 유럽을 선도하는 국가로 부상하기까지 한 것은 그처럼 일군의 관찰자들이 보여준 의구심을 고려할 때 더욱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다른 많은 나라들이 영국의 정체(polity)와 경제를 본받을 모델로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지성계에는 지금의 대성공이 진짜가 아니며 영국은 필연적으로 몰락할 것이고 자연스럽지 않은 발전이 정점을 찍은 끝에 도달한 정치적·상업적 우위는 더 지속될 수 없으리라는 느낌이 가득했다. 18세기의 부채 수준은 1830년대에 이르러서도 오직 매우 부분적으로만 감소했으며, 영국의 몰락을 한탄하는 오랜 비가(悲歌)는 여전히 메아리치고 있었다. Ecclerigg Crag의 석공 장인은 정확히 이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국가적 파멸에 대한 이전의 묵시록적인 두려움이 1830년대에도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그가 조각한 내용은 특정한 관념들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균형의 시대’(age of equipoise) 직전에조차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5p] 석공의 언어가 중요하다면, 이는 우리가 그로부터 초기 빅토리아 시기에 대한 (때때로 망각되곤 하는) 관점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석공이 남겨놓은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은 과거의 사상을 접하는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는 것, 즉 후대인들에 의해 버려졌거나 거부당하여 망각된 과거의 관념과 사상을 찾아 읽어내는 지성사의 역량을 잘 보여준다. 지성사가는 사라진 세계를 복원하기 위해, 과거의 폐허로부터 여러 관점과 관념을 되찾아내기 위해, 과거의 베일을 걷어내고 어떻게 그러한 관념들이 과거에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옹호자들을 설득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관념은,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문화와 실천은, 어떠한 이해 행위에서도 꼭 필요한 기반이 된다. 자유, 정의, 또는 평등과 같은 개념들을 명료하게 풀어내야만 하는 뛰어난 철학자들은 관념을 통해 자신의 활동을 표현한다. 문화적으로 중요한 인물들 또한 어느 사회에서든 관념의 표현을 통해 활동하며, 이는 어떤 형식의 것이든 대중문화를 상세히 재현하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다. 후자의 예를 한 가지 들어보자. 박물학 연구자이자 작가로 1927년 『수달 타카의 일생』(Tarka the Otter)의 출간 이후 유명해진 헨리 윌리엄슨(Henry Williamson)은 1964년 BBC 다큐멘터리에서 세계 대전에 관해 인터뷰를 받은 적이 있다. 그는 유혈 낭자했던 제1차 이에페르 전투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던 1914년 크리스마스 날을 떠올렸다. 당시 기관총 부대의 이등병으로 플랜더스 참호에 있던 그는 독일 병사들과 친해졌는데, 그들은 전선의 위치에 따라[depending on the location along the line?] 수 시간에서 수 일 정도까지 지속될 영국군과의 자발적인 휴전을 막 결정지은 참이었다. 이 기간 동안 한 독일 병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된 윌리엄슨은 독일 측이 “조국과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윌리엄슨은 독일이 전쟁을 시작했으며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은 영국 측이고 신과 정의는 의심의 여지없이 영국의 편에 있다고 응수했다. 윌리엄슨은 동부 전선에 있는 러시아의 힘으로 인해 전쟁이 곧 끝날 거라고 덧붙였다. 독일 병사는 다시 러시아 군이 와해 직전이기에 독일이 곧 승리할 것이며, 둘 중 어느 쪽도 상대방을 납득시키는 일이 불가능하니 논쟁의 의미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 때 의견을 주고받은 경험은 윌리엄슨의 전쟁관을 바꾸어놓았다. 그는 왜 양측의 병사들이 자신이 정의롭다고 확신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p6] 수많은 사람의 죽음과 국가들의 파괴만을 낳는 소모전으로 바뀌어버린 전쟁은 무의미해져버렸다[?\. 이후 1930년대에 윌리엄슨은 파시즘이 당시 서구 민주주의가 결여한 듯 보였던 어떤 도덕적 확실성을 제공한다는 믿음에 따라 그에 매력을 느꼈는데, 이는 영국과 독일 양측 모두 자신의 대의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하고 있음을 알게 된 1914년의 이데올로기적 깨달음이 초래한 직접적인 산물이었다. 그러한 확신을, 그 기원과 본성, 한계를 설명하는 일이 정확히 지성사가들이 (이상적으로는 어느 한쪽의 극단주의에 빠져들지 않으면서) 하고자 하는 일이다.
우리는 대중문화에서도 추가적인 예를 찾아낼 수 있다. 존 버컨(John Buchan)의 소설 『39계단』(The Thirty-Nine Steps, 1915)을 1935년 앨프리드 히치콕이 처음으로 영상화하여 개봉한 동명의 영화를 보자. 기관차 플라잉 스코츠맨(Flying Scotsman) 호가 에딘버러 웨이벌리 역에 도착한 장면에서, 추적을 피해 도망치는 주인공 리처드 해니(Richard Hannay)와 같은 칸에 탄 두 명의 잉글랜드인 여성속옷 판매업자 중 한 명은 그가 처음으로 마주친 (열차 창문을 통해 신문을 팔고 있는) 스코틀랜드인에게 “영어는 할 줄 아니?”(Do you speak the language?)라고 묻는다. 잠시 후, 해니가 에딘버러의 로랜드 북쪽에서 경찰에게 쫓기는 대목에서, 한 농부가 추위에 얼어붙은 해니에게 자신의 코트를 주었다는 이유로 부인을 때리기 시작한다. 나중에 『노인 부대』(Dad's Army)로 유명해지는 존 로리(John Laurie)가 분한 농부는 해니에게 입을 다무는 대가로 돈을 받은 뒤 다시 그를 경찰에 팔아넘기려는 사악하고 잔인하며 반사회적이고 거짓된 인물로 재현된다. 이처럼 전간기에 영국인들이 스코틀랜드인들에게 가졌던 편견을 한껏 드러내는, 그리고 스코틀랜드 칼뱅주의를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자 야만스러운 교리로 그려내는 영화적 재현은 그러한 민족적 스테레오타입이 기원, 유행, 쇠퇴하는 배후에 있는 관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면밀히 검토될 가치가 있다. 변형된 관념의 효과를 보여주는 보다 최근의 예로는 필립 K. 딕의 1968년 작 소설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Do Androids Dream of Electric Sheep?)를 원작으로 리들리 스콧이 감독한 1982년작 영화 『블레이드 러너』(Blade Renner)를 꼽을 수 있다. 2019년 로스앤젤레스의 디스토피아적 풍경을 그리는 이 영화에서, 거의 모든 등장인물은 끊임없이 담배를 피운다. 리들리 스콧이든 필립 K. 딕이든 세기가 바뀌어 2000년대가 되고나서 곧바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벌어질 것을 알 수는 없었다. 즉 흡연행위는 이제 더 이상 등장인물의 상태와 그가 취하리라고 짐작되는 태도를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대신 이 영화가 상상의 미래보다는 전후 시기에 대해 관한 작품임을 알려주는, 작품의 연대를 짐작하도록 하는 장치가 되었던 것이다. 복잡한 철학적 [7p] 발화를 다루든, 장기간에 걸친 문화적 실천, 혹은 국민적 편견이 자연스레 표현된 산물을 다루든, 지성사가들은 그러한 의견의 기원과 확산범위[extent?]를 설명하고자 하며, 이때 그 역사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엘리자베스 라브루스(Elisabeth Labrousse)가 피에르 벨(Pierre Bayle)의 『역사적·비판적 사전』(Historical and Critical Dictionary, 1697)에 대해 쓴 내용을 보자:
관념의 역사는 다음 사실을 알게 해준다. 어떤 작품이 일단 그것이 원래 속해 있던 사회·역사적 맥락이 제거되고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아내는 것으로 읽히는 과정에서, 작품은 기계적인 반복이나 관념의 정확한 성찰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텍스트의 해석을 찾아가는 애매모호함, 오해, 시대착오를 통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삶과 관념을 재현하는 수많은 사례들은 미래에는 지금의 환경이 변화하리라는 기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So many representations of life and ideas are concerned with anticipations of expected altered circumstances?], 역사가 자신이 예언의 능력을 지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노는 일은 전형적이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장에 도달한다. 비록 경기순환이나 인구변천단계(demographic regimes), 수확고 등등을 연구하거나 하는 경우에서처럼 관념의 역할을 간과하는 게 가능해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인간의 역사를 이해할 때 관념은 결코 도외시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생각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유를 매우 다른 외피들을 통해 제시한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사람들이 진술하는 관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관념들이 그것들을 형성한 보다 넓은 이데올로기적 문화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일은 섬세한 재구성의 노력을 요구한다. 관념의 의미를 알아내는 과제는 오직 역사적 해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지성사는 인류학 및 연관 사회과학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민속지적 탐구작업과 매우 유사하다. 이는 클리퍼드 기어츠의 유명한 논문 「중층기술: 해석적 문화이론을 향하여」(Thick Description: Toward an Interpretive Theory of Culture)에서 가장 잘 묘사된 바 있다―기어츠는 문화가 기호(학)적이라는 지점에서 출발하는데, 이는 “인간은 자기 자신이 자아낸 의미라는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 동물”(man is an animal suspended in webs of significance he himself has spun)이기 때문이다.
기어츠의 용어 “중층기술”은 길버트 라일(Gilbert Ryle)의 유명한 사례에서 가져온 것으로, 라일은 자신의 오른쪽 눈꺼풀을 오므리는 두 소년의 예를 든다. 눈꺼풀의 씰룩거림은 어떤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이다. 다른 경우에 같은 동작은 때로는 친구들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메시지가 된다. 이제 세 번째 소년은 윙크와 씰룩거림을 패러디하기 시작한다. 중층기술은 이런 예에서는 [8p] “씰룩거림, 윙크, 거짓 윙크, 패러디, 패러디 연습과 같은 행위들이 생산되고, 인지되고, 해석되는 의미구조의 계층화된 위계질서”(stratified hierarchy of meaningful structures in terms of which twitches, winks, fake-winks, parodies, rehearsals of parodies are produced, perceived, and interpreted)를 복원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중층기술”이란 용어는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 그의 출판물이나 사적인 글쓰기에서 해당 표현을 찾아낼 수 없었다. 하지만 중층기술은 벤담이 특정한 관념의 의미를 설명할 때 추천한 일련의 절차에 잘 부합한다. 벤담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파리의 국민공회를 대상으로 설명할 때는 긴급한 태도로 다음과 같은 요점을 말한 바 있다. 정의나 자유와 같은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기란, 마치 눈꺼풀의 움직임이 씰룩거림인지 윙크인지 알아차리기 힘든 것처럼, 어려울 수 있다. 해결책은 언어의 용법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많이 수집하여 작업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주는 예시들을 참고하지 않는 한, 프랑스인들이 자유의 확립과 제국의 추구를 혼동하고 있다고 벤담 자신이 지적했듯 우리도 혼란에 빠지기 쉽다. 그에 따라 벤담은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고 또 함축하는지를 매우 정밀하게 살피고자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유가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상황을 돕는 도구로 사용되는 예에서처럼 그것이 종종 “강제된 자유”(forced liberty)를 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올림픽 대회가 단순히 조직화된 행정부의 유사한 형식을 지녔을 뿐인 시합들인지 아니면 건강하고 몸에 좋은 운동을 원하는 광범위한 욕망의 산물인지의 여부, 또는 암브로시우스 보스카르트(Ambrosius Bosschaert), 페테르 클라스(Pieter Claesz), 얀 다비드존 데 헤엠(Jan Davidszoon de Heern) 등 네덜란드 황금기의 정물화 화가들이 해골, 동물, 꽃, 곤충을 그릴 때 올바르게 살아가고 죽는 방법의 엠블럼, 유비, 상징물로 간주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튤립, 도마뱀, 나방을 그린 것뿐인지의 여부 등을 파악하는 작업은 오직 인간사회의 의견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엄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성사는 종종 혹평을 받곤 한다. 지성사는 오래 전부터 역사가, 철학자, 사회이론가들의 비판을 끌어왔다. 역사분석에서 전기적(傳記的) 정보를 토대로 특정 집단의 공통된 특성을 도출해내고자 하는 집단적 인물연구[prosopography?]를 옹호한 루이스 네이미어(Lewis Namier)는 일찍이 1930년에 출간한 『미국 혁명기의 잉글랜드』(England in the Age of the American Revolution)에서 관념 연구를 “헛소리”(flapdoodle)로 치부했다. 그에 따르면 인간 존재를 움직이는 진짜 동인은 각자의 이해관계(self-interest)이기 때문에, 사회적 행위의 참된 원천을 가려버리는 관념에 대한 주목은 연구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다양한 철학적 [p9] 입장의 지지자들도 관념이란 오직 사회 변화를 실제로 추동하는 진정한 원인들, 가령 규제되거나 규제받지 않은 경제적 요인, 무의식적인 자아, 알지 못하는 대중[unaware masses?] 등에 대한 참조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념은 따라서 세계에 대한 정보의 원천 중에서도 이차적인 위치에 놓일 뿐이다. 진정한 연구란 그러한 요인[forces]들이 나타내는 특권적인 맥락을 발견하는 일이어야만 하며, 관념은 오직 이러한 요인들을 참조해서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언젠가 역사가 베네데토 크로체의 “비열한 본디오 빌라도주의”(despicable Pontius Pilatism), 혹은 지식인의 역할이 필연적으로 인민 대중의 이해관계와 분리되어 그 위에 놓인 것처럼 바라보는 태도를 비난한 적이 있다. 크로체는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고, 모든 사안에 어떠한 책임도 지고 싶어 하지 않으며 공적인 대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고 비난받았다. 오늘날의 지성사가들을 겨냥해도 유사한 공격이 가해졌다. 지성사가들은 현실의 문제에 어떠한 관련성도 결여한 관념론자나 고물(故物)수집가, “책에 대해 말하는 책들”(books talking to books)만을 옹호하는 이들, 엘리트와 탁월한 인물들만을 다루는 연구자, 따라서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며 관념 바깥의 인과적 요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믿음도 없는 사람들로 불려왔다. 이 책은 현재 지성사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을 볼 때 지성사를 향한 이러한 비판들 중 타당한 말은 단 하나도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지성사가들은 관념이 자체로 사회현상에 대한 일차적인 정보이며, 관념에 대한 참조 없이는 기술될 수 없는 우리의 세계에 관한 여러 사실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그런 점에서, 관념은 그 자체로 사회적 요인[social forces?]이다. 관념이 다른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지만, 역으로 관념 그 자체는 항상 인간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사항을 제외하면, 지성사가들 사이에 별다른 방법론적 합의점은 없다. 부분적인 이유는 지성사가들이 각각 20세기 후반부 또는 그 이전에 발전해온 무척 다양한 철학적 흐름들로부터 태어났다는 데 있다. 그 흐름들 중 일부는 뒤쪽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한 가지 강조할만한 사실이 있다면, 지성사가들의 문제 중 하나는 그들이 인문학의 여러 분야에 걸쳐 있으며, 따라서 각자가 속한 특정한 분야의 지배적인 방식에 의거해 스스로를 규정하는 일을 끝없이 행해왔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난점 하나를 꼽자면 지성사가들이 동료 역사가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는 종종 문제가 되어 왔다. 관념을 “진짜 역사”(real history)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에 부수적인 요소 정도로 간주했던 “제대로 된”(proper) 역사가들에게 지성사가들이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흔히 제기되어온 쟁점이다. 도널드 윈치(Donald Winch)는 언젠가 [10p] 지성사가들은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때마다 “원정 경기”(away matches)를 치르듯 하곤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다행히도 오늘날엔 그런 광경이 덜 일상적이다. 이 책의 목적 중 하나는 지성사가들이 공유하는 영토를 규정함으로써 그들이 자신들이 홈 팀에 소속된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대린 맥마흔(Darrin McMahon)과 새뮤얼 모인(Samuel Moyn)은 오늘날 지성사의 문제 중 하나는 특히 연구방법론과 관련해 더 이상 서로 간의 논쟁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1960-70년대에 방법에 대한 논쟁이 한창 전개되면서 지성사 분야에서 최고의 저작 여러 권이 함께 나온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전제에 따르면 우리가 서로와 논쟁하기를 멈출 때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여 더 이상 탁월한 저작을 산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난 수십 년 간 역사의 철학을 다뤄온 가장 중요한 연구자들 중 한 명인 마크 비버(Mark Bevir)는 자신의 저작 『사상사의 논리』(The Logic of the History of Ideas, 1999)가 방법론적 탐구의 황금시대가 끝나는 순간에 등장했다고 말했다. 존 버로우(John Burrow)는 다른 시각을 제시했는데, 그는 방법론의 빈곤에 대한 글에서 과거를 심문하는 단 하나의 방법을 발견하는 데 혈안이 된 연구자들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다른 연구자의[one's?] 인식론적 전제를 심문하는 태도를 포함하여 버로우가 “방법론적 전체주의”(methodological holism)이라고 부른 것의 추구는 종종 과거를 무시하는 태도나 과거의 사상에서 낯설지만 아마도 정당화될 수 있는 성격[justiable nature?]을 이해하는 일의 실패를 수반했다. 케임브리지의 지성사가 이스테반 혼트(Istvan Hont)는 한발 더 나아가 “방법론은 멍청이들에게나 필요한 것이다”(methodology is for stupid people)라고까지 말한 것으로 유명하다. 한 가지 짚어둘 만한 지점은 앤서니 그래프턴(Anthony Grafton)을 포함해 현재 활동하는 최고의 지성사가들 중 여럿은 방법론적 논쟁을 삼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러한 논쟁에 반대하지 않지만, 이 책에서는 방법론적 논쟁을 전혀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은 연구분야에 대한 입문서일 뿐 그 이상을 의도하고 있지 않으며, 나 자신의 고유한 견해를 덧붙일 생각도 없다. 그러나 동시에 이 책은 논쟁적인 의견충돌을 고무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내용은 일반적인 층위에서 사상사 연구의 역사 및 그러한 작업들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수행되어 왔고 또 충돌하고 있는지를 기술하고자 한다. 역사를 살펴본 뒤에는 지성사의 방법과 실천을, 그리고 지성사가들이 역사 연구를 [11p] 현재의 문제와 무관하게 만든다는 주장이 검토된다. 책은 지성사 분야에서 최근의 발전에 대한 추가적인 성찰[speculation?]로 마무리 된다. 이 책에서 지성사 연구 전반에 걸쳐 수행되고 있는 광범위한 사례를 기대하는 독자가 있다면, 내가 대체로 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영역에서 사례를 골랐다는 사실을 말해두어야만 하겠다. 지성사가 고대 사상의 연구에서는 제한적인 영향만을 끼쳤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고전학”(classics) 자체가 오랜 시간에 걸쳐 확립된 그 자신만의 학문 분과 및 전통을 보유한 영역이라는 데서 기인한다. 마찬가지로 덧붙여야 할 사항은, 여기서 라인하르트 코젤렉(Reinhart Koselleck),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레오 스트라우스(Leo Strauss) 등과 연관된 지성사적 접근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제공하기는 하겠으나, 나의 주 초점은 퀜틴 스키너(Quentin Skinner) 및 존 포콕(John Pocock)과 이어진 연구방법 및 실천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내 생각에 후자가 영어권 지성사가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접근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동시에 지난 수십 년 간 지성사가들의 작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쳐왔다는 게 그 이유다. 당연히 모든 접근법 사이에는 유사점 및 겹쳐지는 지점이 있으며, 그중 일부는 책의 마지막에서 다뤄질 것이다. “케임브리지 학파”의 저자들에 초점을 맞추는 선택이 어쩌면 실수일지도 모른다. 나는 2014년 9월 스웨덴의 우메오(Umeå) 대학교에서 지성사 전공 대학원생들을 위해 열린 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곧바로 분명해진 점은 누구도 포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고 스키너의 방법론 논문들을 공부해본 학생들도 없으며 그들의 연구에 가장 중요한 영감을 제공한 저자는 푸코라는 사실이었다. 그곳의 스웨덴 학생들이 주로 수행하는 연구는 20세기 기술사에 관한 작업이었으며, 그 가장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그들 중 많은 수가 과학 전공에서 학부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고용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장소에 따라 사정도 달라지는 법이다.
#방법#지성사좋아요 7
공유하기
글 요소구독하기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댓글 8
댓글 쓰기
비밀글2018.10.13비밀글입니다.
댓글 컨트롤 레이어 펼침
 BeGray
BeGray2018.10.15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동료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목표입니다 ㅋㅋㅋ
댓글 컨트롤 레이어 펼침

정기인2018.11.17오 쑥쑥 잘 읽히네요 :) 일단은 서론의 역할에 충실하게, 그 이후의 책을 읽고 싶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댓글 컨트롤 레이어 펼침
 BeGray
BeGray2018.12.05ㅎㅎ 내년 중에 읽을만한 번역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댓글 컨트롤 레이어 펼침

ㄱㄴ2018.12.01좋은 글이에요 번역잘하셨는데 겸손하시네요
댓글 컨트롤 레이어 펼침
 BeGray
BeGray2018.12.05감사합니다 :) 아직은 초벌이고 완성품은 책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ㅎㅎ
댓글 컨트롤 레이어 펼침

후배2018.12.04이 책 원서를 읽으면 2017년에 올리신 읽기목록의 큰 흐름은 볼 수 있을까요?^^
댓글 컨트롤 레이어 펼침
 BeGray
BeGray2018.12.05전부는 힘들고 일부 주제와는 당연히 이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ㅎㅎ